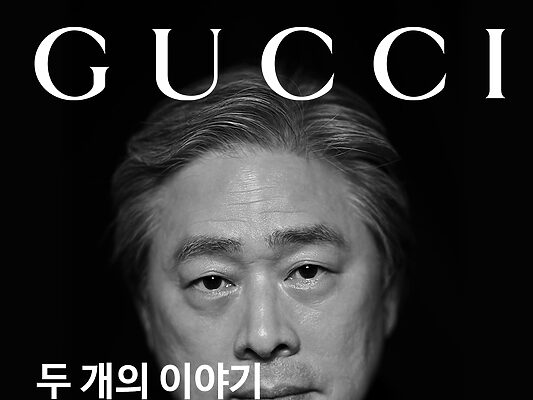이 멋진 니나리치 타이를 〈GQ〉10월호를 구입하는 모든 독자에게 선물로 드리려 합니다. 당신에겐 에디터들도 기절초풍할 비상한 스타일링 방법이 있겠죠?

1. 줄무늬 타이는 남자 복식의 근간을 상징하는 동시에 가장 현재적인 소품이다. 때문에 이 점잖고도 명랑한 타이는 영국 상류 사교 모임의 기록 컷에서도, 2011년 뉴욕의 클럽 오프닝 행사 컷에도 당연하다는 듯 등장한다. 사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온 건 레지멘탈, 그 반대인 건 리버스라고 부르는데 니나리치의 줄무늬 타이는 미국식 리버스다. 옥스퍼드 셔츠와 남색 블레이저와 함께 입으면 진지해 보이고, ‘캐주얼한’ 옷과 섞어 입으면 흔히 제짝이라 생각하는 무지 타이보다 오히려 세련돼 보인다. 청 재킷은 그저 캐주얼이라고 하기엔 어떤 뿌리가 있는 옷이어서 보통의 점퍼류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점에서 줄무늬 타이, 청재킷, 페니 로퍼야말로 희대의 삼총사, 완벽한 트리오, 궁극의 삼중창이다. – 강지영
2. 남색 수트와 화이트 셔츠를 입을 땐 역시 줄무늬 타이가 답이다. 요즘은 수트 차림에도 기괴한 재단과 과도한 디자인을 담는 게 무슨 용맹이라도 되는 듯한 수상한 시절이지만, 남색 수트와 줄무늬 타이는 그런 혼란한 소요에서 멀리 비껴 선 느낌이다. 젊은 남자가 몸에 잘 맞는 남색 수트를 입고 청량한 줄무늬 타이를 매는 건‘ 패션’이라기보다는 그의 철학적 심상과 삶의 비결을 대변한다. 신중함과 분별력, 그리고 조용한 주장. 니나리치의 도톰한 줄무늬 타이를 별다른 기교나 변칙 없이 정석대로 입으라 권하고 싶은 건 이 타이가 지닌 정직하고 단순한 기품 때문이다. 그야말로 수트의 진정성을 갖춘 이 차림은 학창시절 제도기, 아버지가 권하는 술, 첫 번째 면도처럼 남자의 일생 중 몇 번을 거치는 성장의 징표다. – 박나나
3. 가을엔 역시 포도주색 수트다. 포도주색은 남색이나 검정색보다 발견하기 어렵고 소화하기도 쉽지 않지만 독창적인 매력이 있어서 다들 이 색깔에 대해 궁금해한다. <킹스 스피치>, <싱글맨>에 나오는 콜린 퍼스처럼 입으면 근사하겠지만, 그 영화의 배경은 모두 고리짝 시절이니까 거기에 상큼한 색을 더해본다. 셔츠 칼라가 독특한 것도 좋고, 걸을 때마다 슬쩍 보이는 양말을 꽃분홍색으로 신는 것도 괜찮다. 색깔 조합이 비범한 이런 타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입고 신어도 점잖아 보일 게 분명하다. 수트를 곧 터질 것처럼‘ 꼭’이 아니라‘ 꽉’ 끼게 입거나 휘황찬란한 포켓치프만 하지 않으면 된다. 갑자기 덥지 않은 선선한 저녁에 포도주색 수트를 입고 포도주 한잔 하고 싶은 생각이… – 김경민
4. 매일 수트를 입는 남자가 아니라면, 멋진 타이를 갖고도 마음껏 휘두르지 못할 때가 많다. 어쩌다 큰맘 먹고 처음 매보려다가, 거울 속 모습이 어쩐지 부담스러워 고스란히 서랍으로 다시 돌려보낸 게 벌써 몇 번째일까. 그런데 구세주처럼 샴브레이 블레이저와 카고 팬츠가 나타날 줄이야. 샴브레이 블레이저는 특유의 부들부들함이 잘 살도록, 심지나 안감이 없는 게 더 자연스럽다. 주머니엔 뚜껑이 없어서, 아무 때나 손을 푹 찔러 넣을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런 차림에 타이를 빼놓는 건, 너구리 라면에 다시마가 없는 것만큼 섭섭한 일이다. 옥스퍼드 셔츠의 마지막 단추를 푼 채, 딱 거기까지만 조인다. 포켓스퀘어는 하지 않는다. 낡은 파카 볼펜이 더 어울릴 것 같아서. – 박태일
- 에디터
- 강지영, 패션 에디터 / 박나나, 김경민, 박태일
- 포토그래퍼
- 정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