잎 달린 채소를 들고 올 수 있는 만큼 산다. 식이섬유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채소부터 먹어야 한다. 먹지 않고 이마에 붙일 수도 있지. 그리고 웃는 것이다. 웃음은 약이라고 했으니까. 심지어 샐러드로 만든 모자를 쓴 자신을 보면서 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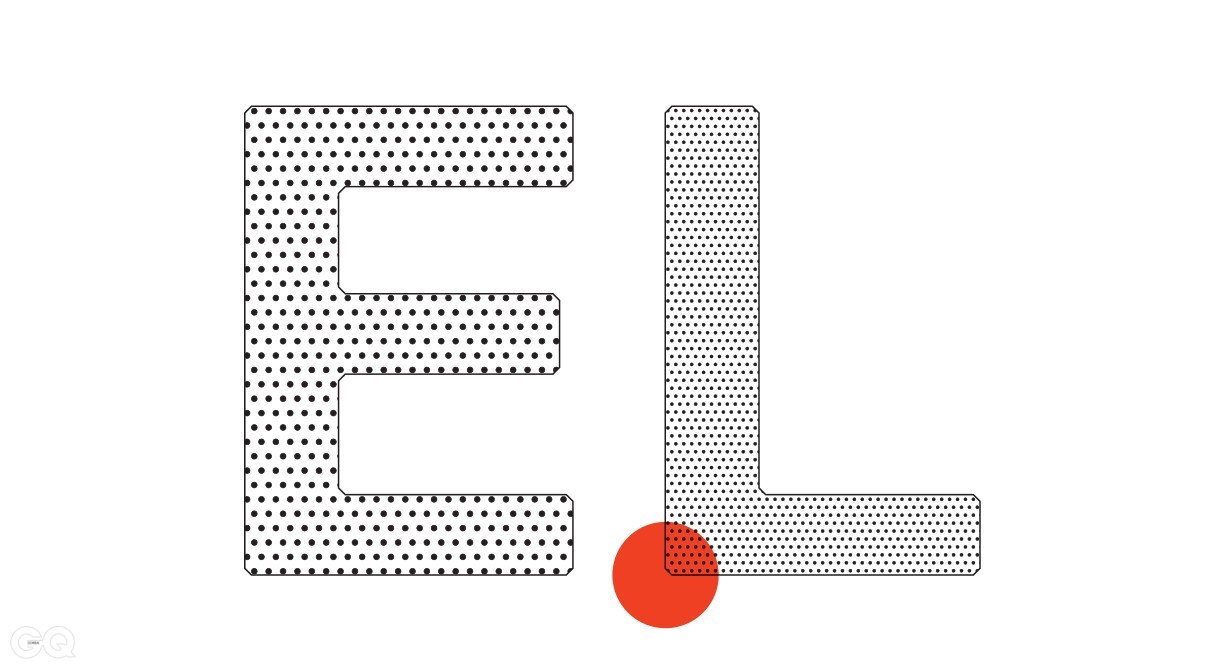
숙취
요즘은 조금만 마셔도 숙취가 끝내준다. 억울해. 숙취가 싫으면 술을 안 마셔야겠지만 다 하나 마나 한 소리. 술은 어떤 선택이 나 자유의지완 무관하잖아? 다음 날 아침, 집 천장이 미친 오로라처럼 빙빙 돌 때마다 모든 쾌락엔 벌이 따른다는 깨달음을 후루룩 마신다. 그렇지만 나는 의사도, 여명 808 직원도, 콩나물 해장국집 사장도 아니지만, 어떻게, 해결책을 찾았다.
다음 날 아침, 술 냄새가 양조장급인 방에 쓰러져 아스피린을 사먹을지 생수를 백 병 마실지 고민하다가 마트에 간다. 잎 달린 채소를 들고 올 수 있는 만큼 산다. 식이섬유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채소부터 먹어야 한다. 먹지 않고 이마에 붙일 수도 있지. 그리고 웃는 것이다. 웃음은 약이라고 했으니까. 심지어 샐러드로 만든 모자를 쓴 자신을 보면서 웃는다. 웃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다니.
그러다 보면 다시 술 생각이 난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술 생각이 나? 인간도 아니야…. 그러다 그 자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게 아픈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서 있는 이유 아냐? 마티니야말로 끝내주는 선택이다. 잔에 담긴 올리브의 풍부한 지방과 나트륨은 전해질을 재보충시켜준단 말이야. 전해질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데? 이건 따로 저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마티니를 한 잔 마시고 나니 당장 조깅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긴다. 그간의 연구를 보면 운동이 엔도르핀을 만들어주고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을 줄여준다고 했잖아. 불쾌감을 다른 기분 좋은 감정으로 바꿔준다고 했잖아.
나이키 후드 티도 안 입고 동네 좁은 길을 달리는 동안, 어제 왜 그렇게 술을 펐는지 떠올린다. 왜 조절하지 못했을까?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을 왜 그렇게 몽롱하게 낭비했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일까? 그걸 알기나 해? 그럼 더 빨리 달려!
우심방 좌심실이 바뀌도록 숨차게 달리다 보니 좀 뜸했던 친구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문경새재에 여행 가야 한다는, 사랑 같은 건 지긋지긋하다는, 소를 길러야 한다는 확실성이 차곡차곡 쌓인다. 모두 다 기운 꺾이는 일들의 모음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거룩한 국토 순례를 하는데 숙취로 괴로워할 시간이 어디 있다고?
주먹을 꼭 쥐고 사색하다 보면 석양이 진다. 또 술을 마실 시간 이 된 것이다. 당연히, 단번에 숙취를 해소하고 나니…, 무절제의 씁쓸함이 나를 조용하게 만든다.
이튿날 또 다른 숙취를 안고 일어나도 당황스럽지 않다. 난 치료법을 발견했잖아? 때 되면 학술지에 발표해야지. 우선 마트에 가서 채소 좀 사고 난 다음에. 먼저 잔을 부딪치고 난 뒤에.
수염
어떤 친구는 지난밤 얼굴에 파종이라도 했는지 아침마다 털이 수북하다. 로버트 드 니로 얼굴의 사마귀인 양 피부에 딱 붙어 선. 숲 속의 나무를 헤치고 지나가는 사냥꾼처럼 지저분한 수염은 이렇게 말한다. 난 지위, 경제력, 재능 다 가졌어. 딴 건 다 상관없어.
여자들은 맨날 머리와 화장을 바꾼다. 두개골과 가슴 크기도 바꾼다. 하지만 남자는 거울에 비친 그 모습 그대로 말고는 그다지 도리가 없다. 운동? 좀 점진적이다. 음경 확대? 소수만 본다. 모발 이식? 벌에 쏘인 할머니 두피처럼 변하면 어쩌지? 이때 수염은 남자가 외관을 바꿀 수 있는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 (눈썹을 다듬거나 뽑는 건 수염을 기르는 것보다 훨씬 대담하다.) 남자 얼굴 은 흰 도화지, 수염은 세상 유일의 페인트. 수염은 똑같은 얼굴을 거울로 몇십 년 봐야 하는 따분한 세월에 과격한 금을 긋고, 현상수배범을 엉뚱한 사람으로 변장시킨다. 수염은 온순한 반란이기도 하다. 타인에게 무조건 동조하는 노예가 아님을 증명하려는. 뭐, 수염을 길러봤자 옆집에 피해도 안 주고, 고양이도 안 무서워하니까.
하지만 신경 쓰인다. 아파트에만 살다 주택으로 이사한 사람들은 안다. 안 보이는 어두운 곳에는 환영할 수 없는 존재들이 산다는 걸. 2차 성징 때부터 면도하고 나면 죽어도 멈출 수 없다. 대충 15 세 때부터 80세까지라고 해도 23,740번! 그래도 여자들이 좋아하니까? 수염은 여자의 하이힐이나 짧은 스커트 같은 거라서? 털을 좋아하는 소수에 맞춘 변태 페티시인가? 여기서 수염의 (남)성적 매력이라는 미스터리가 생긴다.
수염은 동시에 아침마다 어떤 걸 고를까 망설이는 타이와 같다. 70년대 무정부의 상징이던 장발처럼 패션 그 이상이다. 수염은 민감하니까. 가라오케에서 마지막으로 부르는 ‘My Way’처럼 상투적인 채 ‘나여야만 한다’라는 개인적 정체성을 함축하니까.
면도 안 한 그루터기 수염, 뻣뻣한 혈기방장 수염, 인위적인 수염, 위엄 터지는 수염, 사악한 염소 수염, 야생적인 낙타 수염, 가발 공장에서 반색할 숱 많은 수염, 윗입술에 닿을락 말락 하는 수염…. 수염은 아이처럼 자꾸만 자란다. 화, 깨달음, 체념, 비밀을 담은 채. 통제할 수도 없다. 매일 차로 등교시켜도 다음 날 차 키를 훔쳐가는 악동 같아서. 수염은 크리스마스에만 반짝하는 트리가 아니라 인생 자체랄까. 하지만 누구 얼굴에 매달려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수염은 한 번도 로망 아니었던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수염의 독립적인, 건강한, 선구자 이미지를 가지지 못했다. 나에게 수염은 감지할 수 없는 그림자와 같았기 때문에.
- 에디터
- 이충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