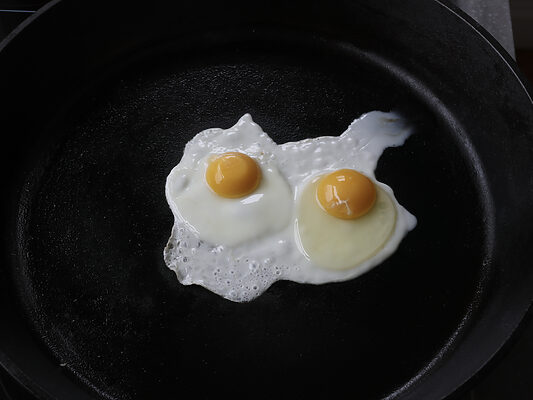전시회 제목이 ‘청춘, 그 찬란한 기록’이라 했을 때, 즉각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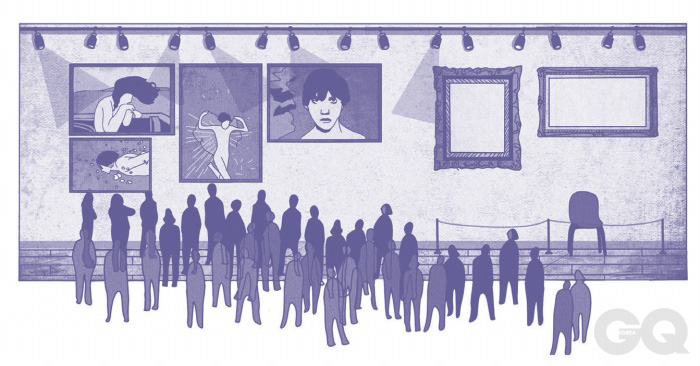
오늘도 올라왔다.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 라이언 맥긴리의 전시가 열리는 대림미술관에서 찍은 각종 ‘셀카’는 얼굴이며 발등이며 그림자며 다양한 신체 부위를 넘나들면서 날마다 올라온다. 그 빈도와 분량이 거의 고양이 사진에 맞먹는 정도니, 숫제 함께 살아가는 형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렇게 서울 일각에 불어닥친 신드롬. 작가가 몸소 참여한 오프닝 행사는 ‘아이돌스타 팬미팅’ 분위기였다고, 관련 기사들은 한결같이 전했다.
다만 반가운 일일까? ‘컨템포러리’ 작가의 전시가 전례 없는 성황을 이루고 있으니, 서울 미술 관객의 층위가 그만큼 젊어졌다거나 넓어졌다거나, 적어도 그렇게 되어가는 계기가 될 거라며 반길 일일까. 하지만 나는 이 전시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과 별의별 이슈를 접하면서, 전시에 가지 않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스스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보다는 판단과 결정이 앞선 경우였다.
모든 걸 취향의 문제로 돌리면 쉽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말고. 라이언 맥긴리가 좋으면 전시장에 가고, 싫으면 안 가고. 문제는, 라이언 맥긴리가 싫지도 않은데(웬걸, 오히려 좋아하는 쪽인데), 전시장에 가는 일을 거절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이다. ‘거절’은 이번 전시의 제목을 듣는 순간 확연해졌다. <청춘, 그 찬란한 기록>이라니, 참으로 노골적이었다. 택한 단어와 향하는 의도가 모두 ‘라이언 맥긴리’를 소개 혹은 소비하는 가장 ‘낮은’ 선에 맞춰져 있었다. 즉, 라이언 맥긴리를 모르는 ‘대중’이라는 좌표를 향하고 있었다. 동시에 그건 라이언 맥긴리라는 이름을 각별히 간직하며 누구보다 기다렸을 어떤 개인(들)을 대번에 소외시키는 일이었다. 당연지사, 전시의 목적이 보였다. 그건 흥행이었다.
다소 감정적인 대응을 떠나서, 그 방식이 라이언 맥긴리의 사진이 보여주는,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라이언 맥긴리의 사진에는 젊은이들이 가득하다. 하지만, 거기에 ‘세대’나 ‘젊음’이나 하물며 한국에선 이미 어떤 식으로 박제되어버린 ‘청춘’ 같은 말로 뭉뚱그려 일반화할 수 있는 속성이라고는 없다. 거기엔 오히려 어떤 집단으로부터 동떨어진 채 자기들끼리의 일탈로서 어떤 고립을 즐기는 극단적인 개인이 있다. 그토록 가깝고 내밀한 개인 사이의 거리가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렇게 친구다. 그걸 모아놓고서 ‘청춘, 그 찬란한 기록’이라 이름 붙이는 것은 자체로 부적절할뿐더러 결국 작품에 대한 모독이다.
전시가 시작되었고, 인파가 몰렸고, 날마다 ‘셀카’판이 벌어졌다. 그리고 올 것이 왔다는 기운을 풍기며, 한 케이블 채널에서 그의 촬영 현장을 방송했다. ‘패션 화보 촬영’ 하면 으레 떠오르는 스튜디오 분위기에서 라이언 맥긴리가 선글라스를 쓴 채 카메라를 든다. 쇼는 어디까지나 쇼지만, 그 쇼는 ‘이것은 쇼가 아니다’를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뒤집어쓴, 정말 남사스런 쇼였다. 덧붙여 그 결과물은 네이버 검색창에 ‘라이언 맥긴리 이수혁(그날 촬영한 모델)’이라고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여러 라이언 맥긴리의 작품 사진과 이번에 촬영한 사진이 동시에 뜬다. 차이라면 차이, 공통이라면 공통, 그저 눈에 보이는 바와 같다.
지금 서울에서 ‘라이언 맥긴리’라는 이름은 어떤 리트머스이자 성적표다. ‘힙스터’ 문화처럼 들어오지만 실은 대중적인 접점을 노리는 쪽에서만 기획되고 치러지는 이벤트, 흥행이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흥행만 된다면 전생에도 없던 의미가 절로 찾아지는 쇼.
가볼까 하는 마음은 여전히 든다. 훌쩍 다녀올 수도 있다. 하지만 가지 않는다. 후회할, 못난 선택이 될지라도 그 자체로 개인이 개인에게(내가 내게)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서울에서라면, 집에서 혼자 라이언 맥긴리의 사진집을 펼치는 편이 훨씬 좋은 ‘라이언 맥긴리’와의 접점이 아닐까 한다. 하필, 그렇게라도 철저한 개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에디터
- 장우철
- 기타
- 일러스트레이터 / 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