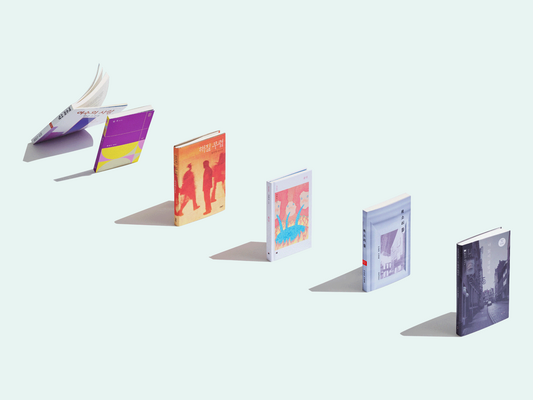보고 있자니 갑자기 그 꽃 생각이 났다.

HERMES 드라이빙 장갑이라니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싶겠지만, 때로는 실용주의를 버릴 필요도 있다. 세속의 어수선함에 기꺼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끔의 사치는 인생을 훨씬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든다. 에르메스의 양가죽 드라이빙 장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가벼워서, 손가락을 넣는 순간 꽃잎에 쌓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게다가 흔한 호두색이나 초콜릿색이 아닌 초록색. 덕분에 이 장갑엔 햇빛을 듬뿍 받고 자란 건강한 녹색 식물 같은 활달함이 있다. 얇고 길다랗고 끝이 뾰족한 모양새를 보면 벤자민고무나무 잎이 떠오른다. 열대 지방에서만 자라는 식물인 것도 마음에 들고 장식 없이 수수한 것도 좋아서 자주 사고 종종 선물했다. 에르메스 장갑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누군가에게 선뜻 주는 날도 과연 오긴 올까? 강지영

SAINT LAURENT PARIS 날이 절로 풀린다. 스웨트 반바지를 입기 직전까지 갔으니 봄은 ‘THISCLOSE’. 깃을 여미며 지독하게 더운 날을 억지로 잡아 끈다. 사무치게 보고 싶은 연인을 기다리듯 뭘 입을지부터 짠다. 표백제를 듬뿍 넣어 빤 흰색 리넨 셔츠부터 팔뚝이 만천하에 드러날 회색 스웨트 셔츠까지. 빈지노의 말을 빌리자면 ‘시원시원’하게 입을 테다. 그렇게 입고 하와이에 가고 싶다. 녹 가루 날리는 트럭 한 대 빌려서 노스쇼어로 돌진한다. 하와이에서 하와이안 셔츠를 입는 건 명동에서 한복을 입는 셈. 산뜻하게 플루메리아 목걸이만 걸고 창문을 내린다. 하와이, 꽃, 파인애플의 삼박자보다 딱 떨어지는 건 송대관의 ‘네박자’뿐. 빨대가 꽂힌 채, 해골처럼 극악무도하게 웃고 있는 순결한 모습을 상상해보다가 당장이라도 달고 싶어졌다. 오충환

CHRISTIAN LOUBOUTIN 크리스찬 루부탱의 클러치 백을 보는 순간 공작선인장이 생각났다. 규칙적으로 뾰족하고, 지퍼 머리에 새빨간 밑창을 단 모습이 꼭 꽃 같았다. 남자에게도 클러치 백이 익숙해진 지 오래다. 뒷주머니에 지갑과 담배만 꽂고 다니기엔 엉덩이가 네 개 붙은 것처럼 흉하고, 그것 말고도 현대 남자들은 필요한 게 많으니까. 겉모습은 까칠한데, 휴대전화 충전기와 립밤, 필통, 카메라, 명함 지갑, 책, 아이패드까지 듬뿍 넣을 수 있을 만큼 속이 넉넉하다. 게다가 과장되고 부담스런 스터드 장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꽤 쓸 만하다. 들고 다니면 손바닥 지압도 되고,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이를 처치하기에도 그만이다. 김경민

GUCCI 가끔 고속터미널 위층에 있는 꽃상가에 간다. 식물의 이름은 주기율표보다 1백 배쯤 외우기가 어려워서, 원하는 게 있어도 그걸 콕 집어 물어보지 못한다.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다가 눈에 띄는 식물을 발견하면 집 거실을 한번 떠올린다. 순간 마음이 동하면 이거 주세요, 하는 식이다. 그날은 이 꽃이었다. 처음 보는 꽃은 아니었지만, 다시 봐도 참 기묘한 용모. 오후 네 시쯤, 식탁 위로 떨어진 햇빛이 만든 교묘한 그림자를 상상했다. “이거 주세요.” 이름은 나중에 찾아봤다. ‘핀쿠션’이라니, 절묘한 이름이다. 몇 달 전에 산 이 꽃은 여전히 거실에 있다. 싱싱한 핀쿠션이 바싹 말라버릴 때까지 참 여유 없이 살았다. 그 사이, 계절도 바뀌었다. 집에 놓을 꽃을 사는 마음과 목에 두를 스카프를 사는 마음은 별로 다를 게 없다. 다만 스카프는 시들지 않는다. 박태일
- 에디터
- 패션 / 강지영, 오충환, 김경민, 박태일
- 기타
- COURTESY OF HERMES, SAINT LAURENT PARIS, GUCCI, CHRISTIAN LOUBOUTIN ILLUSTRATION / KWAK MYEONG 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