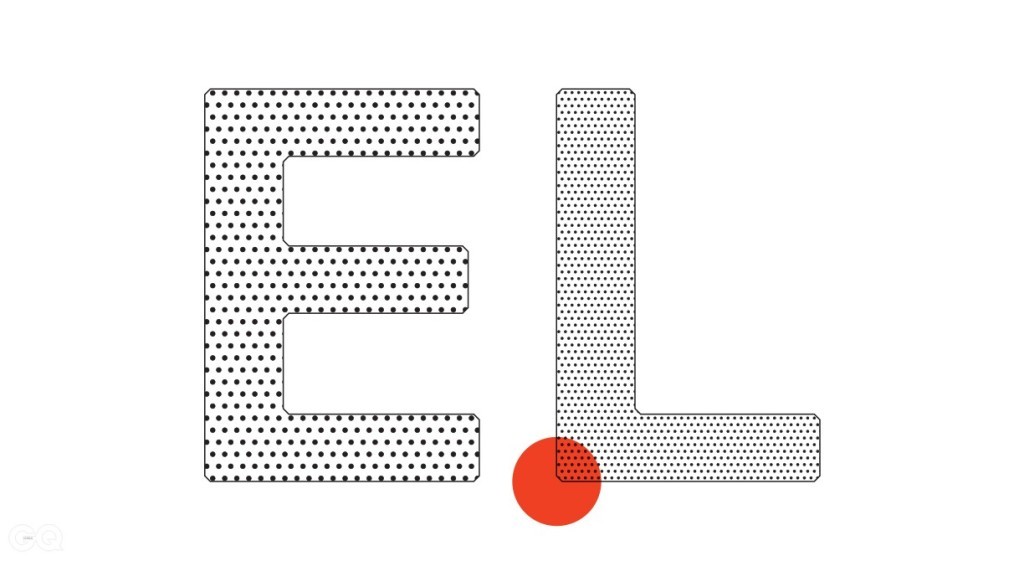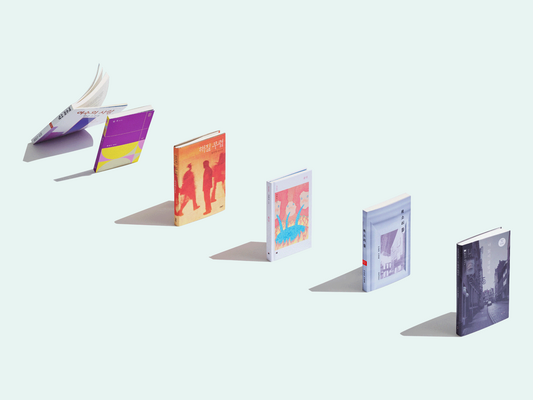이탈리아 사람들은 알프스를 넘어온 푄 바람처럼 작정하고 시원해 보인다. 나의 미트볼처럼 금간 몸이 나폴리 피자 토핑보다 서둘러 녹아내리고, 집에서 챙겨온 코흘리개 손수건으로도 눈썹 사이의 땀에 맞설 수 없을 때, 죽음보다 나쁜 운명은 한여름, 밀란 남성복 컬렉션에 가는 거란 생각이 든다.
이탈리아 남부의 여름 같은 건 어디에도 없다. 태양의 함대가 도시의 오래된 돌 위로 항해할 때, 열기는 전선을 녹이고, 아스팔트는 스펀지처럼 흐물거린다. 프랑스인들은 레브라토의 혀처럼 처지고, 독일인들은 물의 웅덩이가 되고, 영국인들의 피부는 고동색으로 익고, 중국인들은 군만두처럼 구워지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알프스를 넘어온 푄 바람처럼 작정하고 시원해 보인다. 나의 미트볼처럼 금간 몸이 나폴리 피자 토핑보다 서둘러 녹아내리고, 집에서 챙겨온 코흘리개 손수건으로도 눈썹 사이의 땀에 맞설 수 없을 때, 죽음보다 나쁜 운명은 한여름, 밀란 남성복 컬렉션에 가는 거란 생각이 든다. 뭐가 됐든, 섭씨 40도에 계절을 무시하며 내내 바싹 마른 상태를 유지하는 이탈리아 남자들을 보면 누구라도 뭔가 다윈의 적응의 개념에 대해 할 말이 생길 것이다.
몸에 안 맞건, 헌 옷 같건, 옷은 일상적 삶을 반영한다. 토요일, 마트에서 보는 이들의 체형이 다 자포자기적인 것처럼. 그러나 밀란에 와 호텔 숙박비를 올리고, 식당을 채우는 프레스와 바이어부터, 캣워크와 스트리트 사진가, 프론트 로에서 스탠딩 구역까지, 컬렉션에 오는 전부 다 서로를 검토한다. 몸의 윤곽, 걸음걸이와 옷태, 쇄골과 턱 선, 가슴과 허벅지의 중량, 엉덩이 윤곽선의 세세한 부분…. 어떤 의미로 컬렉션은 맨 앞줄에 누가 앉았나 살펴보며 세속적 존재감을 견주는 자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누가 보는 게 불편하지 않다. ‘전시’를 위한 기초 지식과 교태를 이미 갖추었다. 자기가 보이는 방식이 중요한 서구 문화에서 남자를 원숭이같이 웃게 하고 플라멩코처럼 걷게 하는 DNA는 이미 여러 세기, 지구를 꾸며왔다.
한편 쇼 장에서, 더워 죽겠는데 한 톨 방심 없이 혹독하게 우아한 남자들 사이에 있으면 일종의 광기와 슬픔의 데카당스를 느낀다. 발목이 보이는 바지, 너무 달라붙어 트윙키 하나 넣을 수 없는 코튼 블레이저, 솔이 적당히 두꺼운 구두, 코발트 블루의 적극적인 앙상블, 아마도 왁스를 바른 콧수염, 마이크로 길이까지 계산돼 볼을 덮은 턱수염은 고밀도의 패션 에너지를 내뿜는다. 우린 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르고 아름답단 말이나, 아름다움은 절대적 완벽함이 아니라 입술 주름 같은 세부에 숨어 있단 현자 코스프레는 의미 없다. 있어선 안 되는 데 와 있는 기분이 자꾸 들면서도 그 진지함이 지나친 건지 결핍된 건지 우습기만 할 때, 본젤라또를 핥으며 다음엔 저 치보다 잘 입어야지, 기진맥진해진 속을 다잡는다.
물론 새 컬렉션에는 힌트가 있다. 여름 여행자를 끌어들인 토즈의 버튼 없는 더블 브레스티드 블레이저, 코트와 실크 셔츠와 블루종 위에서 상모를 돌리는 페라가모의 벨트, 밝은 노랑과 감색, 에트로의 색깔 덩어리 수트, 소의 피 색깔이 번진 돌체&가바나의 새틴 이브닝웨어, 이전 컬렉션만이 그들의 기준이 되는 베르사체의 망사 조끼,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이상한 양말 위에 하늘거리는 진주색 바지, 하얀 스티치와 대조대는 프라다의 데님, 존 바바토스의 구겨진 옷감 재발명, 부피를 가지고 노는 토마스 마이어의 짙은 파랑과 바랜 분홍 캐시미어 니트, 구찌의 해적 스트라이프와 흰 악어가죽 로퍼, 하얀 리넨 셔츠를 감싼 아르마니의 어두운 수트….
하지만 출장 가방을 쌀 때마다 머릿속에선 패배의 겁먹은 목소리가 외친다. 컬렉션의 생중계 경험의 순간을 자신의 스토리로 포착하고 편집해야 하는 의무는 싹 잊고. “잘 입으면 뭐 해? 더워 쪄죽는데. 여차하다간 짧막한 셜록 홈즈가 될 거라고. 코미디야 코미디!”
결국 대전 중앙시장에서 친구가 사준 5천원짜리 구제 티셔츠를 입고 공작 같은 남자들 사이에 끼어 앉을 때, 나의 무기는 초연한지 무표정한지 머리가 비었는지 헷갈리는 무표정한 마스크. 루이 14세와 저녁을 먹는다 해도 자기가 걸친 것에 뻔뻔할 수 있다면 놀라운 양의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뭔가 스스로 꿀리고 당혹스러운 죄인의 얼굴을 드러낸다면 거기 앉은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밀란의 개조차 수치심을 짓밟을 것이다.
유서 깊은 브랜드들과 디자이너 장인들이 새로 이미지화된 클래식을 드러낸 이번 2015 봄여름 밀란 남성복 컬렉션은, 어쩜 어떤 희망적인 변화의 직전에 있는 듯 보였다. 작은 공장의 불빛이 차례차례 켜지기 시작한 것처럼. 정확히는 의복 르네상스의 새벽이 아니라도, 꽤 말쑥한 시대에 진입한 것처럼. 게을러지거나 상상력이 없어졌다기보다, 남자 패션에 변덕스러운 학습곡선이 없어졌달까.
규칙은 다시 쓰여지거나 순환된다. 이것이 분위기의 변화에 대한 간단한 대답일까? 누구든 규칙을 배우고, 그것을 깬다. 모든 규칙은 아닐지라도. 심오하고도 실제적인 징후는 기후 변화가 아닌 더 근본적인 데서 왔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패션은 결국 벗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남성복 컬렉션에선 패션 전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존재감, 진정한 폭동을 부추기는 쇼를 상상하기 힘들다. 시즌에 억눌린 홧병의 폭발적 카타르시스도 없다. 그러나 디스퀘어드도 베르사체도 아르마니도 쇼의 중간쯤, 뭔가 산만해질 때쯤 화끈하게 벗어젖힌다. 코르셋 없이, 여전히 뻣뻣하게 채운 여성복의 크리놀린과 패드는, 남성복이 여성복보다 삶과 살로서의 누드에 조금 더 가깝다는 걸 말해준다. 이러다 다수의 패션이 섹스로 압축되지 않을까, 살짝 궁금해질만큼. 하지만 남성복 쇼가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경험으로 눈금 매겨지는 동안, 복합적 자아를 가진 이 작은 도시에 모인 모든 것이(관객 얼굴에서 유령처럼 빛나는 빛의 점, 스마트폰조차) 신선한 전율을 보탠다. 옷과 신발과 가방이 아니라 피부에서 숨 쉬는 삶의 전율, 매 순간을 황홀로 채우는 전율을.

- 에디터
- 이충걸(GQ코리아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