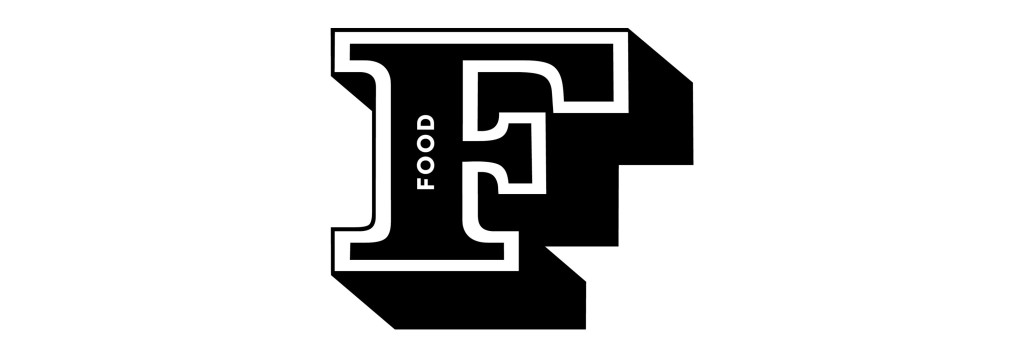‘몽드셀렉션’을 수식하는 말은 화려하다. 식품업계의 노벨상, 식품업계의 올림픽. 과연?
‘몽드셀렉션이 인정한 술’, ‘세계인이 반한 우리 술의 맛’, ‘3년 연속 금상 수상, 몽드셀렉션 휩쓸어’, ‘금상 수상 기념 이벤트 실시’. 인터넷 뉴스 검색란에 ‘몽드셀렉션’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나오는 최근 기사들이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소주를 주문할 때 몽드셀렉션 수상 딱지를 마주하기도 했다. 도대체 몽드셀렉션이 뭐기에, 증류식 소주도 아닌 희석식 소주에까지 금상을 부여하는 것일까. 의구심은 소주 한 잔처럼 가볍게 털리지 않는다.
몽드셀렉션은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한 식품 품평회다. 1년에 한 번, 세계 각국에서 출품한 제품을 자체적인 기준으로 평가해 최고금상, 금상, 은상, 동상을 부여한다는 것이 주최측의 설명이다. 몽드셀렉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확인한 결과, 간단한 대회 설명 한 페이지에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돌다리가 세 개나 보였다. 첫째,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선 제품 하나당 1천1백50유로의 참가비를 지불해야 한다. 둘째, (2014년을 기준으로) 총 3163개의 참가 제품 중에서 2798개가 상을 받았다. 즉, 88퍼센트가 최소 동상 이상을 수상했다는 이야기다. 이 중 금상은 총 1389개로 전체의 약 44퍼센트를 차지한다. 셋째, 최소 동상 이상을 수상한 2798개 제품 중 아시아에서 출품한 제품의 개수는 2221개다. 약 79퍼센트에 달한다. 이상 세 가지를 순서대로 곱씹으면 소주병 앞에서 품었던 의문이 풀린다.
첫 번째 의문에서 이 대회의 권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참가비인 1천1백5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백60만원에 해당하는 이 돈은 제품 하나를 출품하는 가격이다. 한 회사에서 두세 종류의 다른 술을 출품하려면 그만큼 더 돈을 내야 한다. 몽드셀렉션엔 세 개 이상 출품하는 경우 제품당 1백 유로를 할인해주는 규정도 있다. 국가 기관에서 진행하는 행사도 아닌데, 자체적인 규율을 만들어 자기 방식대로 대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지적하기가 힘들다. 무분별한 출품도 막을 수 있고, 심사 진행, 통관 비용, 시상식 개최 등에 사용한다는 설명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 대기업 입장이라면 어쩌면 이 금액이 오히려 가뿐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참가비로 인해, 대회의 권위는 숭덩숭덩 잘려 나간다. 적은 돈이 아닌 이 참가비는 소규모 양조장, 개인 양조장으로서는 높은 진입 장벽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대회에 참가하는 모집단에 심각한 결함이 생기게 된다. 어느 대회든 모든 술을 대상으로 심사를 할 순 없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셀 수도 없이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드넓은 식품 분야에서, 참가비를 내고 참가한 소수 업체들끼리 펼친 경쟁을 과연 ‘올림픽’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두 번째 의문점과 첫 번째 의문점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 대회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난다. 참가비라는 장벽을 넘어 심사의 문턱에 들어서면 90퍼센트에 가까운 제품이 동상 이상을 수상한다. 게다가 금상의 개수는 은상과 동상의 개수를 합친 것보다 약 3백 개가 더 많다. 대회라기보다는 사설 기관의 인증에 가깝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욱이 인증 방식을 ‘금·은·동’으로 이름 붙이다 보니 생기는 오해가 이 대회 자체에 왜곡된 신뢰를 부여했다. 하지만 몽드셀렉션 수상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업들은 그 오해를 오히려 더 반긴다. 몽드셀렉션에 ‘올림픽’, ‘노벨상’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만봐도 그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기업들은 벨기에의 한 품평회에 일부러 권위까지 부여하며 집착하게 된 것일까? 어쩌다 몽드셀렉션을 오용하게 된 것일까?
세 번째 의문을 풀면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한다. 벨기에 품평회에서 전체의 8할을 아시아 국가 브랜드가 차지하는 것은 어색하기만 한데, 자세히 뜯어보면 대부분이 일본 브랜드다. 지금의 이 결과는 2007년부터 일본에서 불기 시작한 ‘몽드셀렉션 열풍’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열풍의 중심엔 맥주 브랜드 산토리 프리미엄 몰츠가 있다. 2005년부터 3년간 최고 금상을 연이어 세 번 받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몽드셀렉션은 3년 연속 금상 이상을 수상하면 ‘인터내셔널 하이 퀄리티 트로피’를 수여한다.) 이를 통해 몽드셀렉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에서 엄청난 유명세를 누리게 됐다. 아무도 모르던 유럽의 한 품평회를 세계적인 식품 올림픽으로 새롭게 포장하고 그 권위를 제품에 이식한 대담한 마케팅인 셈이다. 이후 일본에선 맥주부터 사케까지, 몽드셀렉션 딱지를 병에 붙이는 마케팅이 술 판매대를 휩쓸었다. 이 유행에 2011년 대기업 하이트진로가 먼저 뛰어들면서 국내에도 몽드셀렉션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금 몽드셀렉션 수상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제품 중에는 하이트진로 제품의 비중이 높다. 또, 주류뿐만이 아니라 일반 식품군 쪽으로도 스멀스멀 번져나가는 추세다.
<지, 사케>의 저자이자 사케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김정한 씨 역시 몽드셀렉션의 거품에 대해 지적한다. “술은 아무리 공정해도 인간의 취향과 감각이 관여하기에 평가 그 자체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로 한다고 해도, 이렇게 상을 남발하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면면도 믿을 만한지 모르겠고요. 한때 일본에서 유행처럼 몽드셀렉션 딱지를 붙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라도 붙어 있으면 손이 가게 마련이잖아요. 당시 일본 양조장들은 몽드셀렉션을 술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3백만~4백만원이면 상을 탈 수 있으니 매체에 광고를 내는 것보다 저렴하고, 술병에 로고를 붙일 수 있으니 노출 효과도 좋고요. 요즘 몽드셀렉션의 일본 내 인기는 확 꺾였습니다. 별볼일 없는 술이 나가는 대회라는 이미지까지 생겨서 오히려 피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IWC(인터내셔널 와인 챌린지) 사케 부문으로 수상 마케팅 열풍이 옮겨 붙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역시도 정말 뛰어난 술을 만드는 양조장은 참여하지 않아요. 수상을 매개로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싶거나, 단기간에 인지도를 높이고 싶은 양조장이 주로 출품하는 셈이죠. 2012년, 히로키라는 아주 유명한 프리미엄 사케 양조장이 IWC에 사케를 처음으로 출품했습니다. 원전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에 양조장이 있어 국내 소비가 힘들어졌기 때문이겠죠.”
비단 몽드셀렉션에만 의심의 화살이 꽂히는 건 아니다.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고 그만큼 많은 수상작을 내는 식품 품평회는 한 두 개가 아니다. 어느 분야이건, 어떤 제품을 다루건, 시상식이라는 틀이 완벽할 수는 없다. 일간지를 중심으로 성행하던 ‘소비자 대상’, ‘브랜드 대상’도 실체를 알면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김정한씨는 술이나 음식이 ‘해외에서 인정받는다’는 것 자체에 의문을 던진다. “유럽의 그 심사위원들이 얼마나 많은 사케를 마셔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케가 왜 이런 맛을 가지게 됐는지, 지역적인 영향, 전통 음식의 영향, 오랫동안 쌓여온 미각의 영향까지 고려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특수성을 가진 품목인데도 무조건 해외에서 수상했다고 품질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유럽의 미슐랭 스타 셰프가 김치의 맛을 평가한다면 그게 얼마나 믿을 만할까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소주나 옥수수수염차처럼 한국 시장에 특화된 그들의 제품을 해외의 몇 몇 심사위원단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품질을 보장받고 싶어서 출품하는 게 아니라, 홍보 문구를 만들고 마케팅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출품한다는 것이 더 맞는 말이다. 실제로 몽드셀렉션 홈페이지에는 수상 후 기업이 누릴 반사 효과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묻고 따져야 할 지점이 자꾸만 늘어간다.
기업을 탓하는 한편으론 입맛이 자꾸만 씁쓸해진다. 공신력이라는 포장으로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마케팅이 이렇게까지 잘 먹히는 현실 때문이다.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니 소셜 미디어 마케팅이니 기법은 날로 화려해지지만, 이런 꼼수 같은 식품 마케팅이 아직도 버젓이 영향력을 떨친다. 아마도 믿을 만한 미식 비평이 없는 우리 사회의 허술한 기반에서 피어난 현실일 테다. 아리송한 기관의 애매한 인정이 나의 선택을 합리화하는 이유가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럴싸한 유명세로, 번쩍이는 금메달로 맛을 재단하는 건 혀에게 미안한 일일 뿐이다.
- 에디터
- 손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