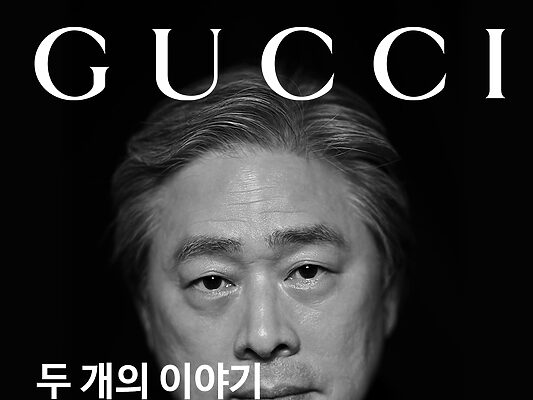애덤 브라운은 2007년 올레바 브라운으로 혜성처럼 등장했다. 클래식한 구조, 간결한 디자인, 그리고 여유로운 감성까지. 테일러드 팬츠처럼 공들여 만든 스윔 쇼츠는 단순한 수영복이 아니라 ‘물속에서도 입을 수 있는 반바지’라고 부르는 게 더 맞았다. 게다가 프린트 컬렉션은 놀랄 정도로 산뜻했다. 그전까지 누구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수영복이었다. 이것이 애덤 브라운을 남성 수영복의 새 지평을 연 개척자이자 혁명가라고 부르는 진짜 이유다.
사진가였다고 들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술과 사진에 관심이 많았다. 올레바 브라운을 만들기 전까지 주로 하퍼스나 태틀러 같은 언론사와 일했다.
올레바 브라운을 만든 계기는 뭔가? 10년 전쯤, 생일 파티에 갔다가 수영장에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한 적이 있다. 여자 수영복은 거의 다 예뻤지만 남자들은 하나같이 어중간한 길이의 박서나 후줄근한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 그때 괜찮은 남자 수영복이 참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처음엔 재미 삼아 딱 1천 벌의 스윔 쇼츠를 만들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
그런데 왜 올레바 브라운인가? 같이 사업을 시작한 줄리아 심슨-올레바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녀는 이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금방 그만뒀지만.
브랜드를 시작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였나? 우리가 원하는 수영복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어서 애를 좀 먹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웠던 건 브랜드의 가치와 철학을 고객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일이었다. 명확한 비전을 갖는 것과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건 다른 일이니까.
그래도 올레바 브라운은 굉장히 빨리 성공했다. 2~3년 만에 해러즈나 바니스 뉴욕에 소개됐을 정도니까.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일화는 없나? 세 번이나 셀프리지의 문을 두드려 첫 주문을 따냈을 때. 우리 제품을 큰 시장에서 선보인다는 사실이 굉장히 뿌듯했다. 다니엘 크레이그가 < 007: 스카이폴 >에서 우리 수영복을 입고 나왔을 때도 기억에 남는다. 화면에 노출된 건 아주 잠깐이었지만, 피부로 와 닿는 매출 차이를 일으켰다.
올레바 브라운의 수영복은 다른 브랜드 제품과 어떻게 다른가? 우선 구조부터 다르다. 우리는 옛날식 스윔 쇼츠처럼 패턴을 만든다. 허리 밴드 하나에도 12개의 조각이 들어간다. 복잡하고 번거롭지만, 만들고 나면 확실히 다르다. 또 원단은 빛, 마찰, 소금물뿐 아니라 50밀리그램의 염소 테스트도 거친다. 그래서 색이 잘 안 바래고 훨씬 튼튼하다. 잠금 고리와 지퍼는 모두 니켈 알레르기 테스트를 거친 열저항성 소재로 만든다.
각각의 모델명은 세터, 불독, 스프링거, 데인 같은 개의 품종에서 따왔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내가 키우는 두 마리의 강아지를 보니 문득 그런 이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귀엽고, 기억하기도 쉬우니까. 독특한 캐릭터를 부여하기도 하고.
1960년대 앙티브 에덴록 호텔 수영장이나 아카풀코 프린세스 호텔 수영장 사진을 담은 수영복을 처음 봤을 때, 아주 새롭다고 생각했다. 사진 프린트 컬렉션은 브랜드 5주년을 기념해 만들었다. 그때 우리는 디지털 프린팅을 여러 방식으로 시도하던 중이었는데, 아예 사진을 인쇄해 넣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았다. 우리가 추구하는 감성과 라이프스타일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
고객의 사진을 수영복에 프린트해주는 ‘Design Your Own’ 서비스도 참 흥미롭다. 그건 고객들이 요청해서 시작했다. 사진 프린트 컬렉션을 론칭했을 때부터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이미지를 수영복에 인쇄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당신도 가지고 있겠지? 물론이다. 처음 만든 수영복에는 내가 키우는 강아지 사진을 넣었다. 풍경과 노을 사진을 프린트한 것도 몇 장 있다.
2011년부터는 리조트웨어와 RTW도 선보였다.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무엇인가? 브랜드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다른 카테고리로 고스란히 옮겨 심는 것.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 60퍼센트 정도. 그중 절반은 티셔츠와 폴로 셔츠다.
올 여름휴가지로 생각해둔 곳이 있나? 매년 8월 콘월에 간다.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도대체 그곳의 어디가 좋냐고 묻는다. 파도도 험하고 물도 차가운 곳이니까. 하지만 콘월에는 네 살 때부터 매년 갔고, 추억도 많다. 물론 올해도 갈 거다.
해변에선 주로 뭘 하나? 수영이나 서핑, 낚시를 한다. 파라솔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카드놀이도 하고.
좋아하는 해변 세 곳을 꼽자면? 콘월의 바비스 베이 Booby’s Bay와 멕시코 툴룸 Tulum, 생트로페의 팜펠로네 Pampelone다. 툴룸은 좀 거칠고 야성적인 느낌이 나는데, 해변이 길어서 몇 시간이고 걸을 수 있다. 반면 팜펠로네는 사람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그곳에서 술을 마신다면 뭐가 좋을까? 콘월에서는 물을 마신다. 거기서는 술이 별로다. 툴룸에선 차가운 라거, 팜펠로네에선 네그로니가 좋겠다.
노래는? 템포가 살짝 있는 시원한 분위기의 음악. 샘 펠트 Sam Feldt나 카이고 Kygo를 추천한다.
좋아하는 해변가 호텔이 있다면? 요즘은 보드룸에 있는 마카키지 Macakizi가 제일 좋다. 아니면 몰디브의 소네바 푸시 Soneva Fushi.
- 에디터
- 윤웅희
- 포토그래퍼
- COURTESY OF ORLEBAR BROWN
- 일러스트레이터
- 조성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