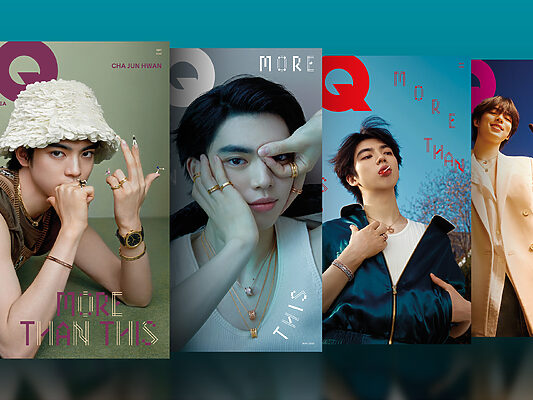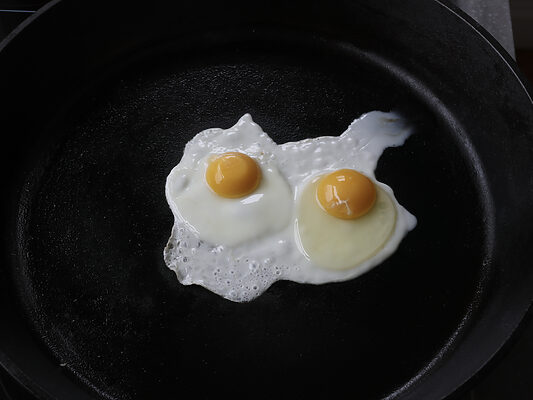<더 빅 슬립>은 좋아하는 작가 레이먼드 챈들러의 소설 제목이다. 담배를 짓이기듯 물고 다니는 사립 탐정 필립 말로의 아버지이자, 가난과 고독, 콧방귀와 비웃음의 대가인 챈들러의 작품 중에서 한 시절 유독 자주, 열심히 읽었다. 죽음이란 의미의 제목에서부터 맹렬하게 끌렸고, 굵고 검은 글씨로 빅 슬립이라고 쓰여 있는 커버를 보면, 죽은 노루처럼 팍 쓰러져서 폭력적이며 난폭하게 자고 싶었다.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던 때의 얘기다. 그땐 초저녁부터 자려고 누웠지만 불을 끌 때면 늘 새벽 다섯 시에만 잠들어도 다행이라고 여겼다. 쓸데없는 생각, 부질없는 생각, 아까 하고 방금 또 한 생각들이 계속 났다. 해가 질 무렵이면 슬슬 초조해지고 밤 뉴스의 시그널이 들리면 공포에 가까운 불안이 심장을 쳤다. 밤은 그렇다 치고 더 큰 문제는 아침이었다. 아주 조금이라도 자고 싶었지만 한숨도 못 잔 아침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눈은 모래를 뿌린 것처럼 따갑고, 밟고 있는 땅은 브리 치즈처럼 뭉근했으며, 머릿속은 뿌옇고 뜨거웠다. 뇌가 말랑거리는 끈적하고 축축한 기분. 그즈음 일과는 화내고 후회하고 크게 화내고 다시 후회하는 일의 연속이었다. 기분이 나쁘지 않은 순간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황에선 누구든 적이 된다. 판단력을 잃은 건 물론이고 나중에는 귀도 잘 안 들렸다. 그러다 어느 날, (마치 스위치를 딱 내린 것처럼) 기어코 자겠다는 결심을 버렸다. 일찍 불을 끄고 침대에 눕는 대신 서랍을 정리하거나 쉽고 짧은 글들을 소리 내서 읽었다. 벽에서 시계를 내리고, 매일 마시던 우유와 캐모마일 티도 잊었다. 여전히 잠은 못 잤지만 억울하고 분한 심정은 없어졌다.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못 자는 스스로를 책망하는 마음도 사라졌다. 맑은 밤엔 운전을 하고 대형 마트에 가서 와인과 맥주를 샀다. 손님이라곤 없는 휑한 마트에서 싸고 맛있고, 라벨이 유치하지 않은 와인을 천천히 고르는 건 꽤 재미있었다. 맥주는 주로 여섯 개 들이 반 다스로 상표 여러 가지를 번갈아 샀다. 그걸 차 트렁크에 싣고 집으로 오면서 댕그렁댕그렁 병 부딪치는 소리와 함께 라디오를 들었다. 심야 방송에서 백설희가 부른 ‘봄날은 간다’를 몇 번 들었는데, 그때마다 ‘실없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 이 부분이 1절에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와선 사온 술을 잘 정리하고 맥주를 마셨다. 안주로는 미역초무침이나 꽈리고추볶음. 그 시간에 술집이 아니라 집에 있는 게 새삼 좋았다. 빈 접시를 멸망한 행성인 듯 쳐다보는 눈이 풀린 남자, 술이 엎질러진 바닥에 친구가 미끄러져 턱에서 피가 줄줄 나는 데도 와하하 웃어대는 괴이한 여자, 친한 사이도 아닌데 술김에 진심을 고백하거나 애환을 토로하려는 싫은 자, … 술집의 아마겟돈, 술집의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고 진저리를 치면서 혼자 웃었다. 조용히 맛있다고 느끼면서 술을 마시고 약간 따분해하는 그 순간이 좋았다. 어떤 날은 그러고 나면 조금쯤 졸렸다. 깊이 잠들지 못하고 꿈을 많이 꾸긴 해도 잠은 잤다. ‘멜라토닌’과 ‘나이트워크’ 없이도 몇 시간은 잤고 아침에 일어나면 뿌듯했다. 이윽고, 저녁 테이블에서 누군가 불면증 때문에 오늘이라도 얼른 들어가 누워야겠다고 할 땐, “더 있다 가요. 자려고 안 하면 잘 수 있어요” 충고를 해주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건 전부 몇 년도 훨씬 더 전의 얘기이고, 이제는 밤마다 너무 졸려서 문제지만. 오히려 요즘은 그때의 불면증이 모처럼 다시 와주길 기다리면서, 잠 못 드는 흰 밤을 자주 생각한다. 이렇게 짧고 아름다운 봄밤, 잠이나 자고 있기엔 너무 아까워서.
- 에디터
- 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