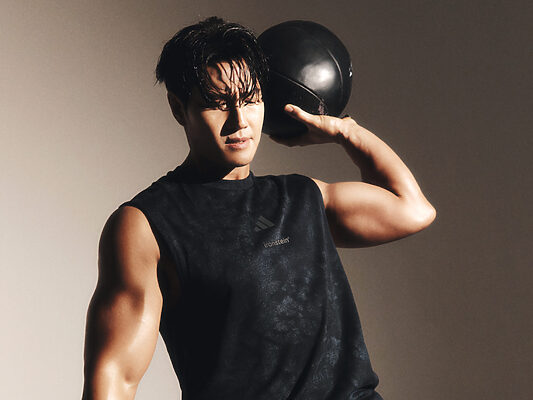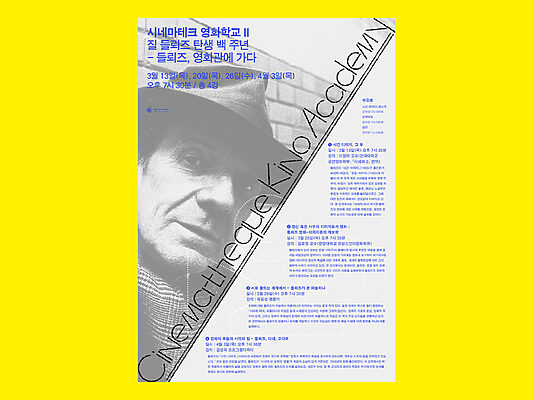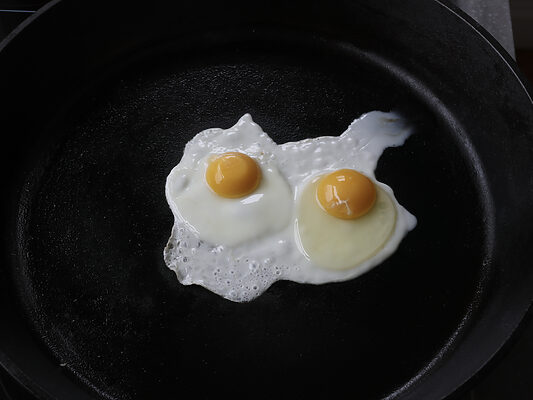캔슬 컬처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밀레니얼 세대의 사회운동이다. 과격한 묵살과 집단 공격으로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보이콧 행위는 이대로 괜찮을까?

2019년 10월 버락 오바마는 생전 처음 꼰대라는 소리를 들었다. 시카고 오바마 재단이 주최한 대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액티비즘이 아니다. 해시태그를 달고 ‘난 이렇게 정치적으로 깨어 있고 의식이 있다’고 자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 누군가의 이름에 ‘Is Over Party(끝났다)’, ‘Cancel’ 등을 조합한 해시태그를 달고 그들을 보이콧하는 것. ‘캔슬 컬처’ 이야기다. 문자 그대로 너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의미의 과격한 ‘언팔’을 뜻한다. 이제껏 JK 롤링, 지미 팰런, 카니예 웨스트, 라나 델 레이 등이 ‘캔슬’ 당했다. 이유는 각자 다르면서도 같다. JK 롤링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발언으로 TERF(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급진적 페미니스트)라는 비난을 샀고, 지미 팰런은 20년 전
그러니까, 주로 성소수자 혐오, 특정 성별 비하 그리고 인종 차별 등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들이 캔슬의 대상이다. 오바마가 꼰대가 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오바마의 말과는 달리 캔슬 컬처는 ‘남을 판단하는 태도’가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MZ세대의 사회운동이니까. 이제 우리는 거리로 분연히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서 해시태그라는 확성기를 달고 목소리를 낸다. 세상은 변했다. 미디어에서 차별적인 기사를 게재하거나 사회적 강자가 권력을 남용할 때 친구 몇몇과 분노하는 대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거다. 뭐로? 악플이라는 새로운 무기로. 여론은 힘이 세다. 광고주는 광고를 끊고 사람들은 불매운동을 벌인다. 이렇듯 집단적이고 수평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데 이게 액티비즘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그리고 지난 7월 미국 <하퍼스> 매거진에 글 하나가 실렸다. 제목은 ‘정의와 공개 토론에 대한 서한’. JK 롤링,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 베스트셀러 작가 말콤 글래드웰,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자 (북한을 ‘악의 축 Axis of Evil’이라 처음으로 표현했던) 데이비드 프럼 등 이름만으로도 위압감이 드는 150여 명의 지식인이 모여 캔슬 컬처의 위험성에 경고를 날린 것이다. 그들은 실제 각 분야의 권위자, 지도자들이 대중의 비판을 피하는 데 급급해 일관된 기준 없이 편향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특정 사상만을 옹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묵살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이렇게 강조했다. “나쁜 의견을 물리치는 방법은 노출과 논쟁, 설득이지 묵살이나 배척이 아닙니다”
물론 인터넷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소수자의 목소리를 배제하려는 건가? 판단은 지식인의 특권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사상의 퇴치는 자유 경쟁에 맡기자는 전형적인 서구 자유주의자들의 탁상공론 아닌가? <가디언>은 ‘캔슬 컬처가 자유로운 논쟁을 위협하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찬반 의견을 모은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150여 명 중 하나인 예일 대학교 교수 사무엘 모인은 “캔슬할 수 있는 권한이 남용되고 있다. 최근 사건들은 성공적인 운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다양한 의견의 접근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라며 서명한 이유를 밝혔고, 칼럼니스트 네스린 말리크는 “당신이 틀렸다는 말을 듣는 것을 폭도들의 야유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애초에 정답은 없었다.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다. 작년 오바마 발언 당시 ‘캔슬 컬처에 대한 오바마의 매우 꼰대적 시선’이라는 칼럼을 게재했던 <뉴욕 타임스>는 서한 발표 일주일 후 이번엔 ‘캔슬 컬처에 대한 10가지 논점’ 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글의 10가지 항목 중 1번은 이거다. “캔슬이란 부적격하다고 생각되는 의견이나 행동을 한 대상의 고용과 평판을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설명을 덧붙였다. “핵심 단어는 ‘고용’과 ‘평판’이다. 멍청이, 파시스트, 얼마나 신랄하게 욕을 먹든지 간에 당신의 고용과 평판이 심각하게 위협받지 않는다면 진정한 캔슬이라고 할 수 없다.”
캔슬 컬처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품는 의견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명인들은 가장 쉽게 캔슬의 대상이 되지만 반대로 쉽게 캔슬당하지 않는다. 부와 명예가 강력할수록 끄떡없다. 각종 가십과 발언으로 여러 번 캔슬(시도)된 테일러 스위프트는 “인터넷에서 캔슬당하는 것은 TV 속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다행히) 그녀는 여전히 살아남았다. 끝끝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JK 롤링은 <하퍼스>의 공개 서한을 비롯해 각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18년 앨범
정작 진짜 캔슬을 당하는 건 일반인이나 소수자다. 뉴욕에서 PR 일을 하던 저스틴 사코라는 여성은 비행기에 올라 “아프리카로 가는 중, 에이즈에 걸리지 않길. 농담, 난 백인인데!”라는 트윗을 올린 뒤 잠이 들었다. 12시간 후 그녀의 삶은 지옥이 됐다. 사람들은 저스틴에게 인종 차별주의자라는 꼬리표를 붙였고 저주를 퍼부었다. 열흘 동안 그녀의 이름은 구글에서 1백22만 번 검색됐으며 ‘신상이 털린’ 저스틴은 결국 해고됐다. 우리나라에서도 10여 년 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KBS 예능 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해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는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분노를 샀던 한 여성 말이다. 아직까지 ‘루저의 난’이라고 회자되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여성은 당시 학교를 휴학해야만 했다.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루저녀’의 해고를 종용하는 항의가 쏟아졌다는 이유로 취업 하루 만에 잘렸다는 근황이 전해질 정도였다.
가나에서 온 방송인 샘 오취리의 경우는 또 어떤가? 블랙페이스를 한 의정부고 학생들의 ‘관짝소년단’ 졸업 사진을 “흑인의 입장에서 불쾌하다”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그는 사라졌다. 사람들은 과거 JTBC <비정상회담>에서 그가 눈을 찢는 시늉을 한 장면을 찾아내 앞뒤 맥락 없이 동양인 비하라고 비난했고, 그는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 <대한외국인>에서 하차해야만 했다. 물론 캔슬된 사람들은 사과하거나 해명했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산산조각 나는 과정을 관전하며 환호했다.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 1년 전, 10년 전, 20년 전 당사자들이 남긴 댓글 하나, 사진 한 장을 캔슬의 근거로 더해가면서.
이 글을 쓰는 지금 트위터의 트렌드 키워드는 ‘#CancelKorea’다. 필리핀의 틱톡 인플루언서 벨라 포치의 욱일기 문신이 이 반한 운동의 시작이었다. 한국 네티즌의 분노에 그녀는 곧바로 역사에 대해 잘 몰랐고 현재 문신을 지우기 위한 예약을 잡았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일부 한국인들은 ‘가난한 나라’, ‘무식하고 작은 민족’, ‘못생겼다’는 인종 차별적인 모욕을 멈추지 않았다. 명백하게 낯 뜨거운 한국인의 잘못이다. 지금 캔슬 컬처의 추세와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삭제되어도 마땅하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사회 정의 구현인가? 광기가 아니고? 글 / 권민지(프리랜스 에디터)
- 피쳐 에디터
- 김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