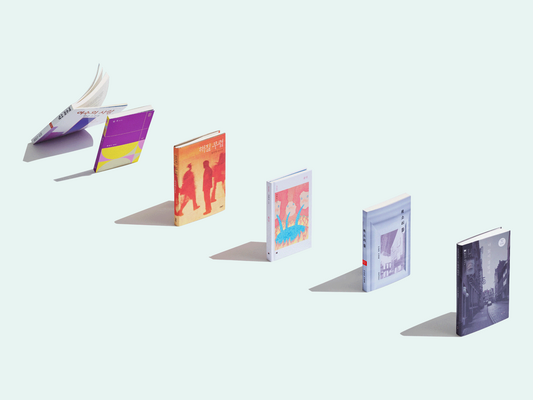엠넷은 ‘이 지경이 되어도’ 비슷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고 계속 만든다. ‘조작’에 대한 재판 결과는 뒷전으로 미뤄둔 채로.

“나중에 다시 또 도전할 거예요.” Mnet [캡틴(CAP-TEEN)]에 출연했던 한 10대 소녀가 오디션장을 떠나며 한 말이다. 아마 이 소녀 외에도 수많은 이들이 같은 말을 하면서 오디션장을 떠나갔을 것이고, Mnet 측은 이중에서도 느낌이 가장 잘 전달되는 청소년의 말을 편집해 내보냈을 것이다. 이때 느낌이라고 함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가장 극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내지는 너무나 부족한 실력으로 심사위원들의 혹평을 받아 시청자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청소년들의 말을 직감적으로 알아챈 제작진의 감상을 뜻한다. [슈퍼스타K] 때부터 [프로듀스 101]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몇몇 참가자들이 “악마의 편집”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던 바로 그 직감에서 비롯된 제작 기술 말이다.
‘가수의 꿈을 지닌 십 대 자녀를 둔 부모들이 내 자녀의 가수로서의 가능성을 직접 심사위원에게 물어보고 평가를 받는 신선한 포맷의 오디션 프로그램.’ 현재 방송 중인 [캡틴]의 소개 문구다. 여기에는 ‘신선한 포맷’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 프로그램 자체를 뜯어 보면 부모가 등장해서 아이와 무대에 함께 선다는 점 외에는 특별히 신선한 점은 없다. 이전 [슈퍼스타K]나 SBS [K팝 스타], 하다못해 MBC [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 등에 이르기까지, 어린 자녀를 오디션 무대에 세워둔 수많은 부모들의 모습이 비춰졌다. 심사위원들의 입을 통해 자녀가 들은 호평 혹은 혹평을 무대 뒤에서, 무대 아래에서 들었을 뿐, 사실상 부모들이 눈물을 터뜨리며 아이를 안아주는 모습은 여러 차례 전파를 탔다. [캡틴]에서 굳이 다른 점을 꼽자면 연예인을 꿈꾸는 아이들을 좀 더 혹독하게 다루거나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강조된다는 것 정도다. ‘치맛바람’이라는 부모, 특히 여성 혐오의 시선이 내포된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선한 포맷’을 만들어냈다고 말하는 Mnet의 모습은 분명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같은 시기에 방송 중인 MBN [미쓰백]은 이런 Mnet의 서바이벌 오디션 포맷을 그대로 답습하되, 오히려 실패한 아이돌이 돼버린 여성 출연자들의 삶을 전시하며 관심을 받는다. 나인뮤지스, 스텔라, 디아크, 크레용팝 등 타인의 눈으로 보기에 실패한 걸그룹 활동을 끝마친 이들이 갖게 된 트라우마까지 활용해 경쟁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그나마 성공한 걸그룹으로 꼽혔던 티아라의 소연은 “동생들의 인생곡을 빼앗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경쟁에서 물러났다는 점은 상징적이다. 하지만 이런 경향이 놀랍지는 않다.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부정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련자들이 법정에 출두하고 있을 때에도 Mnet은 [투 비 월드클래스]라는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방송 중이었고, 여기서 탈락한 소년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고 만든 [I-LAND]로 또다시 연습생 서바이벌 프로그램 하나가 새로운 인기 팀을 탄생시켰다.
국내 최고라고 손꼽히는 기획사와 함께 언제든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회사와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이득이 무엇인지 알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에 참여하는 기획사들. 그러다 실패하면 불행한 아이들의 이야기로 시선을 돌려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사. K-POP 산업은 0.001%의 성공과 99%가 넘는 실패의 확률 중 무엇 하나 상업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각오로 현재를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점철돼있는 듯하다. 타인의 힘겨운 삶을 전시하고 그것을 즐기는 누군가들의 모습은 ‘불행 포르노’라는 개념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고, 손택이 말하던 “타인의 고통”에서도 결코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르노와 고통의 전시가 안겨주는 금전적 이득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결국 지금의 Mnet과 MBN을 비롯한 수많은 서바이벌 마니아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코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만큼 성공이 보장된 길이 있다면 재판 결과나 인권에 대한 고려쯤은 조금 뒷전으로 미뤄두어도 된다는 자신만만함이 엿보인다.
- 에디터
- 글 / 박희아(대중문화 저널리스트)
- 사진
- 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