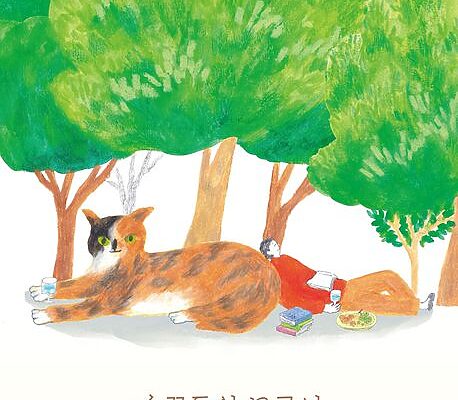안녕하신지요. 개인과 단절이란 키워드가 0과 1처럼 빈번한 디지털 시대에도 어째서 누군가는 편지를 보내고 받는지, 그 마음이 궁금해 몇 자 적습니다.

일하는 내내 인터뷰를 하기만 했는데 요즘은 인터뷰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정 서비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기 때문이었다. 뉴스레터다. 2021년 11월 말에 뉴스레터 관련 대담에 나갔고, 12월 초에도 뉴스레터를 특집으로 다루는 모 매체와 원고 기고 건으로 사전 미팅도 했다. 반면 뉴스 소비자로서의 나는 뉴스레터를 거의 구독하지 않는다. 내가 만드는 게 잘 들어오는지 보는 정도다. 내 주변 몇 명에게도 물어보니 실제로 보는 뉴스레터는 없다고도 한다. 뉴스레터는 일부 뉴스 생산자들만의 호들갑일까, 아니면 정말 새로운 뭔가일까?
뉴스레터 서비스가 늘고 있는 건 확실하다. 뉴스레터 스타트업으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뉴닉은 2021년 6월 25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받았다. 이들은 2018년 서비스를 시작해 2021년 5월 기준 구독자가 30만 명에 이른다. 뉴스레터라는 비즈니스 모델에 이만큼의 돈을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뉴스 생산력이 보장된 전통적 언론매체도 각자의 뉴스레터를 만들었다. <한겨레>, <조선일보> 등 각종 매체가 뉴스레터 서비스를 시작해서 운영 중이다. 뉴스레터로 전국 단위 작가가 될 만큼 유명해진 이슬아 작가의 뉴스레터 ‘일간 이슬아’ 등도 뉴스레터 인기를 말할 때 뺄 수 없는 사례다.
이런 경향은 세계적으로 봐도 마찬가지다. 특히 <뉴욕타임스>나 <파이낸셜 타임즈> 등 유료 구독 모델에 성공한 회사들의 서비스가 돋보인다. 이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잘게 쪼개어 뉴스레터 서비스로 사람들에게 보낸다. 2021년 12월 시점으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43개의 뉴스레터를, <뉴욕타임스>는 무려 82개의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다. 신문 지면이 다양한 뉴스가 쌓여 있는 적분된 지면이었다면, 뉴스레터는 이를 각자의 주제로 다시 잘게 쪼개 미분해서 보내주는 소규모 전단과 같다. 뉴스 제작과 네트워킹에 노하우가 있는 글로벌 언론사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경우다.

그 사이에서 두아 리파가 눈에 띈다. 팝스타 그 두아 리파 맞다. 두아 리파는 2022년 초 새로운 프로젝트인 ‘서비스 95’를 론칭한다고 밝혔다. 다름 아닌 뉴스레터 서비스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오래전부터 친한 친구들에게 이것저것 추천하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타일, 문화, 사회 정보를 알린다는 이야기다. 두아 리파까지 나설 정도면 뉴스레터 서비스가 무르익었다고 봐도 될 듯한 가운데 눈에 띄는 건 서비스의 디테일이다. 모든 서비스는 두아 리파의 편지로 마무리될 거라고 한다. 두아 리파의 팬이라면 꽤 친근한 마음이 들 듯하다.
친밀감. 뉴스레터 서비스에서 느낄 수 있는 핵심적 가치 중 하나다. 뉴스레터의 인기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내 메일함에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친근한 마음이 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뉴욕타임스>의 뉴스레터 모델도 친근감을 강조한다. 특히 유명인과의 친근감. <뉴욕타임스> 뉴스레터 중에는 <뉴욕타임스>를 구독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뉴스레터가 있다. 그 뉴스레터의 공통점은 개인이 큐레이션했다는 점이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나 밴드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의 기타리스트이자 활동가인 톰 모렐로가 자신들의 관점을 덧붙인 뉴스레터를 보낸다. 뉴스레터만 구독해도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싶은 유명인이 자기 생각을 말해주니 실로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뉴스 생산자 입장에서도 뉴스레터는 매력적이다. 초기에 시작할 때 자본이 많이 들지 않고, 특히 두아 리파나 톰 모렐로 같은 유명인이라면 본인의 유명세만 이용해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결제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졌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결제를 하게 하려 해도 사람들이 돈을 쉽게 쓰게 하기가 어려웠는데,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일반인도 신용카드 번호 입력 정도로 아주 쉽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 마찬가지라서 네이버페이 모듈 등을 화면에 내장해 결제하는 방식이 일반화됐고, 한국의 뉴스레터 툴 서비스 스티비 역시 일반인이 유료 뉴스레터를 구동시킬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이유는 뉴스레터 제작이 남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 역시 뉴스레터 두 개를 제작하고 있다. 하나는 배달 플랫폼 요기요와 함께 만드는 요기레터다. 식품 공장이나 부엌 등 음식이 만들어지는 현장을 찾아가 취재한 사진과 원고를 뉴스레터에 담는다. 다른 하나는 내가 직접 운영하는 ‘앤초비 북 클럽’이다. 아무도 소개하지 않을 법한 책을 다루고, 내가 여기저기 기고하는 원고 링크를 담는다. 아주 작은 범위의 서평 겸 박찬용의 개인 소식지다.
왜 뉴스레터를 만드냐는 질문을 몇 번 받았는데 나의 답은 늘 같다. 뉴스레터인 건 중요하지 않다. 나는 풀타임 잡지 에디터로 일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직업을 (동영상이 아닌) 정지 화면 페이지 프로듀서라 생각하며 일해오고 있다. 종이 잡지라 치면 그 잡지 전체를 프로듀스하는 게 내 일이다. 요즘의 컴퓨터 디스플레이 환경에서는 지면이 반응형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나의 일은 페이지 소스인 원고와 사진을 총괄하는 일로 변했다. 뉴스레터는 이렇게 바뀐 형태의 페이지 프로듀스를 해보기 좋은 기회였다. 나는 여전히 종이 잡지라는 고정된 틀과 그 안에서의 가능성을 사랑하지만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제작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그리고 원고와 사진이라는 페이지의 기본 재료가 만들어진다면 그 다음부터의 확장은 신규 제작보다 훨씬 쉽다. 만들어진 콘텐츠를 재료 삼아 다시 책으로 만들 수도 있고 사진을 크게 인쇄해 전시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기레터의 경우 ‘지면 콘텐츠의 로 데이터 Raw Data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앤초비 뉴스레터는 조금 다르다. 내가 콘텐츠의 로 데이터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내는 건 같으나 결정적인 차이는 내가 알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다. 콘텐츠 생산자 입장에서 뉴스레터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반응이 명확하게 보인다는 점이다. 뉴스레터를 발행하다 보면 관련 수치를 전부 확인할 수 있다. 구독자 수, 메일을 열어본 오픈율, 내가 심어둔 링크를 사람들이 누르는 비율 등 콘텐츠 운영과 관련된 주요 수치가 야구 관련 통계처럼 떠오른다. 좋은 수치든 나쁜 수치든, 결과가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사실 앞에 겸허해진다. 지금은 생업이 바빠 몇 달 쉬고 있지만 나 역시 개인 뉴스레터를 계속 운영할 생각이다.
“인스타는 아무나 하고 유튜브는 너무 어려워서요.” 뉴스레터의 인기 비결에 대해 물었더니 누군가 대답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나는 이 말이 뉴스레터의 미래일 거라 생각한다. 개인이든 단체든 자신의 메시지를 알릴 수 있는 시대다. SNS는 누구나 개설과 접근 가능하나 그만큼 진입 장벽이 낮다. 영상을 만들고 꾸준히 소통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기에 개인이든 기업이든 유튜브 제작 및 채널 운영에는 자원이 많이 소요된다. 그 사이의 난이도에 뉴스레터가 있다.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익숙해지면 크게 어렵지 않고, 독자들은 친밀함을 느끼고, 결제 시스템 구축도 쉽다. 플레이어 입장에서 뛰어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 더 많은 뉴스레터가 더 많은 사람의 메일함을 노릴 것이다. 글 / 박찬용(앤초비 북 클럽 운영자)
- 피처 에디터
- 김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