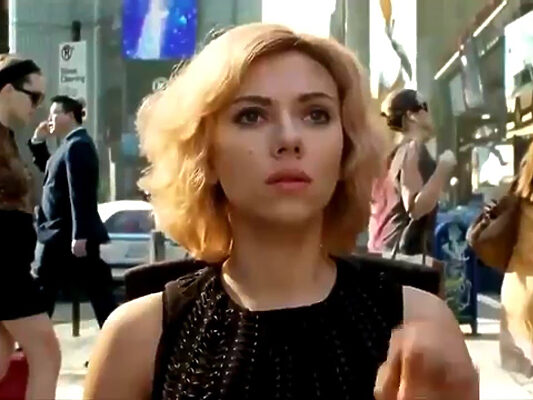누구나 붙일 수 있지만 아무나 그럴 수 없다. 아트 시장은 날로 커져가는데 ‘미술’을 ‘구매’한다는 행위는 과연 얼마나 폭넓어졌을까?
글 / 백세희(작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2년 한국 미술시장 규모가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밝힌 수치다. 정확히는 1조 3백77억원이다. 불과 3년 전인 2019년에는 고작 3천8백11억원이었다. 불과 3년 사이에 2.7배가 커졌다. 전국에서 열리는 아트페어도 50개가 넘는다. 일주일에 한 개꼴로 열리는 셈이다. 그 중 몇 개의 메이저 아트 페어는 구경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허구였나 싶을 정도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 덕분에 문화 예술 전문 변호사를 자처하는 필자에게도 소송이나 자문을 벗어난 재미있는 제안이 종종 들어오곤 한다. 아트페어 무대에서 컬렉터(구매자)를 상대로 강연을 하거나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미술품을 구매할 때 주의할 점 같은 것을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이다. ‘선수들’끼리의 계약서를 주 로 만지다 이렇게 일반 컬렉터들을 상대로 한 강연을 준비하다 보면, 새삼스럽게 미술시장의 폐쇄성에 놀라게 된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해보려 한다.
먼저 미술품 구매에 문외한인 이들을 위해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해보자. 미술시장은 크게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나뉜다. 1차 시장은 미술품이 작가의 손을 떠나 처음 컬렉터를 만나는 곳이다. 즉, 작가의 신작新作이 팔리는 시장으로 주로 갤러리가 역할을 맡고 있다. 갤러리와 전속 계약을 맺은 작가의 신작은 반드시 해당 갤러리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
반면에 2차 시장은 이미 팔렸던 작품을 다시 거래하는 곳이다. 한마디로 중고 시장이다. 알다시피 미술품은 여느 중고 거래와는 다르다. 일반적인 중고품은 반값이 되곤 하지만, 미술품은 오히려 가격이 오른다.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는 낙찰가 경신 뉴스 덕분에 옥션(경매회사)이 2차 시장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갤러리가 중개인이 되어 거래하는 구작舊作의 양도 상당하다.

미술품 구매의 주요 창구는 무엇일까? 최근에는 중개인 없이 직접 판매하는 젊은 작가들도 있긴 하지만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다. 국내 미술시장의 절반인 5천 21억의 매출은 갤러리가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은 경매와 아트페어가 나눠 갖는다. 여러 갤러리가 마치 백화점처럼 모여 있는 곳이 아트페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갤러리의 역할이 한국 미술시장의 75퍼센트를 상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술품 판매는 갤러리가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갤러리가 컬렉터와 만나는 방식은 상당히 폐쇄적이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고인물’ 시장이다. 최근 뜨내기 컬렉터의 증가로 미술시장의 전체 파이가 커진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억’ 단위의 작품은 고인물 시장에서 유통된다. 곧 억대 진입이 유력한 작가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다. 이런 정보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어떤 정보이기에 검색조차 어려울까?
기본적으로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평판이다. 기세가 한풀 꺾인 작가로 여기지는 않는지, 지속적인 창작을 해 시장을 유지해나갈 여력이 있는지, 높은 평가를 받는 이른바 A급 도상을 내어놓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정보 말이다. 나아가 특정 작가의 작품을 어떤 컬렉터가 소장하고 있는 지도 중요하다. “백세희 변호사가 소장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는 아무도 동요하지 않을 테지만, “홍라희 여사가 소장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을 고칠 것 같다. 삼성가가 소장한 그림이라니! 대단한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진다. 이렇게 어떤 컬렉터는 그림의 가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만약 그 컬렉터가 권위있는 미술관이라면 효과는 배가 된다. 미국 미술 시장을 대표하는 ‘카스텔리 갤러리’의 창립자 레오 카스텔리 Leo Castelli는 당시 검증되지 않은 작가였던 로버트 라우센버그 Robert Rauschenberg의 몸값을 높일 방법을 고민했다. 그는 뉴욕 현대 미술관 MoMA에 제발 그림을 사달라고 간청했다. 그를 현대 미술사에 자리잡게 하려는 의도였다. 뜻대로 되지 않아 애를 먹었지만, 결국 라우센버그의 작품은 MoMA에 소장되었고, 이 사실은 이후 작가는 물론 갤러리 자체의 명성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MoMA는 왜 마음을 바꾼 것일까? 사실 MoMa는 라우센버그의 그림을 구입하지 않았다. 당시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카스텔리가 MoMA에 ‘기증’한 것이라 한다. 일종의 영업 비용으로 투자를 한 셈이다. 홍보 효과는 확실했다.
미술관에 소장되게끔 만들어 작가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이런 마케팅 전략과 그 성공 여부는 고객들이 쉽게 내막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니다. 수많은 작가 중 누가 권위있는 기관의 소장 작가가 될 것인지는 고인물 시장에서 교환되는 정보다. 미술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오랜 기간 정성 들여 관계를 쌓아 나가야만 한다. 아쉽게도 필자는 미술시장에서 벌어지는 분쟁이나 계약 관계 등을 만지는 주변인에 머무르고 있어 이런 종류의 고급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만 있을 뿐, 알맹이를 공유받지는 못한다. 알아도 투자할 목돈이 없지만 말이다.
자, 네트워크는 변변치 않지만 우여곡절 끝에 정보를 찾아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고 좋은 그림을 살 기회가 쉽게 오는 것도 아니다. 대기 명단에 오르기 조차 힘들다는 뜻이다. 아트 페어에 가보면 이미 상당수의 그림에 빨갛고 동그란 스티커가 붙은 걸 볼 수 있다. 이미 팔린 그림이라는 뜻이다. 일반 입장에 오픈런을 해도, VIP 프리뷰에 오픈런을 해도 이미 빨간스티커 일색이다. 어떻게 된 걸까.
인기 있는 작가의 그림은 아트페어가 열리기 전에 팔린다. 갤러리가 기존 고객들에게 출품 리스트를 미리 보여주기 때문이다. 즉, 기존 고객이 우선권을 갖는다. 그림을 사기 위해서는 ‘기존’ 고객이어야 하고, 기존 고객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 에 그림을 샀어야 한다. 순환적이며 모순적인 이 문제는 결국 초보 컬렉터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 갤러리와 관계를 맺으며 지속적인 컬렉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가에 달려 있다. 물건을 애원하며 사는 게 정상인가? 수요·공급 원리에 따르면 이상 할 것도 없다. 잘나가는 작가의 그림은 언제나 공급이 부족하다. 빨간 스티커의 주인이 되는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다.

드디어 유명 작가의 그림을 살 기회가 왔다고 가정해보자. 갤러리가 제시한 가격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알다시피 미술품의 가치는 고정적이지 않으며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경매의 낙찰가처럼 공개된 지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공개되었다고 해서 그 형성 과정이 늘 온당한 것도 아니다. 경매에서 응찰자 두 명이 담합해 계속 호가를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낙찰가를 뻥튀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담합에 이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자전거래의 의혹이 짙은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2021년 3월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 회사인 크리스티에서 무려 6천9백30만 달러에 낙찰된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 Beeple의 NFT 작품 ‘Everydays : The First 5,000 Days’도 그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 돈으로 무려 7백85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3백메가바이트의 이미지 파일이 링크 된 토큰을 구매한 이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NFT 사모펀드인 메타퍼스 Metapurse의 설립자 메타코반 Metakovan이다. 자신의 자금력으로 작품의 가치를 뻥튀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가해졌다. 특별할 건 없다. 이런 방식의 가격 부풀리기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뤄진다. 갤러리 문 바깥의 이들은 작가의 유명세나 작품의 가격에 대해 심오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짐작하곤 한다. 마케팅을 비롯한 여러 자본적 속성이 만들어내는 내막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는 이르지 못하기 쉽다. 한국 미술시장 1조원 시대. 과연 우리는 미술시장이 드디어 대중적으로 변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빨간 스티커의 주인은 따로 있다. 대중화를 쉽게 말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