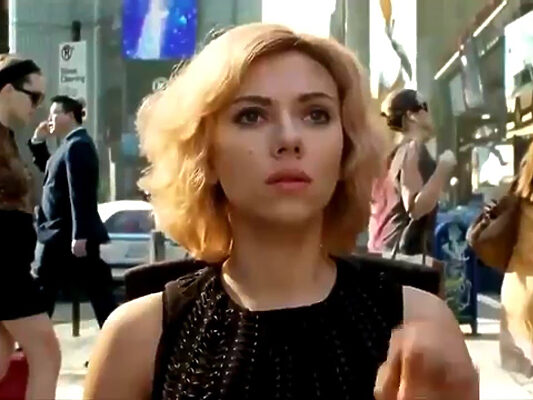탕후루 대신 꽂아보았어요.

찐빵
“밀가루를 손에 묻힌 지 40년 넘었지.” ‘종로 전설의 왕만두’라는 간판을 내걸려면 가히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가. 무림의 고수 같은 자기소개가 동글동글한 찐빵 반죽이 층층이 놓인 수레 선반 너머로 건너온다. 3개 3천원짜리 찐빵 하나 달라 하자 허연 김이 푹푹 새어 퍼지는 은색 솥뚜껑을 열고 뽀얗게 부풀어 오른 찐빵을 후두둑 담아주신다. 어디 맛 좀 볼까. 밀가루를 입에 묻힌 지 30년 넘은 식객으로서 훑어보겠다. 첫째, 판매 회전이 느려 오래도록 쪄서 표면이 축축하고 늘어졌는가: 아니오. 둘째, 육안으로 측정 시 식감이 푹신해 보이는가: 네. 셋째, 절반을 갈랐을 때 빵과 단팥의 비율이 평화로운가: 잠시 보류. 아뜨뜨 뜨거워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다. 열기가 가시기를 기다리며 불현듯 궁금해졌다. 그런데 선생님, 찐빵 하면 본래 안흥찐빵이 유명하잖아요. 종로 전설의 왕만두에서 쪄내는 찐빵은 무엇이 다를까 그 속살이 궁금해 말문을 열긴 열었는데 아차, 자칫 무림의 고수에게 건넛마을 전설의 고수 소문을 전하며 시비를 부추기는 꼴이 된 것 같다. “아 다르지.” 단박에 뽑히는 칼날. “그 집은 그 집 나름대로 조화가 있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 집 빵하고 저 집 빵 하고 다 다르지. 나는 부드럽게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버터와 우유를 조금 더 넣어요.” 독침 대신 돌아온 현답. 안흥찐빵은 안흥찐빵이 맛있는 생각대로 만들었겠지, 허허 웃는 찐빵 고수의 이름은 박홍관이다. 박홍관 선생이 만든 찐빵은 쫀득하니 부드럽고 간간히 통팥이 씹히는 소가 담백하고, 안흥찐빵 중에서도 50년 전통 심할머니 집 것은 보다 팥이 달고 빵의 밀도가 높다. 결론은 “이 찐빵 저 찐빵 다 맛있다.” 밀가루를 손에 묻힌 지 40년 차 장인의 단언이다.

호두과자
빈대떡, 잡채, 꼬마김밥, 육회, 그득하게 먹거리를 쌓아 올린 광장시장 노점 행렬 사이에서 웬 호두과자만 굽고 있는 노상 하나가 발길을 잡는다. 호두과자 왜 만들고 계세요? “내가 좋아해서.” 깜찍한 즉답에 웃음이 터지자 중년의 호두과자 선생도 너털웃음을 짓는다. “진짜예요.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셨거든.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 꼭 풀빵을 사오셨는데 어느 날 호두과자를 사오신 거예요.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었어. 그게 1978년 일이에요. 그날부터 심심하면 호두과자, 커서 낚시를 가도 호두과자,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도 호두과자, 호두과자를 달고 살았지.” 그러다 직접 호두과자를 굽기 시작한 것은 2년 8개월 전부터의 일이다. 아내의 제안으로 그간 몸담아 온 거친 직업 환경 대신 소박하나 좋아하는 일을 좇아왔다. “평생 전기 일을 했어요. 전기 사고도 보고, 쉬운 환경이 아니었어도 놓기가 쉽지는 않았죠. 그런데 또 이 일이 적성에 맞더라고. 손님들이 맛있다고 다시 찾아오면 그보다 기쁜 게 없어요.” 감성호두라는 명패 아래에서 익숙하게 호두과자를 굽는 박민우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애호가의 마음 그 자체다. “내가 호두과자 사먹을 때 제일 서운했던 게 호두를 형식상 넣고, 팥도 형식상 넣고, 그게 제일 서운했어요. 내가 서운한 건 딴 사람들도 서운하겠지 싶어서 호두도 많이 넣고 팥도 많이 넣고 그래요. 이 주물틀도 기성품보다 4밀리미터 더 크게 주문 제작했어. 반죽은 1백 퍼센트 우리 쌀로만 만들고요. 나는 밀가루나 찹쌀 섞인 것보다 쌀로 만든 게 부드럽고 좋더라고. 나름대로 푸짐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우리 호두과자 알이 확실히 좀 더 크고 윤기 나죠?” 서운할 틈이 없다.

떡꼬치
이곳 선생님은 “우리나라 팔도 넓은 땅에 왜 우리를 소개합니까” 되물었지만, 서울 경복궁과 국립현대미술관, 북촌 일대를 거닐 예정이라면 빠지지 않고 추천되는 계획 ‘떡꼬치 사먹기’의 본거지가 그리 말씀하시면 섭섭하다. “남들이 보기에 유명한 거지 저는 그냥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파를 숭덩숭덩 써는 주인 선생님의 뒷모습이 파 향마냥 매콤하다가도, 소문대로 여기가 방앗간이었던 게 맞느냐는 질문에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진실함이 툭 튀어나온다. “방앗간이었다, 정미소였다 소문이 많은데 우리는 쌀가게였어. 그냥 쌀가게. 그래서 가게 이름이 풍년 쌀 농산이잖아. 농산이라는 게 쌀가게 이름이에요. 그러다 택배가 시작되면서 쌀가게가 죽었지.” 쌀을 전하던 가게는 그 후 “낙원동의 조금 아는 방앗간에서 떡을 빼서” 떡볶이를 끓이고 떡꼬치를 만들어왔다. “쌀가게 한 지는 한 20년···. 몰라 너무 오래돼서. 하여튼 떡볶이를 해볼까 하니까 우리 딸내미가 하는 말이 떡꼬치라는 것도 있다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 했지.” 떡으로 거듭난 쌀은 여전히 윤기 나고 차지고 쫄깃하고 풍요로워서 이곳은 금세 지나가는 이들의 허기를 채우는 곳이 됐다. “여기 동네가 예쁘다고 예전에 사진 동아리들이 많이 왔어요. 근처에 가게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먹고, 사진 찍어 자기들끼리 올리고, 이게 입소문이 나서 방송국에서 오기 시작하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입소문이 괜히 날리가.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튀긴 떡에 연하게 붉은 소스를 얇게 발라 건네주는 떡꼬치 하나가 참 맛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비법 소스는 뭐예요? “아유, 이제 그만해.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냥. ‘떡볶이, 떡꼬치가 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사람은 한번 가보시라.’”

어묵
“길에서 먹는 오뎅이 왜 맛있는 줄 알아요?” 그야 찬바람이 불어올 때 후후 불어 먹는 맛이 뜨끈해서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게에서 파는 오뎅과 마트에서 파는 가정용 오뎅 성분 비율이 달라서예요.” 어묵 전문 분식집 최강어묵 운영 8년 차 이정석 대표는 감성형보다 사고형 인간에 가까울까, 어묵 국물 김과 함께 사족이 피어오르다 사라졌다. “밖으로 유통되는 오뎅에는 전분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명 꼬불이 어묵이라 부르는 이 어묵처럼 납작한 종이 모양의 본 어묵을 접어 만들어보려고 해도 가정용 것은 힘없이 부러진단다. “집에서 해 먹으면 왜 이 맛이 안 나냐는 손님들이 있는데 그게 전분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위로는 담담히 말하면서도 아래로는 쉴 새 없이 반죽을 톡톡 굴려 수제 어묵을 만드는 숙련된 손길에 홀린다. 아···. 거리에서 어묵을 베어 물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 이 집의 꼬불이 어묵은 이정석 대표가 맛본 여러 가지 시판 제품 중 가장 붇지 않아 택했다는 새로미어묵의 것이다. 그러나 이곳의 진정한 실세는 매일 5백여 개씩 갓 만드는 수제 어묵이다. “이건 예전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시장에서 하던건데 이제 그다음 세대들이 하기를 꺼려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그렇고 많이 없어져버렸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요기도 되고 식사도 좀 되고 간편하게 드시라고 그냥 하게 된 거예요.” 수제 어묵은 생선살에 더하고 싶은 재료 무엇이든 넣으면 되는 재미가 있다는 그가 내미는 은근한 자랑은 왕새우 어묵. 그럼에도 사라져 가는 무엇에 대해 그렇게까지 거창한 사명감은 없었다고, 빵 만들다가 어묵 만들게 됐을 뿐이라는 이정석 대표의 손이 여전히 바삐 생선살 반죽 위를 오간다. 역시. 어묵은 감성이지.
- 포토그래퍼
- 김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