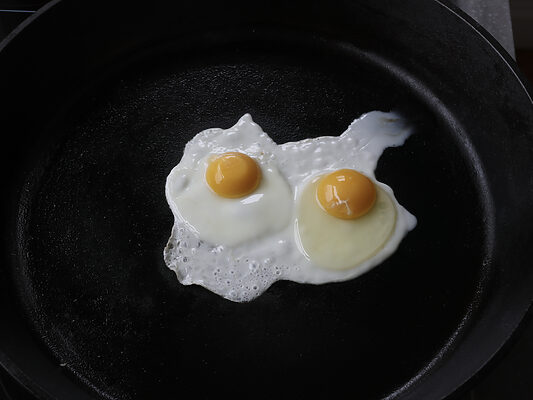올 시즌 NBA에 등장한 새로운 ‘돌연변이’ 빅맨들.
글 / 이동환(<루키> 기자, NBA 칼럼니스트)

모든 단체 구기 종목은 저마다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포지션이 있다. 야구에서는 포수, 배구에서는 세터, 미식축구에서는 쿼터백이 가장 중요하다고들 말한다. 농구에서 오랫동안 이 같은 논리에 속했던 포지션은 센터였다. 농구는 3백5센티미터의 림에 공을 집어넣는 스포츠다. 당연히 골을 가진 이가 3백5센티미터의 림에 가까울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19세기 후반 제임스 네이스미스 박사가 발명한 이래, 사실 농구는 1백 년 넘는 세월 동안 ‘키 큰 놈’들의 스포츠였다.
강산이 열 번 넘게 바뀌는 세월 동안 농구의 규칙도 많이 달라졌다. 드리블이 가능해졌고, 하프코트 바이얼레이션과 페인트존 가까이 3초 동안 머무를 수 없다는 규칙도 생겼다. 그 와중에도 센터는 어떤 포지션보다 중요한 포지션이었다. 흔히 ‘빅맨 big man’이라고 불리는 ‘키 큰 놈’들은 공격에서는 림 가까이서 슛을 던지고, 수비에서는 림 가까이서 슛을 막아내고 리바운드를 잡아내며 경기를 쥐락펴락했다. 요즘 흔히들 말하는 ‘정통 빅맨’은 바로 그런 선수들이었다.
항상 곧은 소나무같이 골대 주변을 서성거리던(?) 빅맨의 역할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였다. 마이크 댄토니 감독이 이끄는 피닉스 선즈가 농구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다. 가드 스티브 내시가 볼을 오래 소유하며 경기를 주도하고, 빅맨 아마레 스타이더마이어는 내시를 위해 스크린을 걸어주며 2 대 2 게임에 집중했다. 양쪽 45도와 코너까지 코트를 최대한 넓게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2 대 2 게임의 위치를 미드레인지가 아닌 3점 슛 라인 밖까지 끌어올렸다. 오랜 이탈리아 리그 지도자 생활을 통해 자신만의 공격 농구 철학을 만들고 이를 NBA에서 실험한 마이크 댄토니 감독의 주도 아래 약체 피닉스는 순식간에 리그 최고의 팀으로 거듭났다. 훗날 농구 전문가들에 의해 ‘댄토니 혁명(D’antoni Revolution)’이라고 불리게 된 농구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난 시기였다.

물론 댄토니의 피닉스가 등장한 후에도 정통 빅맨 중심의 농구는 여전히 계속 됐다. 농구의 세상은 그렇게 쉽게 뒤집히지 않았다. 하지만 댄토니가 일으킨 변화의 물결은 서서히 리그 안에서 번져갔다. 일단 각 팀이 정통 빅맨 2명을 함께 쓰기보다는, 슈팅력을 갖춘 스트레치형 빅맨을 정통 빅맨과 함께 쓰는 것을 점점 더 선호하기 시작했다. 이미 리그 최고급 파워포워드였던 디르크 노비츠키는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역사상 최고의 슈팅 빅맨으로 자리를 잡았다. 스트레치형 빅맨의 슈팅 범위는 이제 미드레인지를 넘어 3점 슛 라인까지 확대됐다. 2006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지명된 이탈리아 출신 빅맨 안드레아 바르냐니는 3점 슛을 던지는 스트레치형 빅맨을 자처했고, 2008년 드래프트를 통해 데뷔한 빅맨 케빈 러브는 포스트업, 미드레인지 점퍼, 3점 슛을 모두 던지는 전천후 슈팅 빅맨이 됐다. 2010년대 초반 마이애미 왕조의 탄생에 공헌한 크리스 보시는 3점 슛 라인 안팎에서 슈팅을 하며 코트를 넓혔고, 이는 르브론 제임스와 드웨인 웨이드의 돌파 공간을 확보하는 기반이 됐다.
’키 큰 놈‘들은 더 이상 림 근처에서만 놀지 않았다. 오히려 미드레인지, 3점 슛 라인 밖까지 빠져나와 슛을 하며 현대 농구의 트렌드인 ‘스페이싱 spacing’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같은 빅맨의 변화는 2010년대 초중반 더 가속화됐다. 새크라멘토 킹스의 드마커스 커즌스는 포스트업뿐만 아니라 3점 슛 시도, 슈팅 페이크 이후 시도하는 돌파를 통해 마치 포워드와 가드를 연상시키는 플레이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빅맨이 단순 픽앤팝을 통해 3점을 던지는 데 그치지 않고, 슛 페이크 이후의 돌파까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커즌스가 증명해내기 시작한 것이다. 빅맨들이 단순 외곽 슛 시도를 넘어 드리블 돌파라는 가드와 포워드의 기술까지 장착하면서 NBA에는 괴물 같은 빅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014년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에 3순위로 지명된 카메룬 출신 빅맨 조엘 엠비드는 2백16센티미터의 키에 가드 같은 크로스오버 드리블과 유로스텝, 풀업 점프 슛으로 NBA 톱클래스 대열에 합류했다. 엠비드는 2년 연속 NBA 득점왕을 차지하며 2000년대 초반 샤킬 오닐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센터 득점왕의 시대를 열었다. 엠비드와 같은 드래프트에서 41순위로 지명된 니콜라 요키치는 정통 센터 선배들처럼 포스트업하고, 가드같이 패스하고 2 대 2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비다스 사보니스, 블라디 디박, 크리스 웨버 같은 선배들을 제치고 NBA 역사상 최고의 컨트롤 타워로 거듭났다. 또 켄터키 대학 출신의 센터 칼 앤서니 타운스는 데뷔 2년 차 시즌부터 100개가 넘는 3점 슛을 매년 성공시키고 40퍼센트가 넘는 3점 슛 성공률을 기록하며 자신을 “역대 최고의 슈팅 빅맨”이라고 불렀다. 타운스 역시 커즌스나 엠비드처럼 가드 수준의 돌파를 보여준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올 시즌, NBA에는 새로운 ’돌연변이‘ 빅맨들이 또 등장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빅터 웸반야마와 오클라호마시티 선더의 쳇 홈그렌이다. 2021년 농구 월드컵에서 각각 프랑스와 미국 대표팀의 에이스로 맞대결을 펼치기도 했던 웸반야마와 홈그렌은 올 시즌 NBA에서 나란히 충격적인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다. 웸반야마와 홈그렌은 ’댄토니 혁명‘ 이후 차례로 등장했던 선배 돌연변이 빅맨들과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무척 마른 몸이다.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웸반야마와 홈그렌 같은 체형의 선수는 “살부터 찌워라”라는 이야기를 듣기 일쑤였다. 2015년 드래프트를 통해 데뷔한 2백21센티미터의 빅맨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의 사례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당시 포르징기스는 몸이 너무 말라 큰 우려를 샀다. 빅맨에게 두꺼운 몸과 탄탄한 웨이트는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조건처럼 여겨지던 시대가 저문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하지만 웸반야마와 홈그렌은 매우 마른 몸을 가지고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농구를 한다. 둘은 두꺼운 몸을 가지지 못했지만 마른 몸을 활용한 스피드와 돌파로 상대 수비를 휘젓는다. 마른 몸은 오히려 무릎, 발목 같은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이는 ’부상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홈그렌의 경우 몸은 말랐지만 체중 대비 힘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런 힘을 활용해 수비에서 상대 빅맨과 힘 싸움을 펼치는 것은 물론이고 공격에서는 강한 드리블 돌파를 보여준다. 여기에 가드 수준의 매우 안정적인 볼 핸들링과 점프 슛 능력을 가지고 있어 공격에서는 아예 핸들러 역할을 수행하면서 팀 공격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수비에서는 엄청난 블록 슛 타이밍 포착 능력을 활용해 골밑을 보호한다.

웸반야마도 마찬가지다. 이미 프랑스 리그에서부터 키가 2백24센티미터인 선수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의 슈팅력과 드리블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웸반야마는 NBA에서 이 능력을 활용해 자신보다 20센티미터 이상 작은 포워드들과 매치업되고 있다. 어떤 때는 센터처럼, 어떤 때는 포워드처럼 뛰며 상대 수비를 휘젓는다. 워낙 압도적인 높이와 몸 길이를 가지고 있어 그동안 농구에서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움직임과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긴 팔을 활용해 수비에서 강력한 우산 효과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다.
2010년대 들어 농구의 주도권은 빅맨에서 가드에게로 넘어갔다. 2 대 2 게임과 3점 슛 시도를 주도할 수 있는 가드들이 팀 공격을 이끌고 빅맨들은 스크린으로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커즌스, 엠비드, 요키치, 타운스처럼 가드나 포워드 부럽지 않은 공격 기술을 갖춘 빅맨들이 등장하면서 다시 변화가 일어났고, 웸반야마와 홈그렌은 이제 농구에 또다시 ’빅맨 전성시대‘가 도래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농구가 변화하는 동안 센터 역시 끊임없이 변화했으며, 마침내 센터는 경이로운 진화를 이뤄내며 다시 농구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웸반야마와 홈그렌의 등장과 활약은 그래서 더욱 눈여겨봐야 한다. 다시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