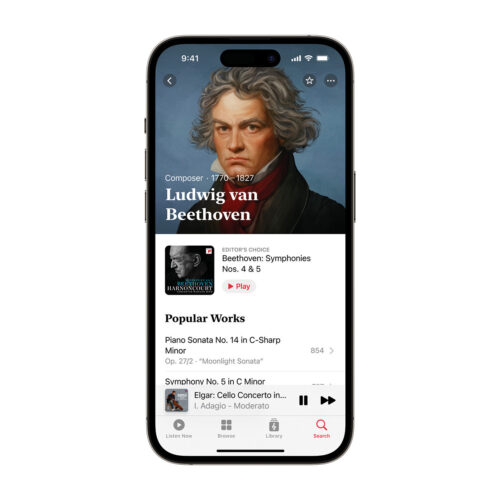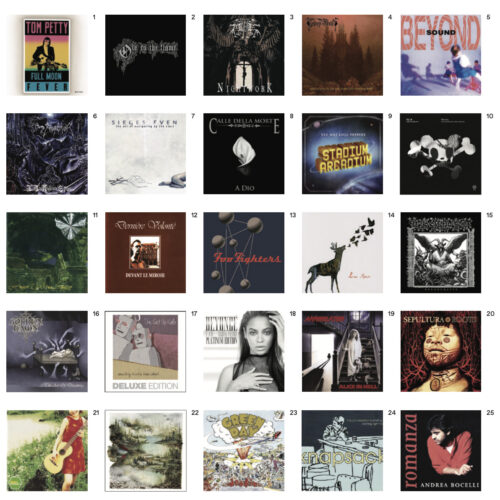왕창 울게 하거나 눈물 멎게 하거나. 슬픔을 팽창시키는 선율.
E. WALDTEUFEL: THE SKATERS’ WALTZ, OP. 183(LES PATINEURS) by Vienna Volksoper Orchestra, Franz Bauer-Theussl

상실, 자책, 원망, 우울, 무기력, 염세, 절망, 또 어떤 타입의 슬픔이든, 우두커니 잠겨서 휩쓸리다 보면 사슬같은 생각은 쉼터를 찾듯 어린 시절로 다다른다. 슬프기엔 어렸던 때, 내 삶의 고향 같던 때. 어떤 풍파도 뿌리 뽑지 못하는 내 깊이 내린 뿌리였던 때. 미취학 아동 때부터 고학년이 될 때까지 유치원이나 공부하는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다. 대신 태권도를 배웠다. 그것에 대해 의문을 품어본 적도 없다. 그냥 그게 당연했다. 5학년이 됐을 때, 친한 친구들은 모두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물음표의 고리가 자라나 처음 내 맘에 걸렸고, 태권도가 당연하지 않았다. 엄마를 졸라 태권도를 그만두고 피아노를 배웠다. 1년쯤 배우고 ‘체르니 100’이 되었을 때, 학원에서 주최하는 연주회에 나갔다. 엄마가 동대문에서 양복을 맞춰주셨다. 구두까지. 머리에는 무스를 바르고 빗으로 쓸어 넘겼다. 신나는 노래를 힘차게 연주했다. 중학교에 가면서, 다시 친구들을 따라 공부하는 학원에 다니고 싶어져 피아노 학원을 그만뒀다. 짧았던 피아노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과 같은 이유로 끝났다. 끝난 줄 알았다. 20년 동안. 하지만 30대가 된 요즘, 음울한 에너지가 맴돌고 미어지거나 찡할 때면 응원가처럼 혹은 군가처럼 내가 연주했던 이 곡을 듣는다. 슬픔을 소화하기엔 버거웠던, 즐거움밖에 모르고 순수했던, 의도치 않게 이기적이었던 그때로 돌아가 짧게라도 신나고 힘찬 척 억지로 맑아질 수 있다. 황현승(유니버설뮤직 미디어 마케팅)
TCHAIKOVSKY: STRING QUARTET NO.1 IN D MAJOR MOV. 2_ANDANTE CANTABILE by NOVUS Quarrtet

많은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현악 사중주 작품으로 차이코프스키 현악 사중주 1번을 떠올리는 이유는 아마도 이 지독히 아름다운 2악장을 품고 있어서가 아닐까.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 작품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에피소드로 유명한 ‘안단테 칸타빌레’. 현악 사중주단의 네 현악 연주자가 악기에 약음기를 끼고 이 곡을 연주할 때면 눈앞에서 낡은 흑백영화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오래된 추억들이 성급히 고개를 내민다. 추억들은 아름답지만 어느새 부지런히 상실을 환기시킨다. 오래전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고 마음 아파하던 시간에 노부스 콰르텟이 이 곡을 본 공연 후 앙코르로 연주해준 적이 있다. 그날 어두운 객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아티스트와 매니저로 20년 가까운 시간을 함께하다 보면 공과 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어떠한 세월의 역사가 쓰이고, 좋았던 날과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은 시간도 적지 않게 존재할 법도 싶다. 하지만 내가 노부스 콰르텟에게 항상 감사해야 하는, 절대적인 애정과 믿음을 보낼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어쩌면 이러한 순간 때문이 아닐까. 그들이 보내준 낮고 따뜻한 위로로 그 매니저는 이렇게 아직 일하고 있으니. 이샘(목프로덕션 대표)
VALENTIN SILVESTROV: THE MESSENGER(FOR PIANO AND STRINGS) by Hélène Grimaud

직업상 음악을 추천할 일이 종종 있다. 대체로는 나만의 음악 보따리를 아낌없이 푸는 편이지만 간혹 망설여지는 순간이 있다. 그건 그 곡을 찾는 데 많은 공을 들였거나 나만 알고 싶은 음악이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들으면 닳기라도 할 것 같은, 순수함에 때가 묻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인데, 그렇게 잠가둔 작품들 중 한 곡이 이 음악이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현대 음악 작곡가 발렌틴 실베스트로프의 ‘더 메신저 The Messenger’. 음악은 가사가 있는 가곡이나 오페라 등이 아닌 이상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예술이지만, 어떤 곡은 듣자마자 그 의미를 느끼기도 한다. 슈만의 환상곡 Op.17 3악장을 처음 들었을 때 ‘이건 완전히 사랑인데’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처럼. 이 곡은 ‘깊은 그리움’으로 다가왔다.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애틋한 정서였다. 잊을 수 없는 옛 연인을 꿈에서 만났어도 어쩌지 못하고, 손을 뻗어보아도 의미 없음을 이미 아는 듯한 가슴 아림이 느껴졌다. 그 후 우연히 이 음악에 대한 짧은 글을 읽고 나서는 들을 때마다 슬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작곡자가 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쓴 작품이라는 내용이었다. 김동연(프란츠 대표)
F. CHOPIN: WALTZES by Dinu Lipatti, The Last Recital(Live at Besançon International Festival, 1950)

음악을 고를 때 딱히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음악을 비롯한 모든 예술을 가슴보다는 머리로 즐기는 축이다. 슬픈, 정확히는 슬프다고 ‘여겨지는’ 음악을 들을 때면 슬픈 감정에 동화되기는커녕 계속 생각한다. 코드와 음계를 이렇게 쓰고 톤을 저렇게 잡고 연주를 그렇게 하니 슬픈 느낌이 연출되는군! 따라서 슬플 때 찾는 궁극의 한 곡 같은 건 없다. 하지만 관점을 틀어서 ‘슬픔의 본질을 고민하게 만드는 연주’를 묻는다면 어찌 제시할 수 있겠다. 백혈병으로 서른세 살에 타계한 피아니스트 디누 리파티가 마지막 리사이틀에서 연주한 쇼팽 왈츠 13곡이다. 본디 14곡이지만 여기엔 13곡뿐이다.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연주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진통제를 잔뜩 맞고 무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아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소위 ‘접신한’ 연주를 선보였지만 결국 마지막 곡은 연주하지 못했다. 쇼팽의 왈츠는 양과 음의 감정을 폭넓게 넘나드는 춤곡이다. 생의 마지막 힘을 쥐어짜 건반 위에서 춤을 춘 그 기록을 듣고 있으면 연주의 경이로움과는 별개로 계속 묻게 된다. 인간 그리고 생명은 무엇이냐고. 그러다 보면 이따금 무언가가 차오르기도 하는데, 어쩌면 그게 슬픔의 본질 아닐까? 홍형진(소설가, 콘텐츠 기획가)
J.S. BACH: GOLDBERG VARIATIONS, BWV 988 – ARIA DA CAPO by Víkingur Ólafsson

무대에 오른다. 황금올리브색 머리칼이 건반을 덮는 융단처럼 곱게 빗겨져 있다. 두 손을 배에 가지런히 모은 채 꾸벅 인사하는 저이는 최소 서울에서 여기까지 6시간, 고국에서 서울까지 16시간, 하루 꼬박 날아와 통영에 닿은 아이슬란드의 피아니스트 비킹구르 올라프손. 소리가 색채로 보인다는 그의 눈에 이곳은 무슨 색일까. 의자에 앉은 그가 숨을 들이켜는 것도 잠시, 그새 건반 속에 빠져드는 두 손이 의아하지만 아, 나 이런 순간이 보고 싶어서 여기 왔지. 인간이 맨몸으로 행하는 숭고한 어떤 장면, 표현할 언어를 찾을 수 없는 찰나를 맞이하고 싶었다. 내 속에 붙은 감정의 쭉정이들을 왈칵 으깨 없애줄. 눌리는 건반 깊이만큼 고개를 주억거리며 선율을 타는 앞자리 좌측 아저씨의 뒷덜미와 자꾸만 등받이 아래로 낮아지는 – 아마도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을 – 앞자리 우측 소녀의 정수리 사이로 나는 조금 눈물이 났다. 마침내 끝에 다다라 검은 동굴 앞에 우그러져 깊이 파묻힌 저기 저 몸이, 들썩 뗀 엉덩이를 따라 일순 바닥을 구르며 보인 왼발 구두 밑바닥이, 틈없이 붙어 있다 가닥가닥 해져 흘러내린 머리칼이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이제는 사라져서. 그러나 여기 남아서. 김은희(<지큐> 피처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