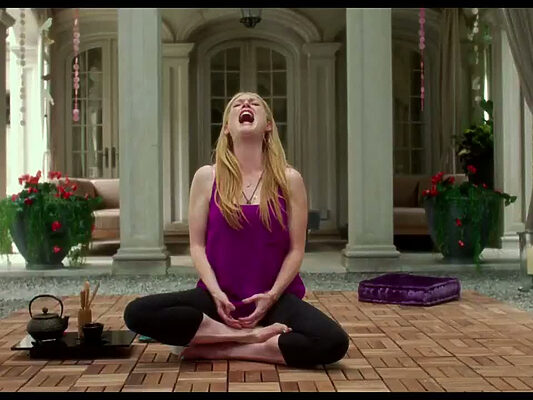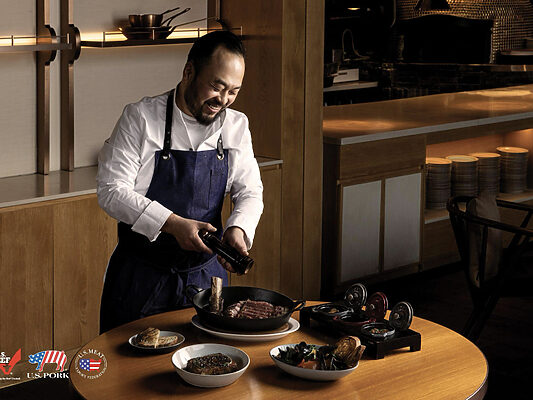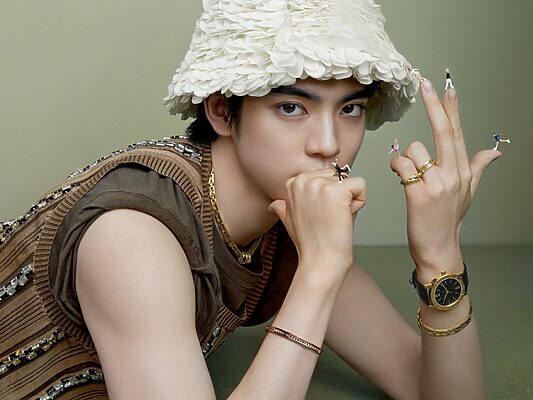“요즘 애들은…”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새어 나왔다면, 지금이 바로 내 소통 방식은 어떤지, 점검 타이밍.

“라떼는” 봉인!
경험은 분명 자산이다. 하지만 그 경험이 ‘비교’로 작동하는 순간, 대화는 막힌다. 직장 문화, 업무 환경, 심지어 조직 내 권한 구조도 몇 년 사이 크게 바뀌었다. “나 때는”으로 시작하는 조언은 본인의 시대를 설명하는 데는 좋지만, 상대방의 동기를 꺾는 데도 탁월하다. 경험담은 상대의 고민이 충분히 나온 뒤에, 맥락에 맞춰 짧고 가볍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 대신 ‘어떻게’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왜 이렇게 썼어?”라는 질문보다 “다르게 구성해 본다면 어떤 식이 좋을까?”처럼 질문을 바꿔보자. 상대방의 설명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은 일방적인 지시보다 훨씬 생산적인 피드백을 만든다. 왜 이렇게 했냐는 질문은 질책처럼 느껴져 대화를 이어나가기 어렵다.
사적인 영역은 신중하게
점심 메뉴, 퇴근 후 계획, 연애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묻고 싶은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세대가 다르면 편하게 묻는 말의 기준도 다르다. 특히 신입 직원에게 지나친 관심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가벼운 일상 대화를 원한다면, 먼저 본인의 이야기를 오픈하고 반응을 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지나치게 무거운 주제를 오픈하는 것도 당연히 금물이다.

공감의 언어 바꾸기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는 공감의 반대말이다. 요즘 세대는 감정을 조율하는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업무상 어려움을 토로할 때, “나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보다는 “그런 상황이면 힘들었겠다”, “이거 신경 많이 쓰였을 것 같아” 같은 문장이 관계를 훨씬 부드럽게 만든다.
정확한 칭찬
아무 칭찬이 없는 것보다 “좋았어”, “수고했어” 정도 말을 건네는 것이 관계에서 훨씬 낫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자면 구체적인 피드백은 훨씬 강한 동기부여가 된다. “이번 기획은 디테일이 살아 있어서 발표 때 반응이 좋았어”처럼 어떤 점이 좋았는지를 짚어주는 칭찬은 ‘관심받고 있다’는 감정을 전해준다. 적절한 타이밍에, 성과와 연결된 언어를 쓰는 것이 핵심이다.
회식은 ‘옵션’
강요 없는 회식, 늦지 않는 회식, 선택 가능한 회식.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회식도 좋은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다. 더 이상 ‘회식은 문화다’라는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진짜 소통은, 공식적인 자리보다 일하는 방식에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