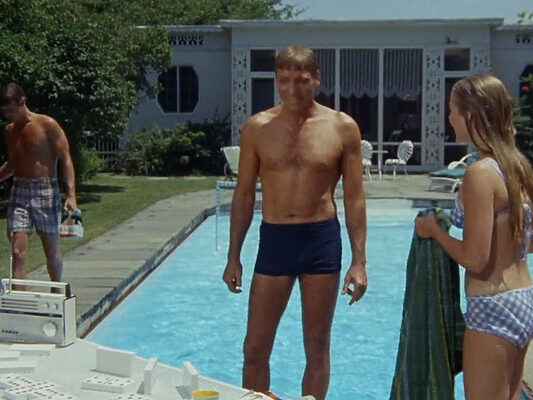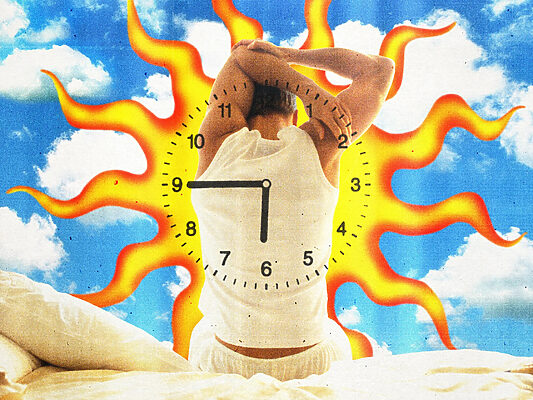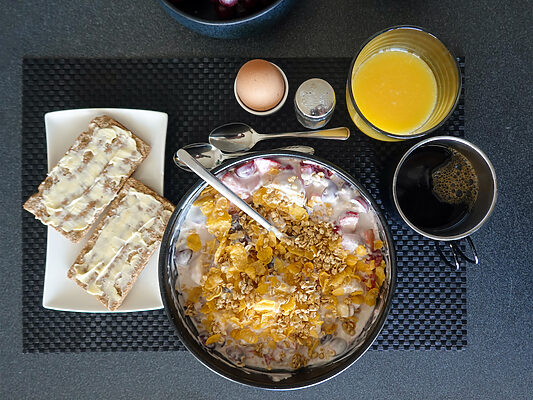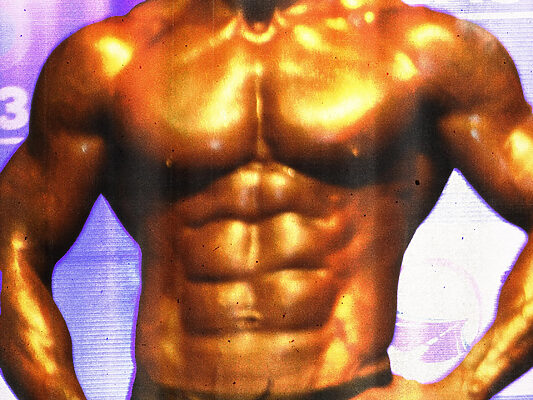우리 사고 속 깊이 자리 잡은 ‘원래 그래야 하는 것’에서 벗어나 나다운 삶을 선택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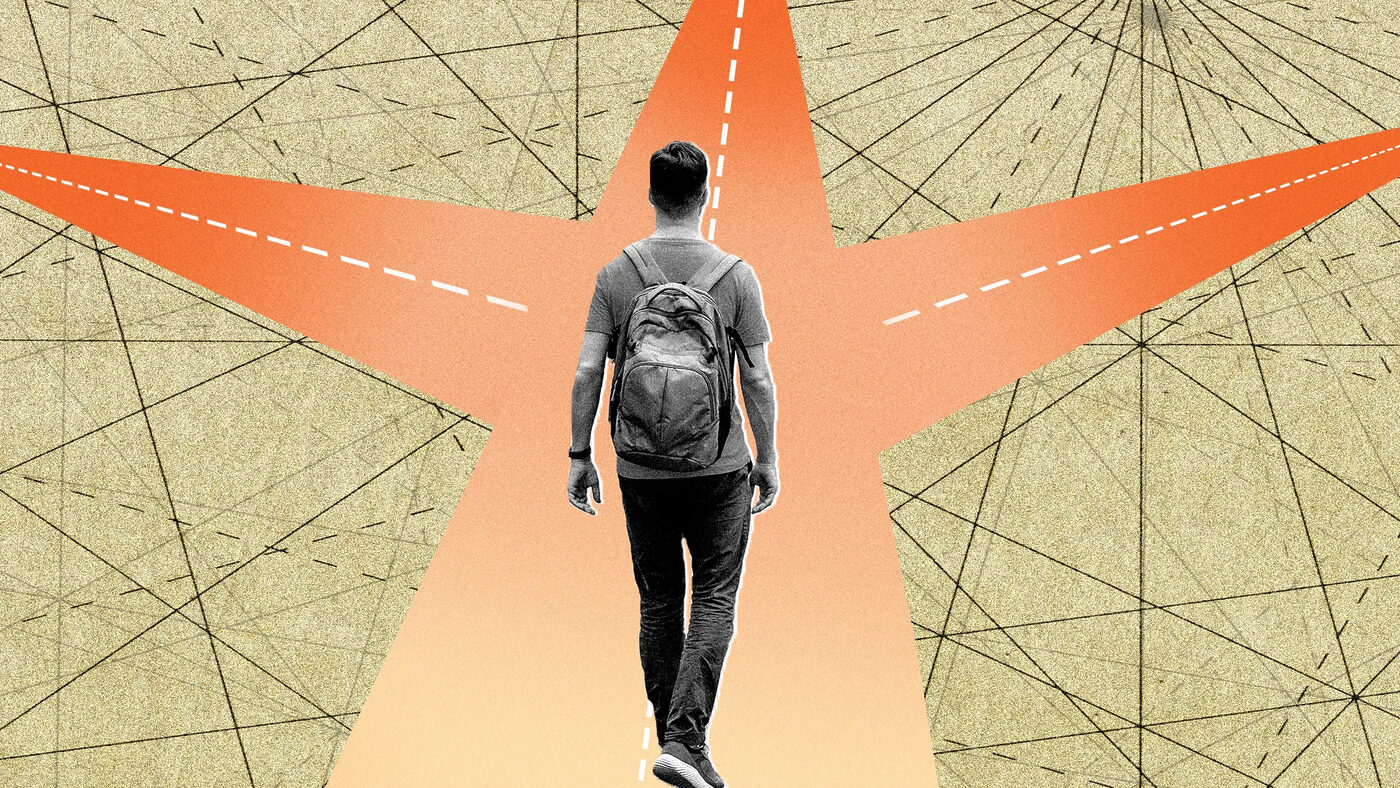
얀시 스트리클러Yancey Strickler의 새로운 미국 비전을 이해하려면, 우선 일상 생활을 이끄는 구조들이 완전히 만들어진 것이라는, 당연하면서도 불편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피아노의 생김새, 우리가 아침 식사로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이유,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글자의 모양,” 킥스타터 공동 창립자이자 전 CEO였던 스트리클러는 그의 책 This Could Be Our Future: A Manifesto for a More Generous World의 서문에 이렇게 쓴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다. 우리는 그것들을 ‘원래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전적으로 나나 당신과 같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개념이다.”
그는 이러한 ‘숨겨진 기본값’을 “우리 부족과 국가를 형성하는 관습, 전통, 사회적 규범”이라고 지적한다. “출생, 결혼, 죽음에 얽힌 의례들. 왜 우리는 어떤 색을 입고, 다른 색은 입지 않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야기들이다. 우리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삶의 흐름이다.”
스트리클러는 우리가 이런 신화를 의심하기보다는, ‘원래 그런 것’을 ‘그래야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간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미국인들의 사고 속에 특히 깊게 자리 잡은 하나의 흐름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재정적 극대화’라는 개념이다. 이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선택”이라는 믿음을 강요한다. 그는 이를 “모든 삶을 하나의 못으로 보는 망치”에 비유한다. 목표는 단 하나,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적 극대화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했고, 기후 악화를 부추겼으며, 정치적 불안정과 무례함을 낳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쓴다. “우리는 이 충돌 사고를 멀리서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고, 다른 사람들이 해결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이 모든 일과 자신이 별개라고 믿는다.”
그의 책은 행동 촉구의 외침이다. 돈이라는 단일 가치에서 다중 가치로, 즉 도덕성, 의미, 목적을 제공하는 이상으로, 사회를 이끄는 원칙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킥스타터는 2015년에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법적 의무를 가진 공익기업(PBC)으로 전환했다. 파타고니아 역시 대표적인 PBC이다.
가치 기반 생활로의 복귀 방법은 “벤토이즘(Bentoism)”이라 불리는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네 구역으로 나뉜 박스 형태의 도구, 일본의 벤토 박스처럼 생긴 것을 활용한다. 각각의 구역은 다른 관점을 나타낸다. 결정을 앞두고 각각의 구역을 고려한 뒤 행동에 나선다. ‘현재의 나(Now Me)’는 바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근시안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현재의 우리(Now Us)’는 내 행동이 가족, 친구,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 ‘미래의 나(Future Me)’는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나타내며, 내 원칙과 신념에 부합하는지 점검한다. ‘미래의 우리(Future Us)’는 “내 아이들이 살게 될 세상, 바람직한 미래”를 고려한다.
스트리클러는 이 도구를 사용하면 자기 인식을 깊게 하고, 단순한 이기적 행동이 아니라 ‘자기 일관성’을 가진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 그의 궁극적 신념은 다소 이상적으로 들릴지라도 사람들이 벤토이즘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기업과 조직들도 이를 따를 것이다. 그는 이것이 급진적으로 들릴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렇게 말한다. “버지니아 시골 농장에서 자란 평범한 내가 세상에 작은 물결을 일으켰다. 그것은 세상이 내가 배운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었다.”
Q. 킥스타터 성공이 당신의 세계관을 어떻게 흔들었나?
나는 항상 세상이 ‘화강암처럼’ 단단하다고 믿으며 자랐다. 세상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킥스타터가 성공하자 처음에는 신나고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차 흥분했다. “아,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이 사실 그렇게 굳어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감각이 생겼다. 스티브 잡스가 말했듯, 세상은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이 깨달음은 강력하고, 당신의 행동을 바꾼다.
Q. 그러니까 당신도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건가?
그렇다. 책에서 나는 ’30년 변화 이론’에 대해 썼다. 변화는 점진적이고 서서히 일어난다. 그레타 툰버그나 멸종 혁명은 현재 기후 변화 흐름 속에서 나타난 인물이다. 이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20년 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퍼즐 조각이 된다. 나 역시 내 아이디어를 10년간 밀어붙이고 나면, 다음 사람이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하려고 조급해하지 않는다.
Q. 지금 당장의 욕망을 억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현재의 나’가 지배하게 된다. 개리처럼 하루 종일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과도하게 자기 홍보를 하고, 사람들을 짜증나게 할 것이다. 대신에, “10년 후 벤토이즘이 이만큼 성장하려면, 올해 말까지는 이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숨을 쉴 수 있게 된다. 긴 시간대를 설정하면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
Q. 당신은 라디오의 획일화에 대해 멋진 장을 썼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 개인의 문제인가?
100% 시스템의 문제다.
Q. 인터넷이 분노와 공포를 증폭시킨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 인간의 문제 아닌가?
나는 사람들을 더 관대하게 본다. 모두가 자신이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스템과 초구조 안에서 옳고 그름을 배우며 자란다. 예를 들어, 3살짜리 아이에게서 인종적 편견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학습된 것이다.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시장 지배력을 얻으려는 수십 년간의 전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조직 내부에서는 성장을 원하는 욕구가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다른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
Q. 크레이그리스트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실리콘밸리에서는 크레이그리스트가 실패했다고 보지만, 당신은 아름답다고 했다.
크레이그리스트는 자신을 보호하려 하지 않고, 세상에 가치를 뿌렸다. 만약 그들이 모든 것을 움켜쥐려 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크레이그리스트는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았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태도다.
Q. 기업이나 조직이 가치를 창출하고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어디서 오는가?
교회를 제외하면, 기업이야말로 가치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장 많이 합의하는 공간이다. 물론 엔론처럼 ‘진실성’을 표방하면서 위선을 일삼은 사례도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CEO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치가 실제로 우리의 결과물에 영향을 미친다”고 진지하게 말한다. 이것이 시작점이다.
세계 10대 부국 중 5~6개국은 최근 5년간 포퓰리즘 운동을 겪었다. 이건 우리가 올바른 길에 있지 않다는 명백한 신호다. 주식 시장은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미국인의 43%는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기후 위기로 지리와 삶이 재편될 것이고, 정치 시스템은 붕괴하고 있다. 자살률은 오르고 기대수명은 다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상 현상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국가가 개입할 것이다. 이 기업의 목표를 ‘주주 극대화’에서 ‘모든 이해관계자 성장’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것도 변화의 신호다.
Q. 변화는 위기에서 시작된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위기가 오면 많은 에너지가 “모두 부숴버리자”로 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언가 더 나은 것을 세우자”로 에너지를 돌려야 한다. 문제는 상상력 부족이다. 정치적 해결책—예를 들어 그린 뉴딜—이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현재의 정치 시스템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시스템 자체를 재설정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치’와 ‘자기 이익’을 정의하는 방식의 변화다.
Q. 벤토이즘은 자기 이익에서 자기 일관성으로의 전환이다. 둘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우리의 발자국은 단지 ‘현재의 나’만이 아니다. ‘미래의 나’, ‘현재의 우리’, ‘미래의 우리’ 모두다. 벤토는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사랑스러운 도구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어렵고,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도움이 필요하다. 벤토는 우리가 가진 충돌하는 감정들을 정리해준다. 우리는 소비자로서 차를 사고 운전하지만, 동시에 미래의 우리는 환경을 지키자고 외친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자기 모순 속에서 살아간다.
자기 일관성은 자신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노력이다. 항상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기 일관성을 갖고 사는 것은 마치 매 순간 ‘플로우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 산책을 하거나, 공연을 보거나, 글을 쓰거나, 약물을 할 때 느끼는 그 몰입 상태를 평범한 오후 두 시에도 경험할 수 있다. 벤토는 당신의 에너지를 모든 영역을 밝히는 방향으로 이끌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