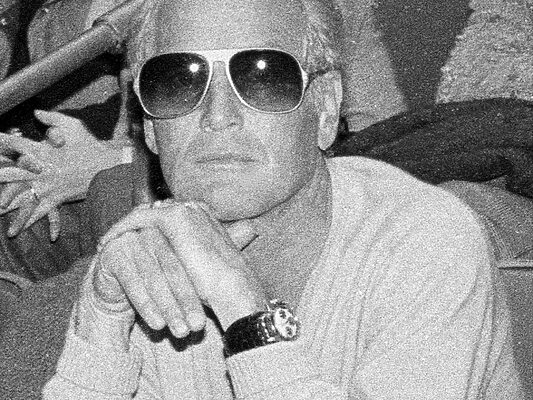입만 열면 이야깃거리의 절반이 자동차인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한 대 더 산다면?”

링컨 노틸러스
메르세데스-벤츠 CLS 400d를 타는 이유는 디자인 때문이다. 게슴츠레하게 노려보는 듯한 테일램프와 미끄럼틀처럼 떨어지는 루프 라인이 썩 마음에 들었다. 모름지기 차는 뒷모습이 중하다. 교통 체증이 심한 서울이라면 어차피 가장 눈에 띄는 건 앞태가 아니라 뒤태다. 보증기간도 아직 안 끝났는데 행인들의 시선에 맛이 들린 요즘, 눈에 들어오는 차가 하나 더 있다. CLS의 ‘얄상한’ 쿠페형 디자인과는 달리 볼륨감 넘치는 링컨 노틸러스까지 차지하고 싶다. 각진 구석 없이 포동포동한 모습이 귀엽다. 적재 공간에 대한 아쉬움도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노틸러스는 가솔린 SUV다. CLS의 디젤 엔진이 진동을 점점 키울 즈음, 노틸러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제나(퍼스널 트레이너)

재규어 F-타입
‘고장 없는 삶.’ 사악한 연비와 디자인을 감수하며 혼다 CR-V를 구입한 유일한 명목이었다. 작은 가전제품 하나도 수리하려면 적지 않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 덩어리가 큰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다. CR-V는 전 직장에서 ‘촬영차’로 징발당하는 수모를 겪으며 ‘킬로수’를 훌쩍 높였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다만 무미건조한 주행 감각은 도무지 정 붙이기가 어려웠다. 10년 동안 성실하고 착하기만 한 차를 타며 결론 지은 세컨드 카의 조건은 세 가지다. 300마력 이상, 활짝 열리는 지붕, 그리고 기괴한 배기음. 여기에 디자인적 취향까지 첨가하면 재규어 F-타입에 수렴한다. 지금 차를 유지하기도 버겁지만, 마음의 준비는 언제나 되어 있다. 어차피 자동차는 지갑의 두께가 아닌 용기로 사는 거니까. 이재현

기아 레이
카렌스는 비운의 차다. SUV로 발을 돌리는 사람들을 끝내 부여잡지 못한 마지막 세대의 MPV. 오히려 그 점이 좋았다. 잘 알려지지 않은 장점도 많고, 슈퍼카보다 희귀하다. 하지만 내 차엔 합리화할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LPG 엔진이라서 시내에선 주행 거리가 뚝 떨어진다. 반은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 주로 운전하고, 반은 고속 주행을 하는 터라 보완재 역할을 할 차를 생각했다. 평생 함께 하기로 결심한 카렌스의 수명을 연장시키려면 노동력을 분담할 차가 필요하기도 하다.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레이 바이 퓨얼’을 탔을 때 ‘이거다!’ 싶었다. 휘발유와 LPG 겸용이라는 엄청난 장점만으로도 손에 넣을 명분이 충분했다. 다락방에 들어온 듯 안락하고, 차체가 높아 손에 익은 카렌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세환(게임 개발자)

쉐보레 콜로라도
세컨드 카는 따져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존재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활용도가 낮으면 주차장 눈요깃거리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나는 지금 ‘엑센트 디젤 수동변속기’를 타고 있다. 도심에서 1리터에 18킬로미터를 가뿐히 넘는 연비에 운전하는 재미까지 쏠쏠해 7년째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주말마다 캠핑을 다니기 시작하며 아쉬운 점이 생겼다. 짐을 모두 싣고 나면 앞자리밖에 남지 않는다. 지상고가 낮아 비포장 도로만 만나면 ‘벅벅’ 배를 긁기 시작한다. 그러다 얼마 전 쉐보레 콜로라도를 접하고 푹 빠져들었다. 우람한 외모, 듬직한 프레임 보디와 사륜구동 시스템. 게다가 넉넉한 출력의 엔진을 얹고도 연간 자동차세는 3만원이 안 된다. ‘사? 말아?’ 가격표를 보며 하루 종일 고민했다. 이현성(<탑기어 코리아> 기자)

아우디 TT
“몇 년 후를 생각한다면 큰 차를 사야 돼.” 차를 처음 살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지긋지긋한 조언 덕에 집으로 데려온 차는 ‘BMW 3GT’였다. 넓은 뒷좌석 공간과 트렁크의 확장은 충고에 부합했다. 하지만 3년이 흘렀고, 내 뒷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언젠가 쓰겠지’라고 생각한 트렁크는 만기마저 흐릿한 보험 같은 존재가 됐다. 세컨드 카는 보이지도 않는 미래보다 지금의 이기심에 이끌려 고르고 싶다. 빠르지 않아도 좋다. 어차피 혼자 탈 차라면 도어는 2개로 족하다. 단출한 가방은 옆자리에 던져놓으면 끝. 실용성을 배제하면 결국 3GT를 살 때 고민했던 아우디 TT가 다시 등장한다. 이제 남은 건 차를 마련할 자금과 주변의 시선을 뚫고 ‘개구쟁이’ 같은 디자인에 오를 배짱뿐이다. 김성수(플랜트 엔지니어)

BMW M4
가볍고, 잘 돌고, 잘 멈춘다. 외근이 잦은 직업상 ‘고난도 주차 미션’을 자주 해야 하는데, 크기가 작아 과제 수행이 쉽다. 현재 타고 있는 미니 쿠퍼 SD의 장점이다. 하지만 가끔 제네시스 쿠페를 타던 시절 즐겼던 가솔린과 후륜구동의 조합이 그리울 때가 있다. BMW M4라면 ‘젠쿱’의 추억을 대체할 듯하다. 이왕이면 ‘재래식’ 감성이 가미된 수동변속기 모델로. M4는 400마력이 넘는 힘으로 차체 뒷부분을 흔들 수 있고, 금속 마찰음이 나는 배기 사운드는 들어도 들어도 지겹지 않다. 애프터마켓의 튜닝 용품도 다양해 입맛에 착착 붙는 차로 완성해가는 재미도 있다. 희귀한 모델이라 추후 ‘가격 방어’에도 유리하다. 미니로 마음 놓고 달리고, M4로 마음 부여잡고 달릴 때 나의 ‘이중생활’은 완성된다. 안진욱(<모터매거진> 기자)

현대 넥쏘
도로를 한 자리씩 차지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 시선이 걸리면 마음도 덜컥 걸린다. 내연기관이 낡은 것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같은 시대에 ‘부릉’거리는 차(그것도 디젤)를 운전하며 야금야금 매캐한 체취를 흩뿌리고 다녀도 괜찮은 걸까. 현대의 수소 전기차인 넥쏘가 이런 움츠러든 심기를 펴주리라 믿는다. 넥쏘는 지구에 널린 수소를 배터리에 충전한 뒤 산소와 반응시켜 직접 전기를 생산한다. ‘오버래핑에 이은 크로스를 바이시클 킥으로 연결’처럼 뭔가 멋지게 들리는 소리. 수소충전소가 서울에 달랑 3곳밖에 없어 당장 데일리 카로 사용하기 어려운 게 흠이지만 왼팔로 삼기엔 더할 나위 없다. 더구나 넥쏘는 달리면서 초미세먼지를 정화하는 보기 드문 기능을 갖췄다. 내가 싼 똥은 내가 치운다. 김영재(<GQ> 피처 디렉터)

아우디 A7
지금까지 가장 좋았던 앞차는 아우디 A7이었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사람의 눈을 사로잡는 건 한강이 아닌 앞차다. 앞차는 동료이고 무뢰한이고 풍경이고 어쩌면 전부다. 루프로부터 펜더까지 떨어지는 극적인 곡선이 아름다웠다. 이 차에 탄 사람들을 부득이 돈독하게 만들 법한 곡선이었다. 우정의 가치를 아는 차가 A7만은 아니지만, 멋을 과시적인 것으로, 불편을 허세로 보지 않는 디자인으로 이해했고 그래서 더 좋았다. 내 차 A1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세컨드 카를 탈 날의 슬픔이 먼저 떠오른다. 기쁘게 두 번째 차를 타고 있다면 차뿐만 아니라 나도 변했을 것이다. 관찰하고 받아 적고 기억하는, 항상 뒤차에 머무르는 내가 앞차가 돼도 괜찮은 날, A7을 시승하겠다. 정우영(<BUDXBEATS> 디렉터)
- 에디터
- 이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