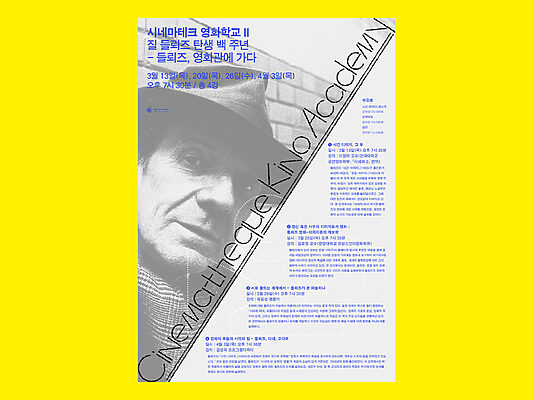어두운 록과 헤비메탈을 동경하는 래퍼들, 그래미를 휩쓴 우울의 아이콘 빌리 아일리시. 왜 음악은 점점 더 짙은 디스토피아를 향해 나아가는가?

<Decade of Decadance 81-91>. 누군가에겐 생소한 단어의 조합이겠지만, 조금 오래 산 음악 팬들에겐 심장을 뛰게 하는 숏 추가 플랫화이트처럼 작용할 이것은 거의 금속 세대의 경구警句 같은 것. 다름 아닌 미국 메탈 밴드 ‘머틀리 크루’의 베스트 모음집 제목, <퇴폐의 데케이드>를 조금 부끄럽지만 한편 꽤 당당히 기억한다. 여러 해 전, 가수 CL을 만났을 때 그가 이따금 유튜브로 이런 글램 메탈 밴드들의 패션을 참고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퇴폐의 시대 이후에 도래한 10년을 이번엔 ‘Decade of Gloom’이라 불러도 될까. 1990년대 말이다. 이름하여 ‘침울의 데케이드’. 어쩌면 올지도 모를 혹성직렬, 휴거, 또는 지구 종말을 향해 가던 시점. 그 당시 빌보드 차트는 미쳐 돌아갔다. 1991년 메탈리카의 ‘Metallica’, 1993년 너바나의 ‘In Utero’, 1994년 판테라의 ‘Far Beyond Driven’. 험악한 음반들이 발매 첫 주에 ‘빌보드 200’ 정상을 찍어버리던 기묘한 시절. ‘Metallica’는 검은 바탕에 똬리 튼 뱀, ‘In Utero’는 오장육부가 뚜렷한 인체해부도, ‘Far Beyond Driven’은 거대한 나사를 이마에 박은 두개골로 표지를 칠갑했다. 섬뜩한 것은 시각 이미지만이 아니었다. 오버드라이브나 디스토션을 건 전기기타 사운드가 육중한 리듬, 암울한 가사 위로 출렁거리는 사운드 역시 깊고 검은 웅덩이 같았다. 도어스가 ‘Strange Days’를 부른 1967년은 약 사반세기 뒤에 세계 곳곳에 실화가 돼 엄습했다. 제각각 극단적인 음악의 형태로. 미국의 습기 많은 북서부 해안에서는 그런지가 피어났다. 일본에서는 가부키와 공포영화를 결합한 비주얼의 그룹 ‘엑스재팬’이 미친 팬덤을 이끌었다. 멀리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는 얼굴에 시체 분장을 한 블랙메탈 그룹과 교회 연쇄 방화가 횡행했다.
1990년대의 추억에 젖어 있다가 문득 요즘 음악계를 ‘매직아이’로 관망해봤다. 멍하니,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러다 보면 문득 내가 미국 뉴욕의 어떤 빌딩 속 7과 1/2층에 들어와 있는 듯하다. 영화 <존 말코비치 되기>에 나오는 사무실 캐비닛 뒤 개구멍을 발견한 사람이 된 기분이 된다는 얘기다. 그 구멍으로 근 30년의 세월을 오갈 수도 있겠다. 말하자면 X세대와 Z세대가 통하는 비밀 통로.
엑스엑스엑스텐터시온(1998~2018)은 그러고 보니 예명부터 어쩐지 의미심장하다. 2018년 6월 19일, 그의 곡 ‘SAD!’는 스포티파이에서 단일 곡 일간 스트리밍 역대 최고 기록(약 1천40만 건)을 갈아 치웠다. 그가 총격을 받아 사망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비극적 최후를 예견이라도 한 듯 시종 음울한 이 곡은 마치 2018년판 ‘Pennyroyal Tea’나 ‘All Apologies’ 같은 것이 돼버렸다. ‘텐터시온’의 앞에 릴 핍(1996~2017)이 있었다. 그는 생전에 커트 코베인(1967~1994)을 동경해 ‘Cobain’이라는 곡까지 발표했다. <뉴욕타임스>는 실제로 그를 “로파이 랩의 커트 코베인”이라 평했다. 1990년대 얼터너티브 록에서 빌려온 듯한 기타 스트로크를 자신의 곡에 즐겨 사용했다. 핍은 약물 과용으로 요절하면서 불행히도 비극의 결말을 따라갔다. 그가 엑스엑스엑스텐터시온과 듀오로 발표한 곡의 제목은 듣기만 해도 아찔한 ‘Falling Down’이다.
사운드클라우드 랩, 로파이 랩, 이모 랩 등으로 혼용돼 불리는 이 ‘요즘 랩’은 2010년대 중반부터 세계의 젊은이들을 무서운 속도로 사로잡았다. 방탄소년단마저 2018년 ‘FAKE LOVE’에 “그런지 록 기타 사운드”를 넣었다. 2020년대 들어 처음 빌보드 싱글 차트를 강타한 신곡이 된, 래퍼 로디 리치의 ‘The Box’ 역시 음울하다. 스포티파이에는 ‘Tear Drop’이라는 공식 플레이리스트도 있다. 이모 랩 장르를 모아놓은 것인데 팔로어 수가 57만 명을 상회한다. ‘Tear Drop’의 첫 곡은 지난 연말에 약물 과용으로 요절한 고 주스 월드(1998~2019)의 곡이다. 1990년대에 펑크 록 밴드 오프스프링, 랜시드의 둥지였던 에피타프 레코드는 요즘 구치하이워터스 Guccihighwaters 같은 이모 랩 아티스트들을 발 빠르게 영입하고 있다.
“요즘 젊은 래퍼들이 우리 블랙메탈 음악가들을 대선배로 대접하는 것을 보면 기특하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2018년 여름,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보컬리스트 갈 Gaahl을 만났다. 그는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블랙메탈 밴드 ‘고르고로스’의 보컬 출신이다. 현재는 화랑을 운영하며 자신의 밴드 ‘갈스 워드 Gaahls Wyrd’를 이끌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노르웨이 서안의 피요르 지대 메탈계를 바이킹처럼 누벼온 그가 요즘 자국 사운드클라우드 래퍼들로부터 ‘레전드’로 추앙받고 있어서 어리둥절하다고 털어놨다. “우리 블랙메탈이 추구한 어두운 이미지와 태도를 특히 그들이 맘에 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장르를 떠나 세계관을 공유하는 음악 선후배로서 서로의 행보를 응원해주는 사이가 됐죠.” 자신의 화랑에 걸린 작품들, 고딕과 고어 사이의 그림들 사이로 그가 어렴풋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찍으신 사진 중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은 장면은 다 지워주세요. 남들 앞에서 웃는 얼굴 보이는 건 딱 싫어하거든요.”
이쯤 되면 X세대와 Z세대의 평행이론은 이론을 넘어선다. 저음으로 튜닝한 전기기타와 드럼이 20여 년의 세월을 건너 808과 트랩 비트로 대체됐을 뿐은 아닐까. 예전 세대의 어두운 록에 대한 요즘 래퍼들의 동경도 계속된다. 릴 우지 버트부터 스카로드 Scarlxrd, 주스 월드까지 다양한 래퍼가 록과 헤비메탈에 대한 존경을 드러낸다. 포스트 말론은 신작에 오지 오스본을 참여시켰고, 고스트맨 Ghostemane은 <지니어스 Genius>인터뷰에 데스메탈 밴드 ‘디어사이드’ 티셔츠를 입고 나왔다. “그 아이는 정말 빨리 병원에 가봐야겠다더라, 이 한 마디로 요약하더군요. 제가 아는 독일 기자가 그를 인터뷰한 뒤에 제게 한 말.” (재즈 가수 A씨)
끝판 왕이 기다렸다. 연초에 그래미어워즈를 통째로 집어삼킨 19세 괴물 싱어송라이터 빌리 아일리시. ‘독일 기자’가 아일리시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Bury a Friend’의 뮤직비디오에 거의 들어 있다. 수많은 좀비가 잠자리에 쳐들어와 자신의 몸을 뜯어먹는 꿈을 반복해서 꾼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아일리시는 공포영화와 자신의 악몽에서 창작의 영감을 자주 받는다고 한다. 무라카미 다카시가 제작에 참여한 ‘You Should See Me in a Crown’의 무시무시한 거미는 빙산의 일각이다. 흥겨운 CM송처럼 회자된 대표곡 ‘Bad Guy’도 가사를 헤집어보면 웃음기가 가신다. 이런 노래들로 아일리시는 그래미에서 ‘올해의 앨범’ ‘올해의 노래’, ‘올해의 레코드’, ‘최우수 신인’을 쓸어간 것이다. 1981년 크리스토퍼 크로스 이후 무려 39년 만에 벌어진 그래미 ‘대강탈’ 사건.
미셸 드 노스트라다무스의 저주 어린 예언을 뚫고 맞이한 밀레니엄. 거기서 얼마 지나지 않은 세기의 전반부에 뜻밖에 맞닥뜨린 ‘제2의 세기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영국의 <BBC>와 <텔레그래프>, 미국의 <바이스>도 ‘다크 팝’, ‘테러 팝’ 같은 용어를 지어내며 ‘팝은 왜 점점 더 우울해지는가’ 같은 분석 기사를 앞 다퉈 내놨다. 어둡고 축축하며 음울한 디스토피아적 분위기의 콘텐츠 시장 장악 사건은, 어쩌면 인스타그램과 틱톡이 대표하는 밝고 반짝이며 예쁘장한 거대 가짜 세상에 대한 반작용인지도 모르겠다. 팍팍한 현실에 대항하는 ‘소확행’과 ‘워라벨’이라는 달의 어두운 뒷면에 도사린 냉소와 공포인지도.
올해 미국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가 <기생충>에 표를 몰아준 것도 이 맥락에서 멀지 않다. 전 세계 크고 작은 도시에 사는 친구들에게서 거의 매일 나쁜 소식이 들려온다. 기분 전환하려 스마트폰을 30분쯤 보고 나면 되레 기분이 나빠진다고,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없다고, 살고 싶은 동네의 사람들이 무섭다고, 젠트리피케이션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라고, 반목과 악플이 소름 끼치게 두렵다고. 웅얼대며 다가오는 좀비 같은 속삭임들이 1990년대의 미래 세계, 2020년의 거리에 횡행한다. 지하철과 버스와 공장과 회사의 소음에 섞여 “우우” 낮은 함성을 질러대며 사람들을 따라다닌다. 거대한 노이즈의 사운드트랙을 오늘도 기꺼이 즐겨 듣는다. 글 / 임희윤(<동아일보> 기자)
- 에디터
- 김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