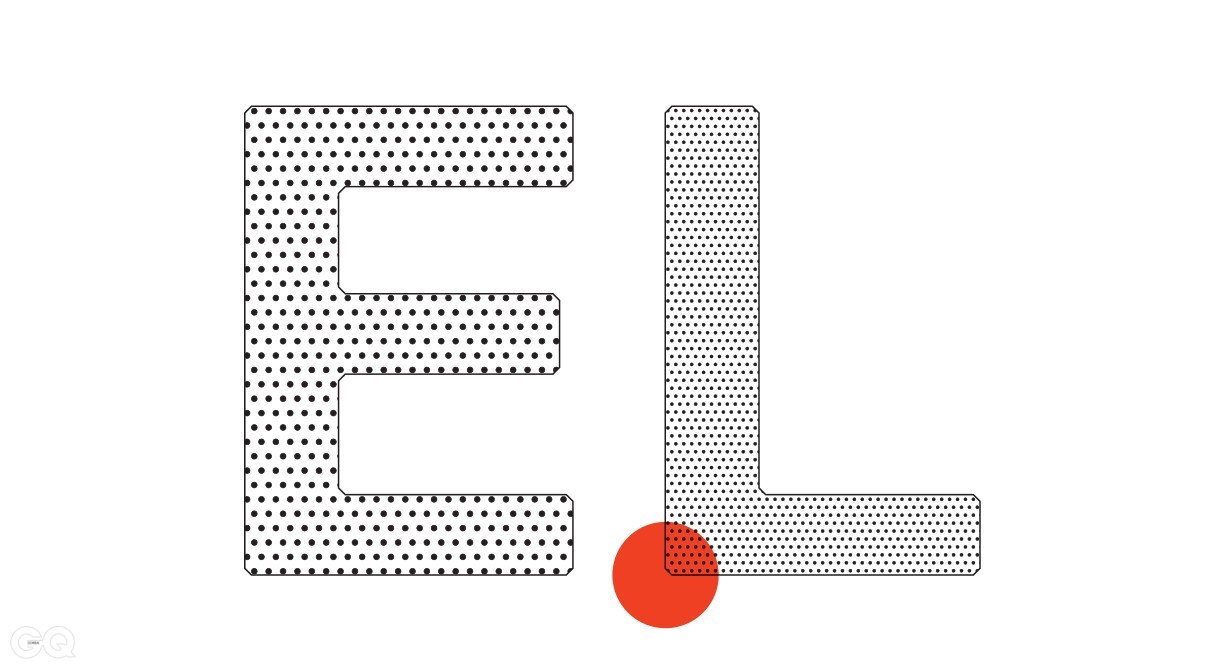영화는 <벤허>보다 오백 배는 감동적이었다. 그 ‘날아라 삼겹살’이 옆에 퍼질러 앉기 전까지는.
영화는 <벤허>보다 오백 배는 감동적이었다. 그 ‘날아라 삼겹살’이 옆에 퍼질러 앉기 전까지는. 스크린 음향이 비닐 봉지 소리와 버석버석, 추르릅 춥춥, 과자 씹는 소리에 ‘발릴’ 때, 그 삼겹살의 목을 조르지 않은 게 지금도 후회된다. 다른 영화는 <애수> 뺨치게 슬펐다. 다른 오겹살이 샤워 크림을 질질 흘리며 뭉개진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는.
누가 무엇을 먹건 나완 무관하다. 누군가 타조알 통조림이나 황소 망막 초무침을 먹고 있다면 인상 깊게 봤겠지만…. 곧,손바닥을 바지에 슥슥 문지른 그자가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 트림 한 방 시원하게 날렸다면 놀라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먹는다. 최면 걸린 듯, 언제 어디서나. 공공장소? 무슨 상관이야? 축산물 등급을 매기듯 도장 꾹 찍힌 손목을 쳐들고 식당으로 직행하는 결혼식장은 말할 것도 없지. 장례식장에서 피자 시켜먹는 날도 곧 오고 말리라. 그런데, 춘궁기와 보릿고개가 지난 게 언젠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먹어야 할 만큼 배를 곯는 걸까? 아니면 단지 구강기 집착?
햇빛 아래 고개를 떨군 (채 졸고 있는) 노숙자나 노인 빼곤, 사색하는 (듯한) 사람은 보려야 볼 수가 없다. 생각 자체가 사회적 금기로 찍혀 추방당했달까. 몇몇이 명상하러 간다지만, 그게 숨쉬기 위해 돈 내는 것과 뭐가 다른가. 다 공짜로 할 수 있는 일인걸. 급기야 사색하는 것 자체가 예술이 되었으나, 그것도 트위터와 가라오케에 자리를 뺏겼다. 누군가의 정치한 고상함이 대중적 상상력을 잠깐 휘어잡을진 몰라도, 유치한 화두로 옥신각신, 히스테리에 빠지는 재미만 못할 것이다.
결국 열광과 고요를 조절해야 하는 클래식 공연장에서 오뉴월 개구리처럼 산발적으로 터지는 기침 소리에 질려버린 뒤, 사람은 조용히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소리를 내는 건 자길 좀 봐달라는 호소라는 걸.
그래도 나는, 일상 중에서 주제와 무관한 소음을 내는 사람에게, 이를테면 공연장에서 기침 한 번에 얼마,라는 식으로 벌금을 물어서, 나처럼 조용하고 품위 있는 사람에게… 부쳐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질투할 때
각 세대의 특성에 대한 인구학자들의 숙고는 면밀한 만큼 피상적이다. 게다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만큼, 다른 세대가 서로를 모호하게 대하는 예도 없다.
혼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다들 얼추 안다. 부모가 무등 한 번 태워준 적 없는 아버지는, 근면하기만 했지 아들을 기르는 데 뭘 해야 할지 거의 백치였다. 아버지를 롤 모델 삼지 못한 채 짜증을 다스리는 법을 모르는 아들은, 평범무쌍한 집안이면서 영웅을 고대하고, 쥐뿔 없으면서 부자를 지지하는 아버지를 탓하고 그의 망할 직업을 탓한다. 늙은 주제에 사라진 권위에 매달리는 아버지의 허세는 더 봐줄 수도 없다.
아버지는 가난하고 어리석어서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었다. 40대에 이미 늙어버린 아버지는 자기도 ‘어린이’인 채 다른 어린이를 세상에 데려오면 안 되는 이유를 그제야 인정한다. 아들을 최고 학교에 진학시키고, 철마다 한정판 운동화를 사준다 해도 곧, 더는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아닌 때가 찾아온다. 함께 쇼핑할 때, 바지 밑단을 줄일 필요 없는 아들의 긴 다리와, 차 뒷좌석에서 여자애 세 명에게 동시에 문자를 보내는 아들을 부러워하는 순간, 붕괴는 시작된다. 아버지는 자기가 자란 옛날과 비교해서, 아니 이제까지 겨우 획득한 것조차 게임이 안 되는 사회 환경, 예술과 학습이 가득한 일상, 유희와 유흥의 엄청난 선택권을 가진 아들을 질투한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부모는 장난감이 왜 쓸데없는지를 그에게 설득했다. 지금 아들은 멀티플레이 게임기도 있고, 그걸로 놀 시간도 있다. 중학교 때 기억이라곤 톱밥 난로 하나로 버티던 겨울밖에 없는데, 아들은 더워서 쪄 죽을 것 같은 학교에 다니다니.
아버지는 자기가 가져본 적 없는 것을 아들에게 준 뒤, 그것에 고마워하지 않으면 화를 낸다. 하지만, 아들이 아는 거라곤 부유함과 풍족함뿐인데, 어떻게 그 당연한 것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치사한 맘을 누른 채 이해하려고 분투할수록 아들은 아버지가 세속적이라는 사실만 일깨울 뿐이다.
가장 외로운 사실은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재능 있고 멋지다는 것이다! 아들은 스시와 회의 차이도 알며, 디지털을 껌처럼 다루고, 생활 영어쯤 콧구멍으로 구사한다. 늙을 기미조차 안 보인다. 새엄마가 아들만 사랑하는 게 싫어서 그애를 사막에 내다 버리는 그림 동화까지는 아니어도, 아버지의 질투는 가끔 격렬하게 터지다가 소년 강화 콤플렉스로 발화하기도 한다. 마침내 공허에 압도된 아버지는, 다시는 일곱 살 인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
아들이 학교에서 겪는 경험이 사실 물질적 환경과 별 상관없다는 걸 이해했을 때, 아버지는 아들 주위를 맴돈다. 질투 때문이 아니라, 아들 나이에 누리지 못했던 것에 여전히 분노하는 자신이 미워서, 아직도 그걸 못 버리는 마음이 슬퍼서.
- 에디터
- 이충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