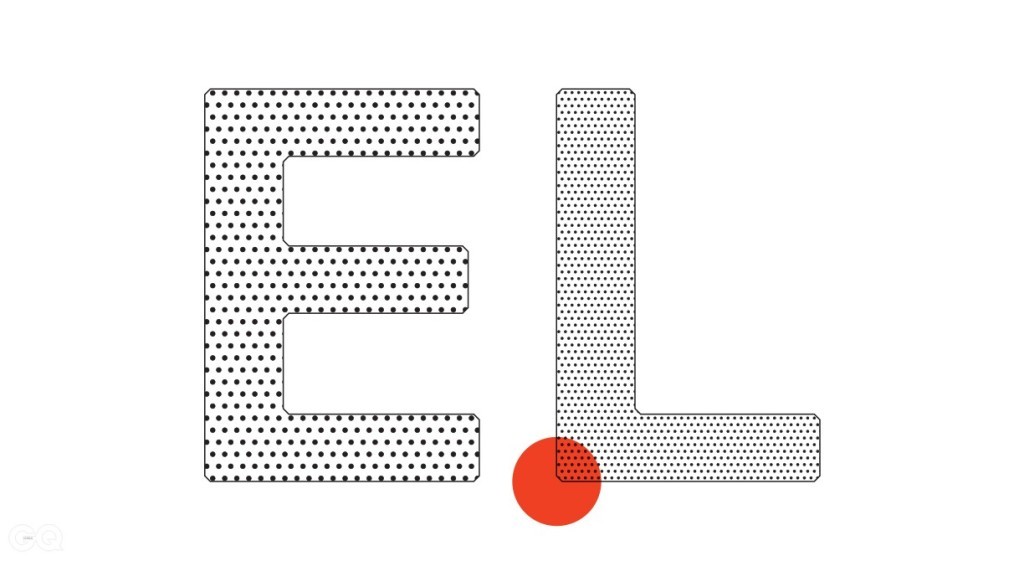아침에, TV를 약하게 틀어놓은 채 다리를 꼬고 T.S. 엘리엇의 시를 읽다가, 밤 11시쯤 기진맥진해선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누웠어. 적당히 낡은 잠옷을 입고, 다른 노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면서. 마침 뉴스에선 핵이 초래할 대학살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군. 믿을 수 없어. 이 모든 상황이 엄청난 해일 같던 21세기 초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잖아. 정말이지 인생은 순환되는 필름 같아.
오늘 나는 일흔이 되었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노인으로 표명된 시민이 된 거지. 일어났어야 했고, 결국 일어난 거야…. 늦은 나이도 아니건만 아득히 먼 데서 오는 잔혹한 안개처럼 숨이 차가워지는군. 뭔가 임박한 어두운 느낌은 웃기면서도 공평하기도 해. 매년 다들 1년씩 나이 먹잖아.
누구나 황금빛 청춘을 동경하고 이십대를 떠올리지만 그건 팽팽한 몸에 대한 회한 아닌가. 젊은 친구들을 볼 때 나도 가끔 생각해. 나의 연륜과 유리 한 장처럼 매끄러운 저 피부를 바꾸면 어떨까. 그런데 난 삶에 주의하는 법, 듣는 법을 배웠지. 그걸 스스로 터득했다는 게 참 기뻐. 그건 내 것, 나 스스로 만든 거니까. 그러다가 (불만과 불쾌를 못 숨기는) 청년들에게 말해. 요즘의 젊음은 지루해. 나 때처럼은 못 하더라고. 난 끝내주게 미쳤었지. 늙어 본 적이 없는 네가 뭘 알겠어?
난 ‘새롭게’ 늙어가고 있어. 70이 된 최상위 적격자지. 그런데 일흔 살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작자가 있어? 사실 단어를 지배하는 건 나지, 단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 내 나이가 갖는 분수 따윈 알고 싶지 않아. 누가 나에게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종용할 순 없어. 나는 규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아. 왜냐하면 따를 누군가가 없으니까.
그러고 보면 70의 의미는 사회에서 해방된 어떤 파시즘이기도 해. 다리에 발진이 있건, 팔다리가 가늘건, 수영장에 얼마나 사람이 많건, 나도 헤엄칠 권리가 있어. 옛날엔 꿈도 못 꾸었던 방식으로 옷을 입을 자신도 있어. 뭐, 일흔쯤 되면 파텍 필립 정도는 가질 만하지 않아? 그러나 저 밖 어디서도 노인들을 고려하지 않지. H&M도 에르메스도 마찬가지야.
멋진 노인들이 다 세상을 떠나서일까. 다들 노인을 볼 땐 그 안의 사람은 못 보는 것 같아. 사람들은 요즘 노인이 더 늘었다는 걸 인식하지도 못하지만, 노인인구 증가율은 신생아 출생률보다 훨씬 높아. 인구통계학은, 대한민국이 조만간 멸종해버릴 거라고 경고할지 몰라. 그런데도, 늦은 삶의 속도인 채로도 노인들은 여전히 공동체의 일원이란 걸 도외시하다니. 그러니까, 그저 집에 눌러앉아 종일 TV나 보라고? 나라 돈이나 축내는 존재니까? 어떻게 70에 최고조를 달리는 사람들이 법관과 정치인밖에 없을 수 있어?
한 친구는 그랬어. “일흔이 넘으면 보름마다 머리를 손질하고, 구두는 매일 닦고, 옷도 이틀 연속 같은 걸 안 입고, 밖에 나가선 시간마다 넥타이가 똑바른지 확인해야 돼.” 하지만,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잊어. 나이 들면서 깨달은 것들을 차라리 몰랐음 좋겠다 싶을 때도 있어. 신병의 전자시계를 이해하려고 고군분투하는 늙은 대령이 된 기분이랄까. 프로야구에 환호하기엔 너무 늙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스포츠 때문에 졸지에 기저귀를 찬 형상이 된 거지. 게다가 내 안에 숨은 완고한 투덜이는 새로운 음악은 듣고 싶어하지도 않아. CD 비닐조차 뜯기 싫은 회색 물소….
난 여든 살이 돼도 운동 더 열심히 하고 집도 더 깨끗하게 하고, 그럴 것 같진 않아. 실수를 더 하면 더 했지. 난 무섭게 구는 대신 고상하게 늙을 거야. 혹은 거칠게도 늙고 싶어. 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음 좋겠어. 지금은 그냥, 죽는 날 먹는 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줄 것 같아서, 그때 어떤 디저트를 먹을지 고민하는 중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나이야. 남은 총알이 없어 항복할지 모르지만, 그 질문을 안고 평생을 보내야 돼. 결국 내가 발견한 건 나의 재발견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이라고 해도. 이 나이에 의대를 지망할 순 없지. 어떤 여행자도 다다를 수 없는 한계를 향해 항해할뿐이야. 이 없이, 눈 없이, 맛 없이,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하지만 지금 약한 노인의 한때를 보내는 중이긴 해도,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춤을 배울 수는 있어. 난 아직 소리 지를 힘이 남아 있고, 여전히 자라거든. 날 이끄는 건 몸이 아니라 심장이니까.
나이 갖고 우는 소리를 내는 건 최대의 적이야. 그게 핸디캡인지, 아님 더 멋진 건지, 지금은 몰라. 이게 최종 리허설은 아니야. 신과 나의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낭만을 갈구하는 노년의 회상록이 시작되는 거지. 이런 페이지는 잘라서 보관해야 하리라….
아침에 읽은 시는 ‘ J. 알프레드 프루프록의 연가’였어. “나는 늙어가…. 나는 늙어가…. 나는 바지 끝단을 접어서 입을 거야. 흰 플라넬 바지를 입고 해변을 걸을 거야….”
- 에디터
- 이충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