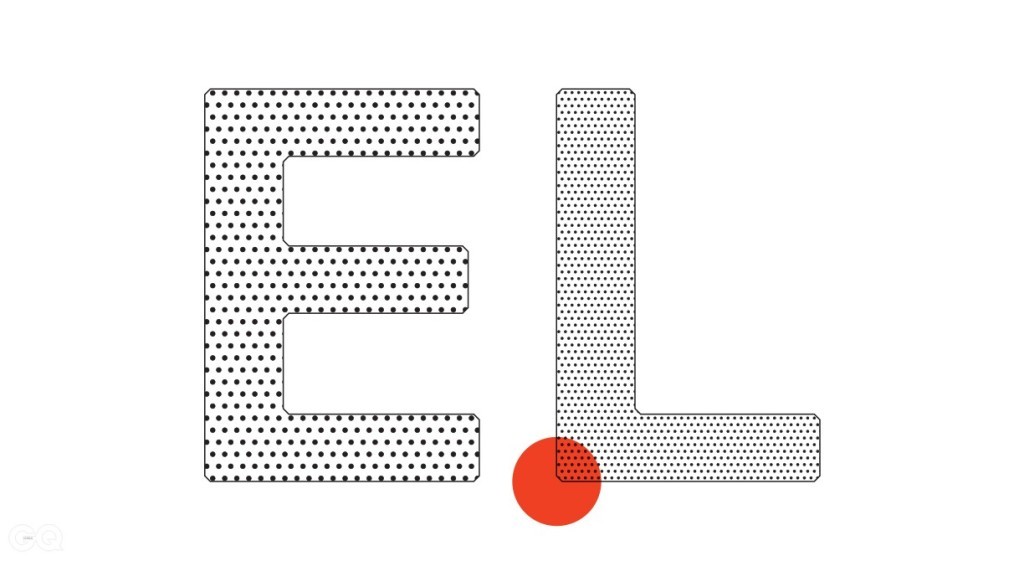SEPTEMBER SONG
“난 시 없이 일주일은 살 수 있지만 재즈 없이는 단 하루도 못살겠어”라고 필립 라킨이 그랬다. 이 복고주의적 영국 시인은 분명 이른 저녁의 진토닉, 레코드 플레이어에서 흐르는 트럼펫 소리를 좋아했을 거라고 상상해 봐도, 행복한 당김 음들이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경지까진 모르겠다. 나에게 재즈는 카테고리화된 음악이니까. 줄무늬 조끼를 입은 남자들의 앙상블, 찰스턴 춤을 추는 신여성, 포마드로 넘긴 머리, 프랑스 담배, 세계 이차대전보다 먼 세계, 도시의 반짝거림과 소음, 퀴퀴한 옛날에 섞인 신세계 사운드, 녹아버린 기쁨, 이상한 무책임…. 하지만 9월이 오면 언제나 그 노래를 들었다. 엘라 피츠제럴드의 ‘셉템버 송.’
그 겨울, 광흥창의 한 분식집 앞에서 택시를 기다릴 때 명료하면서도 몽롱한 그 노래가 들렸다. 거부할 수 없는 남자에게 애원하는 수줍은 단가…. ‘셉템버 송’에는 그 나이의 내가 원하는 특별히 은밀한 흥분이 있었다. 나는 거의 기술적으로 방어자세를 풀었다. “가을 날씨는 나뭇잎을 불꽃으로 바꾸었어”라는 가사가 들리자 아픈 듯한 겨울바람 속에서 아예 신성한 상태로 돌입했다.
엘라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수’가 부른다는 걸 잊었다. 그녀는 노래를 노래 자체로만 불렀다. 그녀가 부르는 것을 듣기 전까진 ‘엔젤 아이스’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하지만 이상하게 엘라의 노래엔 성이 배제된 듯했다. 그녀가 부른 콜 포터의 ‘레츠 두 잇’은 생물시간에 실험 결과를 열람하는 듯 느껴졌다. 그녀가 “당신, 밖은 추워”라고 노래하면 꼭 중앙 난방 때문에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의미로 들렸다.(반대로 레이 찰스와 베티 카터는 그런 가사의 의미를 아주 잘 알고 불렀다.) 불세출의 여가수들은 그렇게 다 달랐다. 빌리 홀리데이의 노래는 상처받은 여자의 환부 같았다. 단순히 가슴 아픈 사랑이 아닌 끝없이 계속되는 신음…. 디나 워싱턴의 노래는 꽉 쥔 주먹 같았다. 누가 아프게 한다면 당장 되받아칠 듯이. 엘라는 현명하고 충직한 사랑을 노래하는 듯했다. 그 사람과 지금 함께 있는 것처럼. 뜨거움과 배타성이 동일하게 느껴지는 목소리는 단순한 가사와 느끼한 어절조차 연인끼리의 사적인 대화로 어떻게든 바꾸었다. 다정함과 애정, 유머로 채워진 엘라의 목소리가 “사랑은 지브롤터 암벽만큼 단단하다”고 노래하면 정말 그런 것 같았다. 그때만큼은 사랑이 옳은 것 같았다.
‘셉템버 송’을 들으면 옛날의 시가 내포한 감정이 어떤 건지 느낄 수 있다. 9월이 오면 그 노래의 권고에 마음을 맡긴다. 셉템버. 노벰버. 많은 날들은 얼마 되지 않는 소중한 날들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맛있는 연구
나는 요리의 유행을 구분하고 따르는 것엔 큰 관심이 없다. 만능 조리기구로 만든 페스토가 막사발에 담은 할머니의 양념간장만큼 맛있지 않다는 건 안다. 아무튼 국자부터 무채 칼까지, 가마솥부터 냉장고까지 요리와 관련된 도구를 볼 때마다 이런 걸 발명한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진짜 변화시켰단 생각이 든다. 어쩜 직접적으로 역사의 방향을 바꾼 건 종교가 아니가 요리 방식이 아니었을까? 전자레인지 같은 도구는 자신을 위하기에는 음식을 너무 쉽게 만들어버렸지만, 병따개나 마늘 분쇄기는 암만 해도 혁신이며 축복 같다. 그것들의 독창성이 아니라면 엄마를 비롯한 우주 최고 셰프들이 만든 어떤 요리도 맛볼 수 없었을 테니까.
요리의 발명에 관한 역사는 뒤적거릴수록 재미있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은 최초의 현대 냉장고 중 하나를 발명했다. 17세기까지 저택의 요리사는 늘 남자였는데, 여자들의 커다란 스커트가 불 주변을 돌아다니기엔 너무 위험해서였다. 그런데 인간이 중세를 넘도록 살아남게 만들고, 생활방식을 수렵에서 농경사회로 변화시킨 게 점토로 빚은 냄비였다니!
육회를 먹을 땐 그런 생각이 안 들지만, 불을 피우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인간은 뭐가 됐든 아주 다른 생명체가 되지 않았을까? 인간 조상의 유골은, 대략 1만년 전까지 치아를 잃은 어린 아이가 성인으로 살아남을 순 없었다고 증언한다. 씹을 수 없었다면 굶주렸을 것이다. 그런데 현대 치의학은 양철 도시락 뚜껑처럼 윗니가 아랫니를 덮도록 교정한다. 발달된 아랫턱은 큰 죄. 이런 게 턱의 정상적 형태가 된 건 나이프와 포크를 쓴 결과일까. 인간 조상은 음식을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 윗니 아랫니를 부딪쳐 모서리부터 씹었다. 구운 살덩어리를 한 손에 쥐고 한쪽 끝은 이로 고정해 당기는 식이었다. (침팬지와 다를 게 없군.) 그 사이, 이빨 대신 포크로 뭔가를 꼼짝 못하게 잡은 뒤 작은 조각으로 잘라 입 속에 집어넣는 동안 나이프는 엄지손가락처럼 뭉툭해졌다. 씹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부드러운 밀도로 요리하는 건 현재 우리가 음식을 먹는 방법 아닌가. 결과적으로 치아가 입안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한 건 도구 변화에 따른 애달픈 신체 반응이었을 것이다.
조리도구가 소수에게만 어울리는 주제일 리 없다. 설사 그렇다 해도 요리 자체는 모두의 주제다. 이달, GQ TABLE에 실린 ‘부엌의 친구들’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조리도구는 맛있게 만든 탐구와 같고, 부엌은 온통 영혼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꼭, 신부학교에 다니는 과년한 처녀들이 펼친 소책자에 실린 말 같지만….)
- 에디터
- 이충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