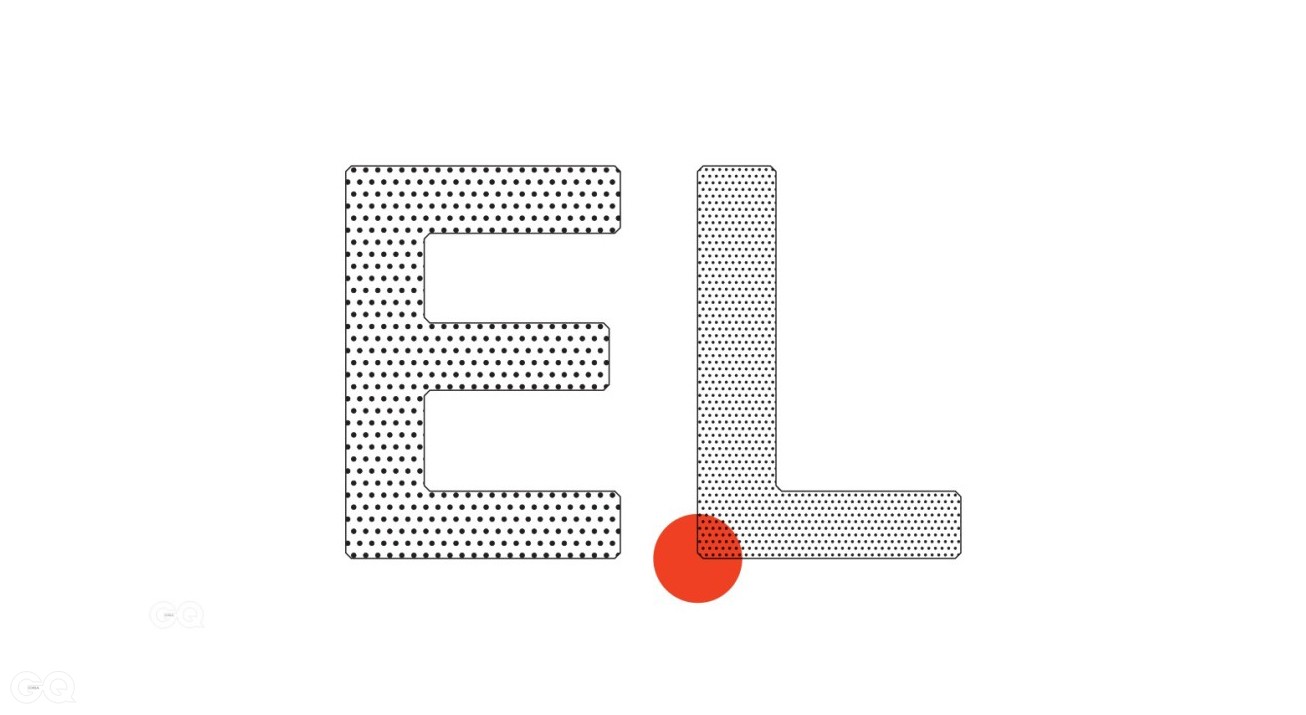흑백 에디션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만들고 싶은 책을 만들었다는 내 감정을 채웠다. 자유로운 편집과 소비되어야 하는 욕망이라는, 잡지의 속성에 밝은 독자의 감정도 채웠다.
개인적 낙담을 포함해 뭔가 실패한 기분에는 아주 익숙하다. 관조적인 척 말하자면, 어쩌면 나를 슬프게 만드는 건 뭔가 해낸 상태다. 실패는 쉽다. 매일 하니까. 그동안 쭉 그랬다. 매번 맘에 덜 차는 잡지를 만들면서 한 달을 소모했다. 기발한 기획과 민첩한 진행으로 책을 만들었을 때조차 만족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하고 싶은 것보다 열 배나 많은 아이템을 버렸는데도 끝내주거나 바보 같은 아이디어는 여전히 날뛰었다. 내 자신, 반짝임이 멎었을 때조차 깜빡거리는 전구 같아서 매달 괜히 슬펐다.
2년 전, 큰 숨을 쉬고 모든 비주얼을 흑백으로만 채운 ‘블랙 에디션’을 냈다. 패션지의 표준으로라면, 좋게 보면 대담한 시도, 사실 그대로 보면 무모한 짓거리였다. 알록달록한 시대정신에도 반反했다. 하지만 늘 궁금했다. 모두에게 용인된 잡지의 꼴에 대해서가 아니라, 통념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파격과 허용 범위가.
독자가 원하(리라고 믿)는 것을 도외시할 순 없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하지 않은 것을 더 좋아한다. 진짜는 일반적인 무엇이 아닌 어딘가 갸웃거려지는 것에 의해 만들어지니까. 모두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더 빼앗길 언어도 없을 것이다.
나는 영향력 있는 잡지라는 안전함으로부터 ‘견해’라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식된 철로를 달리는 종이 미디어, 웹만 사용되는 불안한 미래, 인터넷으로 옮겨간 저널리즘 속에서도 매체는 존재감을 계속 드러내야 한다고 믿었다. 잡지는 대중이 아니라 독자 한 사람을 위한 것.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
흑백 에디션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만들고 싶은 책을 만들었다는 내 감정을 채웠다. 자유로운 편집과 소비되어야 하는 욕망이라는, 잡지의 속성에 밝은 독자의 감정도 채웠다. 늘 같은 화법으로 만든다면 숙제 같은 수준의 잡지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형상에 새 거죽을 입히지 않는다면, 구속을 벗어나 표현하지 않는다면, 진실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고 낮의 햇살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안일한 편집은 무뚝뚝함. 바보처럼 점멸하는 신호등. 목적 없는 흐름. 셀 수도 없는 멈춤.
이제 두 번째 블랙 에디션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연이어 금기를 공개적으로 해체시킨 셈인가…. 어쨌든 어떤 성취감의 범주, 삶의 다양성은 이런 자유 안에서 융합된다고 아주 오래 우기고 싶다.
책에서 찾는 묵상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다는 게 나만의 주장은 아닐 것이다. 나는 블랙 에디션을 통해 고루한 미디어 세상 속에서 작은 공간을 찾았다. 그리고 흑과 백 사이에 천만 개의 빛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배웠다.
- 에디터
- 이충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