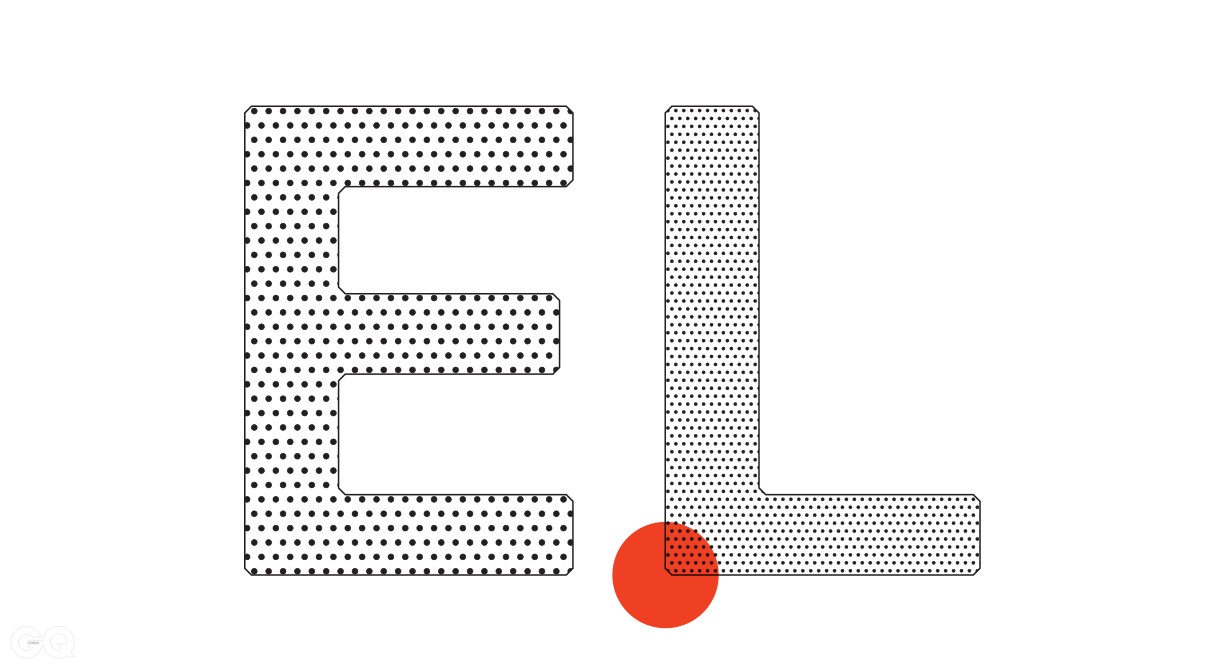 사람들은 비행기 여행이 얼마나고단한지 경쟁적으로 떠든다. 아침 10시에 파리에 왔는데 뉴욕 시간으론 한참자고있을 새벽 4시라느니, 비행기에서 한숨도 못 잤다느니. 하지만 멜라토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 따위. 옷 챙기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 가벼운 옷도 막상 현지에 가보면 무겁기만 하고, 날씨는 항상 생각보다 덥다. 그렇다고 빈 가방을 들고 가 모든 걸 현지 조달할 순 없는 노릇이지. 하지만 추락한 저먼윙스 A320은 전혀 다른 얘기. 고속 깡통을타고 하늘을 나는 게 뭔지 인간적으로 골몰하게 되었다. 사실, 공짜 와인만 빼면 비행기는 날개 달린 지옥 아닌가. 그 섬에 노 저어 갈 생각도 못하고 비행기밖에 모르는 절망적인 승객, 어쩌다 유가가 떨어져도 반영되지 않는 비행기 삯, 내가 제값을 주고 티켓을 사는 아둔한 2퍼센트에 속할 것 같은 불안, 점 찍었으나 방심한 5분 사이에 두 배로 오른 항공편, 죽음의 무기로 변한 언더 와이어 브라, 온몸을 뒤지는 검색대 직원의 자비 없는 손길, 죽음의 기내식, 혈류 장애, 백혈병을 일으킬지도 모를 광선 폭격, 지퍼락에 숨겨둔 콘돔이 검색대에서 까발려질 때의 지성 모독 혹은 도덕 모욕, 옆자리 아저씨의 위태로운 양말 냄새와 발톱 무좀, 자기 머리 위의 에어컨 바람통을 내 쪽으로 돌려놓은 독한 처녀, 남편하고 앉게 자리 바꿔달라는 이기심 퉁퉁한 여자(나더러 액취 쩌는 저 서양 뚱땡이 옆에 앉으라고? 공중에서조차 떨어져선 못 살 만큼 사랑 한다 그거야? 지가 누군가와 한 이불 덮고 잔단 이유만으로 내가 그 수고를 해야 하나?), “손님! 블라인드 올려주세요!”라던 명령조의 스튜어디스, “니가 올려!” 으르렁거리던 나, 비행기와 공항 청사를 연결하는 튜브 통로가 없어 얼굴 다 태우던 타르 같은 햇볕, 탁류처럼 밀려가는 공항 버스, 선블록 제품 알레르기…. 말은 안 해도 어벤저스나 라라 크로프트도 아이, 첨부터 버스 탈걸, 속으론 후회했을 거다. 적어도 산소 마스크를 쓸 일은 없으니까. 하긴 어벤저스는 어차피 이코노미 석엔 안 탔겠지. 왜냐하면 이코노미 석에 앉을 때마다 내가 소보다 못하단 생각이 드니까. 그게 당연한 건지 헷갈리지만 이코노미 석 승객 한 사람에게 주어진 공간은 소보다 훨씬 작다. 이코노미 석 국제 비행에 관한 법은 안전에 치우쳐 승객의 편안함을 고려하는 법이 없으니, 8백 석이 넘는 항공기도 있었다. 뭐, 비상구 좌석이야 얼씨구나 싶어도 승무원과 마주 앉아 있을 땐 좀 뻘쭘하긴 했어. 앞좌석이 없고 벽이 눈앞에 있는 벌크헤드 좌석은 또 다리를 어째야 좋을지 모르겠더라. 난 비행기든 극장이든 무릎을 앞좌석 등받이에 기대는 게 좋은데, 화장실 가는 사람들이 자꾸 좌석 앞으로 지나갈 때면 차라리 바퀴에 매달려 가는 게 낫지 싶었지. 좌석 따라 계급이 나뉜 일등석도 뭐, 그닥…. 승무원이 다정하게 은 쟁반을 들이밀면 이게 상류사회인가 싶지만, 난 그냥 다리를 조금 더 뻗을 공간, 약간 더 젖히는 의자면 충분한 걸. 좌석이 태평양처럼 넓고 팔걸이가 평양처럼 큰들 나는 뚱보가 아니다. 미슐랭 셰프가 도자기 세트와 4백 번 꿰맨 이집트 면 냅킨에 내놓는 기내식이 이벤트처럼 화려해도 뭐가 됐든 한 끼에 스시 먹으면 짬뽕은 더 못 먹는다. 깃털 담요와 풀 먹인 흰 베개가 아무리 포근해도 잠 못 들긴 마찬가지. 기내식이 아예 없거나, 터미널 라운지도 이용 못하는 일등석 티켓도 보았다. 비행기 입구와 가깝고 남보다 먼저 내린들 그래서 뭐? 돈 좀 더 주고 업그레이드해봤자 33,000피트 상공의 경치는 일반석과 다를 바 없고, 이착륙 땐 똑같이 위험하다. A380을 처음 봤을 땐 중고 자동차가 애스턴 마틴 뱅키쉬로 확 바뀐 것 같았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었어.
사람들은 비행기 여행이 얼마나고단한지 경쟁적으로 떠든다. 아침 10시에 파리에 왔는데 뉴욕 시간으론 한참자고있을 새벽 4시라느니, 비행기에서 한숨도 못 잤다느니. 하지만 멜라토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 따위. 옷 챙기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 가벼운 옷도 막상 현지에 가보면 무겁기만 하고, 날씨는 항상 생각보다 덥다. 그렇다고 빈 가방을 들고 가 모든 걸 현지 조달할 순 없는 노릇이지. 하지만 추락한 저먼윙스 A320은 전혀 다른 얘기. 고속 깡통을타고 하늘을 나는 게 뭔지 인간적으로 골몰하게 되었다. 사실, 공짜 와인만 빼면 비행기는 날개 달린 지옥 아닌가. 그 섬에 노 저어 갈 생각도 못하고 비행기밖에 모르는 절망적인 승객, 어쩌다 유가가 떨어져도 반영되지 않는 비행기 삯, 내가 제값을 주고 티켓을 사는 아둔한 2퍼센트에 속할 것 같은 불안, 점 찍었으나 방심한 5분 사이에 두 배로 오른 항공편, 죽음의 무기로 변한 언더 와이어 브라, 온몸을 뒤지는 검색대 직원의 자비 없는 손길, 죽음의 기내식, 혈류 장애, 백혈병을 일으킬지도 모를 광선 폭격, 지퍼락에 숨겨둔 콘돔이 검색대에서 까발려질 때의 지성 모독 혹은 도덕 모욕, 옆자리 아저씨의 위태로운 양말 냄새와 발톱 무좀, 자기 머리 위의 에어컨 바람통을 내 쪽으로 돌려놓은 독한 처녀, 남편하고 앉게 자리 바꿔달라는 이기심 퉁퉁한 여자(나더러 액취 쩌는 저 서양 뚱땡이 옆에 앉으라고? 공중에서조차 떨어져선 못 살 만큼 사랑 한다 그거야? 지가 누군가와 한 이불 덮고 잔단 이유만으로 내가 그 수고를 해야 하나?), “손님! 블라인드 올려주세요!”라던 명령조의 스튜어디스, “니가 올려!” 으르렁거리던 나, 비행기와 공항 청사를 연결하는 튜브 통로가 없어 얼굴 다 태우던 타르 같은 햇볕, 탁류처럼 밀려가는 공항 버스, 선블록 제품 알레르기…. 말은 안 해도 어벤저스나 라라 크로프트도 아이, 첨부터 버스 탈걸, 속으론 후회했을 거다. 적어도 산소 마스크를 쓸 일은 없으니까. 하긴 어벤저스는 어차피 이코노미 석엔 안 탔겠지. 왜냐하면 이코노미 석에 앉을 때마다 내가 소보다 못하단 생각이 드니까. 그게 당연한 건지 헷갈리지만 이코노미 석 승객 한 사람에게 주어진 공간은 소보다 훨씬 작다. 이코노미 석 국제 비행에 관한 법은 안전에 치우쳐 승객의 편안함을 고려하는 법이 없으니, 8백 석이 넘는 항공기도 있었다. 뭐, 비상구 좌석이야 얼씨구나 싶어도 승무원과 마주 앉아 있을 땐 좀 뻘쭘하긴 했어. 앞좌석이 없고 벽이 눈앞에 있는 벌크헤드 좌석은 또 다리를 어째야 좋을지 모르겠더라. 난 비행기든 극장이든 무릎을 앞좌석 등받이에 기대는 게 좋은데, 화장실 가는 사람들이 자꾸 좌석 앞으로 지나갈 때면 차라리 바퀴에 매달려 가는 게 낫지 싶었지. 좌석 따라 계급이 나뉜 일등석도 뭐, 그닥…. 승무원이 다정하게 은 쟁반을 들이밀면 이게 상류사회인가 싶지만, 난 그냥 다리를 조금 더 뻗을 공간, 약간 더 젖히는 의자면 충분한 걸. 좌석이 태평양처럼 넓고 팔걸이가 평양처럼 큰들 나는 뚱보가 아니다. 미슐랭 셰프가 도자기 세트와 4백 번 꿰맨 이집트 면 냅킨에 내놓는 기내식이 이벤트처럼 화려해도 뭐가 됐든 한 끼에 스시 먹으면 짬뽕은 더 못 먹는다. 깃털 담요와 풀 먹인 흰 베개가 아무리 포근해도 잠 못 들긴 마찬가지. 기내식이 아예 없거나, 터미널 라운지도 이용 못하는 일등석 티켓도 보았다. 비행기 입구와 가깝고 남보다 먼저 내린들 그래서 뭐? 돈 좀 더 주고 업그레이드해봤자 33,000피트 상공의 경치는 일반석과 다를 바 없고, 이착륙 땐 똑같이 위험하다. A380을 처음 봤을 땐 중고 자동차가 애스턴 마틴 뱅키쉬로 확 바뀐 것 같았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었어.
그러나 어떤 괴로움도 기다림과 비견할 수 없다. 평생 오지 않는 뭔가를 기다렸는데, 그래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검색대에서, 게이트에서, 탔는데도 뜨지 않는 비행기 안에서, 경유 공항에서, 수화물 찾는 곳에서, 세관의 긴 줄에서, 입국심사대에서. 각 부족은 허락된 행동에 관한 그들만의 규칙을 따르지만, 규칙은 날마다 시간마다 바뀐다. 천둥 번개나 비행기 결함으로 취소되는 건 일상. 두 시간 연착된다고 해서 기껏 샌드위치를 사왔는데 한 시간 더 기다리는 건 생활. 발권 카운터로 밀려가는 내 앞의 가족은 아기까지 일곱 명이었다. 얼마나 오래 걸릴까? 어딜 그렇게들 가는 걸까? 걸어갈 순 없었나? 항공사는 늘 비행기가 텅텅 빈다고 하소연하지만 순 거짓말이잖아? “좀 서둘러라, 이 연놈들아!” 큰 소리 안 치고 꾹 참아봐도 내면의 속삭임은 들리지 않고, 성자 비슷해 뵈지도 않는다. 애초에 자기도취조절 장애도 없는 걸. 느려 터진 공항 직원의 머리를 통째 구워버리는 상상을 할 때, 딴 사람들은 세상 모든 시간을 다 가진 듯 띄엄 띄엄 움직인다. 음식점이든 어디서든 줄 서는 걸 죽도록 싫어하는 이런 게 긴박증인지, 재촉병인지, 성격의 특성인지, 단순한 행동인지, 혼란스러운 세상의 부산물인지, 성공의 표식인지, 비만한 고혈압 환자의 특징인지…. 기다리는 게 힘들 땐 크렌베리 주스를 마시라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다면야. 성급한 사람은 인생에 불편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믿고, 나르시시스트는 오로지 자기 시간만 중요하겠지만, 난 둘 다 아니야. 게다가 스스로를 굉장하게 생각한다는 게 굉장한 사람이라는 증거일 리 없잖아.
기다린다는 건 자기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환상을 접는다는 뜻. 평화 속에서건 막히는 길 한가운데서건 완전히 현재에 사는 것. 하지만 기대를 조절하고 고요히 명상함으로써 상황을 활발히 받아들이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겐 모르겠지만 이 편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늘 그랬지만 나에겐 비웃을거리를 찾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서. 하지만 번번이 과녁을 찾지 못한 나는 행락철마다 콘크리트 가드레일들로 흩뿌려진 계시 이후의 황무지, 활주로만 외롭게 바라볼 뿐이다.

- 에디터
- 이충걸(GQ KOREA 편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