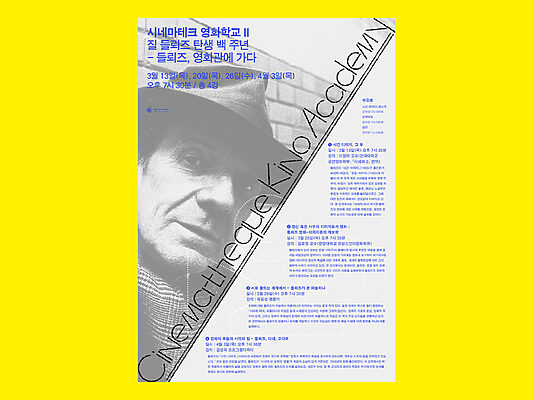여섯 명의 번역가가 고르고 여섯 명의 디자이너가 그렸다. 번역할 수 없는 예쁜 우리 말.

박정훈 ― 영한 번역가. 레너드 코렌의 <와비사비-그저 여기에>, <이것은 선이 아니다-자갈과 모래의 정원>, <예술가란 무엇인가>를 번역했다.
유월과 시월
유월은 부드러운 달이다. 유월을 ‘柔月’이라 하면 초여름 바람이 더 순순해진다. 유월은 흐르는 달이다. 유월을 ‘流月’이라 하면 큰물 들기 전 계곡을 유유히 내려가는 엷은 물소리가 들려온다. 반대의 의미도 있다. 머무를 유를 쓰는 ‘留月’은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달이다. 한 해의 절반에 도달했으니 매무새도 호흡도 가다듬어 남은 절반을 향해 갈 수 있는 쉼을 주는 때이다. 닐니리 노닐 유를 넣어 ‘遊月’이라 하면 이제 떠나려는 봄과 성큼 다가온 여름의 손을 한 쪽씩 잡고서 노닐고 싶어진다. 遊에는 ‘사귀다’라는 뜻도 있으니 두 계절과의 벗삼음이 흐뭇하다. 반면 그윽할 유의 ‘幽月’은 노닒과 사귐으로 상기된 마음을 가만 내려놓게 한다. 아침놀 저편으로 먼 산 펼쳐지듯, 늦은 오후의 산사에 향 피워 올린 듯 마음은 고요히 잠잠해져 간다. 시월은 그저 ‘詩月’이라고만 쓰기에 족하다. 시도 때도 없이 아무렇게나 펼친 시집의 낱말과 문장과 의미를 입술로 따다가 문득 창문 너머 삼각산에 들어찬 노랑과 주홍의 넘실거리는 빛을 보고선 홀연 감탄사 하나 흘려보내는 달. 그 짧은 한마디, 시가 될 수 있을까. 유월에 열린 사랑의 꽃은 시월에 시들어 더 많은 작별의 시를 피어나게 하는지. 시월은 햇빛 아래 찬란했던 온갖 빛을 다음 해로 배웅하는 애틋함과 어둡고 깊은 유현의 시간을 맞이하는 예감, 두 마음을 아울러 읊는다. “내 사랑하리 시월의 강물을 / 석양이 짙어가는 푸른 모래톱 / 지난날 가졌던 슬픈 여정들을, 아득한 기대를 / 이제는 홀로 남아 따뜻이 기다리리.”(황동규 시 ‘시월’ 중) 시월의 강물이 흐르고 흘러 닿은 어느메, 그곳을 어쩌면 시경詩境이라 부르는지. 한 해 열두 번의 달이 차고 기울지만 시경에 든 나의 달은 언제나 시월뿐이다.(허만하 시 ‘나의 계절은 가을뿐이다’ 중)

이르마 시안자 힐 자녜스 ― 구병모 <위저드 베이커리>를 번역하고 대산문화재단 번역문학상을 수상했다. 한국문학번역원에서 강의를 한다.
수고했다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해주면서 “고맙다”, “잘했다”라고 하는 “수고했다”는 말에 포함된 마음이 무척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수고하다’라는 표현은 스페인어로 그대로 번역할 수 없다. 그래서 번역본에서 만날 때마다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고민한다. 어떨 땐 고맙다는 의미에 더 가깝고, 어떨 땐 일을 잘했다는 의미에 가깝다. “조심히 가요. 앞으론 이런 수고할 필요 없어요.” 번역한 소설 김혜진의 <딸에 대하여> 중 발췌한 문맥에서 주인공은 자기 마음 상태 때문에 상대방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하고 간접적으로 수고했다고 말한다. 이를 번역하면서는 상대방이 한 일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뉘앙스가 있어, 이 아름다운 말을 번역하면서 어떻게 불쾌함까지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결과적으로는 ‘고생’에 가까운 말로 번역했다. 한국 문학을 번역하면서 종종 한국어의 간단하고 간결함이 신기하다고 느낀다. 한자를 기본으로 만든 단어뿐 아니라 한국 고유어에 속한 단어도 짧고, 한 글자만 달라도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현상이 너무 멋지다. 스페인어 그 자체는 더 길고 더 많이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어 한국어의 간결함을 전달하는 것이 번역가로서 재미있는 도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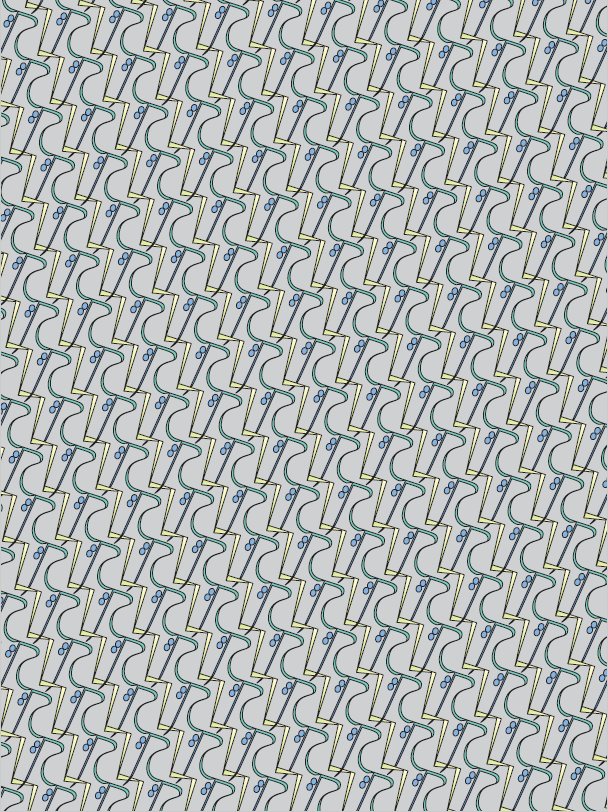
박선형 ― 번역가의 서재 대표 겸 번역가. <서점은 왜 계속 생길까?>, <사치스러운 고독의 맛>, <좋아하는 마을에 볼일이 있습니다> 등을 번역했다.
결
‘결이 같은 사람’. 이때 ‘결’은 성품의 바탕이나 상태를 뜻한다. 정체성처럼 고정되지 않고 물처럼 흐르는 것을 말하며, 정체성을 사람의 틀이라고 본다면 결은 틀과는 대조되어 상황, 비유, 운율, 이미지, 각운 등을 포함한다. “눈은 하늘이 내리는 게 아니라 침묵의 한가운데서 미끄러져 내리는 것 같다. 스스로 그 희디흰 결을 따라 땅으로 내려온다.”(이태수 시 ‘눈’ 중) 여기에서 “희디흰 결”은 눈의 패턴이 아니라 하늘에서 흘러내리는 눈의 운동성을 나타낸다. 가령 말이나 침묵에도 결이 있는데, 결은 흐르는 뉘앙스를 띠기 때문이다. 물이 졸졸 흐르고 술이 철철 흐르듯 파르르 떨리는 물의 생명만이 만물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결에서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자유로움을 느낀다. 번역가로서 원문을 옮길 때 사상이나 정서를 쉽게 추출할 수 있는 틀만 강조하는 직역을 피하고, 살아 있는 우리말 고유의 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글로 매만져 옮기려 한다.결이 결여된 글은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숲만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말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아 옮겨야 한다. 번역이란 우리말에 살아 있는 새로운 결을 불어넣는 작업이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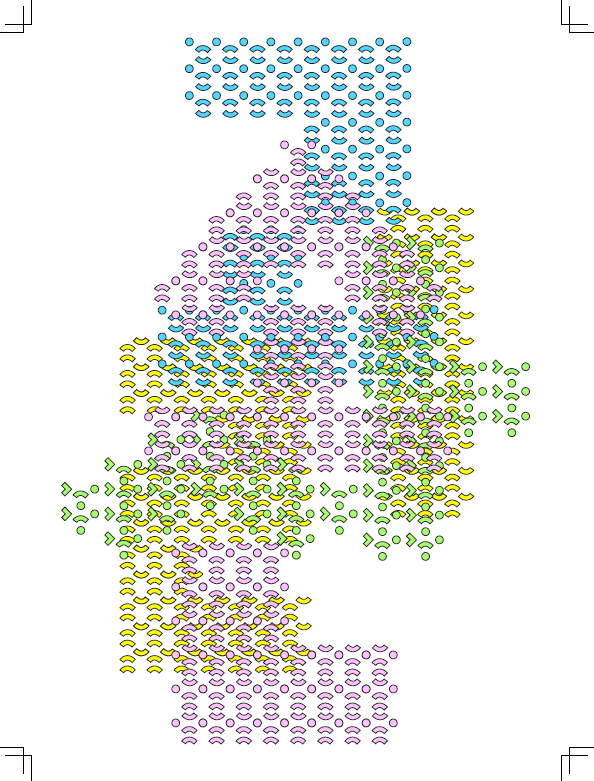
김소라 ― 한영 번역가. 황석영 <해질 무렵>, 김연수 <설계자들>, 편혜영 <홀>, <재와 빨강> 등 다수를 번역했다. 편혜영 <홀>로 미국 셜리잭슨상을 수상했다.
고사리손
“고사리손 같아.” 아기의 작은 손을 쓰다듬으며 하는 이 말은 마치 메아리처럼 들린다. 여기엔 개인적인 감정-엄마의 목소리, 조카들을 향해 말하던 엄마의 넘치는 정, 나도 엄마가 되기 전 나의 엄마가 돌아가신 슬픔-이 담겨 있다. 고사리손의 의미를 번역한다 해도 이 표현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영어 단어에 고스란히 담기지는 못할 것 같다. 감정을 배제한다고 해도 고사리손은 번역이 어렵다. 고사리는 흔히 ‘Bracken’으로 번역되는데 ‘Bracken Hands’는 소리가 강해서 crack의 의성어처럼 깨지는 느낌이라 공포스러운 느낌이 날 수 있다. ‘Fern hands’ 라면 엄청 긴 손가락이라는 뜻이 될 것이고, ‘ Fiddlehead Hands’는 왠지 만화 캐릭터 같다. 아무래도 아기 손을 떠올리는 말과는 거리가 있다. 번역하는 대신 ‘Baby Hands Like Unfurled Fern Fronds’라는 식으로 설명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편이 더 나을 지도 모르겠다. 식물을 아기 손에 비유하는 게아니라 아기 손을 식물에 비유하는 말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중심인 세상에서 자연을 중심에 두는 일처럼 느껴져서. 한국 사람들의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아니, 음식을 사랑하는 마음인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자넷 홍 ― 하성란 <푸른수염의 첫번째 아내>를 번역하고 미국 ‘퍼블리셔스 위클리’ 2020 최고의 책 top 10에 올랐으며, 번역한 김금숙 <풀>이 2020 미국 하비상 최고의 국제도서상을 수상했다.
캬, 죽인다
번역하면서 한국어는 소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대다수의 단어가 의성어에 바탕을 두는데,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소리뿐 아니라 질감과 감각을 묘사한다. 소설을 번역할 때는 이 점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래픽 노블을 번역 할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칵퉤, ‘벌떡’ 이란 효과음 하나 때문에 몇 시간 동안 꼼짝 못할 때도 많으니까. 그래픽 노블 번역의 난도는 소설 못지않게 굉장히 높은 편이다. 번역한 작품 중 앙꼬의 <나쁜 친구>에는 “캬, 죽인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여기서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한 여자가 친구들의 외모를 칭찬하며 휘파람 불듯 표현하는 말이다. 이 말을 간결하고, 생동감 있으며, 신선하게 들릴 수 있는 목소리와 대화로 만들기 위해 많은 밤을 보낸 기억이 난다. 슬랭 같지만 동시에 모든 연령과 계층의 한국인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표현이기도 했으니, 그것을 노골적으로 비속어적 표현이나 욕설로 번역하고 싶지 않았다. 왜, 노인이나 아저씨들이 시원한 국물 한 숟가락을 삼킨 후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캬, 죽인다. 결국 나의 선택은 ‘Yow! Lookin’ good!’ 이었다.

쿠지나 소피아 ― 공지영 <도가니>, 김영하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등을 번역했다.
보송보송 / 부숭부숭 / 부석부석
한국어는 먹음직스럽고 정말 맛있다. 맛이 있을 뿐 아니라 한글의 위대한 힘을 빌려 눈앞에 보이는 것들과 귀로 들리는 것들을 생생하게 그려준다. 만질 수 있을 만큼 감촉을 살려주는 신기한 언어다. 또한 크게 깊이 숨 쉬는 언어다. 한국의 정서를 담은 한국어의 맛과 멋을 나타내는 여러 도구 가운데 눈에 띄는 특징은 의성어와 의태어가 풍부하다는 점이다. 한국문학 작품을 접할 때는 거의 물리적으로 침을 흘리면서 입맛을 다시게 되어 있다. 문제는 한국어로 읽을 때 받은 느낌과 감동을 러시아어로 번역할 때 제대로 살리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눈은 동글동글, 귀는 길쭉길쭉, 온몸에는 털이 보송보송.” 한국 동화 <토끼의 간>을 읽었을 때 만난 문장인데, 이 페이지에서 살아 있는 귀여운 토끼가 뛰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느낌을 러시아어로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반복하는 형용사를 사용했다. 김승옥 <가출 남자>에서는 ‘부숭부숭’, <환상수첩>에서는 ‘부석부석’이라는 의태어를 만났는데, ㅗ와 ㅜ의 변화만으로 긍정과 부정을 오가는 기적을 발견했다. 단어나 표현 하나하나에 독특하며 깊고 풍부한 정서가 담겨 있으니, 어찌 이 언어와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 피처 에디터
- 전희란
- 아트워크
- 써니 스튜디오, 최재훈 of 스튜디오 베르크, 플래그플래그, 이재영 of 6699 프레스, 장수영, 스튜디오 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