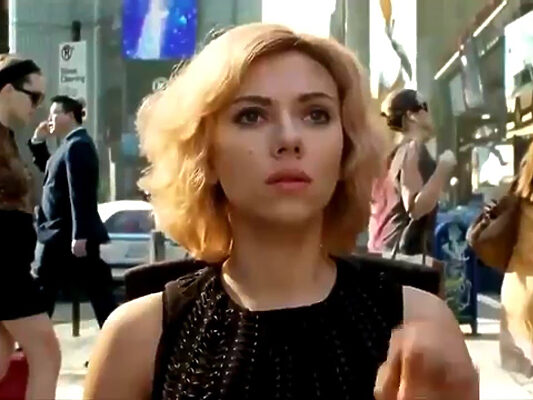결벽증 있는 남자와 섹스할 땐 신경 쓸 게 머리카락처럼 많다는 한 여자의 이야기.

남자는 가을이 싫었다. 은행을 밟느니 차라리 차도로 다녔다. 터진 은행을 다 치우고 나서야 남자는 안심하고 다시 인도로 올랐다. 걸을 만하면 멀쩡한 보도블록이 뒤집혔다. 새로 산 구두로 진창을 걷을 바에야 물구나무를 서고 말지. 단단한 흙만 골라 밟았다. 술 한 잔 안마시고도 갈지자로 걷는 건 이 유별난 남자에게 겨울이 왔다는 뜻이다. 오늘 남자에겐 새로운 여자를 만날 계획이 있다. 남자의 발걸음은 바람에 간신히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가벼웠다.
곧 같은 길에 여자가 섰다. 여자가 걸은 자리엔 바둑알만한 동그라미가 남았다. 지팡이를 짚는 것도 아닌데, 지나간 길엔 점뿐이었다. 남사스러운 만남은 아니었지만 굳이 알릴 이유는 없으니, 여자는 이 길이 좋았다. 갯벌에선 소금을 뿌려 맛조개를 잡았다. 오늘은 소금뿌릴 일 같은 건 없었으면 했다.
연말을 앞둔 이탤리언 레스토랑은 대만원. 점원이 여자를 자리로 안내했다. 긴 목조의자에 쿠션이 두 개 놓여 있었다. 테이블과 테이블의 거리는 얼굴의 잡티가 가물가물할 정도로 적당했다. 발목을 모아 구두 굽에 묻은 모래를 털고 물을 따르자, 남자가 식당으로 들어왔다. 남자는 먼저 도착했지만 가게 앞에서 할 일이 있었다. 구두 솔을 꺼내 한 발로 구두를 털고, 가게 유리창을 보며 머리를 빗었다. 다행히 여자는 그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못 봤다.
여자는 남자의 자리에 숟가락을 놓았다. 바닥에 냅킨을 깔진 않았다. 택시에 남자가 먼저 타는 것처럼 상대방이 잘 모를 수 있는 호의였지만, 여자는 냅킨을 까는 게 더 더러운 거라고 정확히 배웠다. 정갈한 남자의 옷차림을 보고 그 정도는 알 거라는 믿음도 있었다. 테두리까지 흰 리넨 포켓스퀘어를 꽂은 남자의 셔츠 소매는 손목 밖으로 정확히 2센티미터 나와 있었다. 구두는 식탁보만큼 깨끗했다. 털어낸 모래와 은행잎 찌꺼기가 부끄러워 여자는 발을 모았다.
남자는 여자가 건넨 숟가락을 뒤집었다. 여자의 발가락이 움츠러들었다. 아니될 일. 여자는 제사상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라고 배웠다.
“복 달아 난대요. 다리 떠는 것처럼.”
“이래야 바닥에 닿는 부분이 적잖아요. 효율적이죠.”
남자는 여자의 숟가락도 뒤집었다. 여자는 첫 번째 힌트를 남자의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호의처럼 보이기도 했다. 평범한 회사를 다니며 지긋지긋하게 만나는 남자들과는 달랐다. 왁스는 열심히 발라도 코털은 안 자르는 남자들에 여자는 질려 있었다. 걸쭉한 부대찌개를 쪽쪽 빨아먹고 테이블을 흥건하게 만드는 것보단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남자의 수염은 여자의 눈썹보다 깔끔했고, 손톱은 초승달을 그린 듯했다. 여자는 남자가 더 궁금해졌다.
“편집 디자이너라고만 들었어요. 그러면… 잡지 쪽?”
“출판사에 있어요. 자간, 장평 이런 거 아시죠?”
“굉장히 깔끔하신 것 같아요.”
“편집증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남자의 진심을 여자는 또 한 번 유머로 여겼다. 남자는 상 위로 팔꿈치를 올리지 않았지만, 여자는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여자는 남자 입술에 묻은 크림 파스타를 닦아주고 싶었다. 셔츠 안에 어떤 향수를 뿌렸을까, 침대에선 한 팔로 팔베개를 해주고 다른 손으론 어떤 책을 집어 들까. 높이 쌓인 피클을 보며 뭔가 무너뜨리고 싶은 건 남자뿐만이 아니었다.
“저… 뭐 묻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이제 여자는 남자가 쓰는 향수를 알았다. 숟가락받침을 찢어 이나 쑤시는 남자들에게도 가끔 손수건이 있었다. 엉덩이에서 금방 꺼낸 손수건은 엉덩이 곡선을 따라 그대로 휘어 있었다. 코를 풀라 해도 싫은 일.
남자와 여자는 콧물이 줄줄 흐를 만큼 뜨거운 술을 찾았다. 호리병에 담긴 정종과 안 주 두 개가 간신히 올라갈 만큼 작은 테이블. 거리도 그만큼 가까워졌다. 여자의 잡티는 조명이 대신 가렸다. 남자의 수염은 선명해졌다. 사람과 술의 온기가 섞였다. 여자는 뜨끈한 잔을 쥐는 것만으로도 취기를 느꼈다. 호기심도 함께.
“그런데요, 수염 어떻게 관리하세요?”
“아… 영국에 살 때 배웠어요. 왜, 여자들 왁싱 같은 거 하잖아요.”
여자는 데이비드 베컴의 구레나룻과 윔블던의 잔디, 남자의 바지 지퍼를 동시에 상상했다. 여자는 털이 수북한 곳에서 헤맨 적이 있다. 곱슬곱슬한 털이 이에 끼든 말든 남자는 밀어 넣는 게 먼저였다. 목젖에 닿을 만큼 깊이 들어왔을 땐 혀가 시큼해 숨을 멈췄다. 가끔은 씻지도 않고 덜렁거리는 물건으로 텔레비전을 가렸다. 덕분에 지난주엔 버스커 버스커와 울랄라 세션의 대결을 놓쳤다. 오늘은 <코미디 빅리그> 첫 번째 시즌의 최종전이 열린다. 여자의 집엔 텔레비전이 없다.
토끼 몸통만한 자기 주머니에 여자의 손을 집어넣은 채, 남자가 택시를 세웠다. 근처엔 모텔이 많았다. 여자는 그 중 몇 군데를 알고 있었다. 집에 가나? 그럼 좋고. 남자가 혼자 사는지는 물어보지 못했다.
“몽촌토성이요.”
남자가 어디 사는지는 알았다. 집에 가는 게 아니었다. 여자는 그 동네에 가본 적이 있었다. 왜 굳이 이쪽을 놔두고 멀리 가는 걸까. 알아도 모르는 척, 작정하고 걸어도 우연히 닿은 척하는 게 모텔 아니었나?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남자는 지체하지 않았다. 익숙한 걸음으로 가죽 차양을 걷었다.
“501호 있어요?”
“20분 기다리셔야 하는데요. 정리 중이에요. 203호는 어떠세요?”
“기다릴게요.”
남자는 익숙한 듯 로비에 앉았다. 여자는 못마땅했지만 들어가자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기다리는 동안 세 커플이 2층의 방을 모두 차지했다. 전망 좋은 방인가? 창문에 매달려 하는 섹스는 꽤 짜릿하다. 소리를 지르면 남자는 더 딱딱해지겠지.
방은 온통 흰색이었다. 탁자와 천장, 침대보까지 모조리 하얀색이었다. 의자는 꼿꼿했고, 안락한 소파나 두꺼운 커튼 같은 건 없었다. 여자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화장실 문만 열어도 샴푸 냄새가 팡팡 날 것 같거나, 빨갛고 동그란 침대가 있는 방은 질색이었다. 남자들이 좋은 데 보여준답시고 생색냈을 때, 피에로가 된 기분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남자는 여자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테리 리차드슨의 사진처럼, 흰 벽에 짧은 그림자가 생겼다. 여자는 흐뭇했다. 깔끔한 취향에, 공격적인 섹스 취향이라니. ‘낮엔 요조숙녀, 밤엔 요부’같은 판타지는 남자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침대로 올라가기만 하면, 남자의 전신을 한 바퀴 돌 생각이었다. 그런데, 남자의 키스는 끝날 기미가 없었다. 혀는 쇄골을 기준으로 위쪽에만 머물렀다. 거기까지. 남자는 화장실로 사라졌다. 아참, 씻고 와야지.
여자는 TV를 켜고 맥주 캔을 땄다. 남자는 오래 씻었다. 곧 여자도 씻었다. 남자보다 빨리 나오기 민망해서, 부러 시간을 끌었다. 여자는 친절을 베풀고 싶었다. 페트병에 담긴 물을 남자에게 전해줬다.
“어, 미안한데 이거 원터치 캡이에요.”
원터치 캔은 들어봤어도, 원터치 캡이란 말은 처음이었다.
“잠겨있는데? 돌릴 때 ‘뚜둑’ 소리 나잖아요.”
“그렇긴 한데, 위에서 눌러 씌울 수 있는 거예요. 물은 그냥 채워놓은 거고요.”
여자는 얼굴이 화끈거려 다시 맥주를 집어 들었다. 남자는 웃으며 여자를 안았다. 혀가 산맥을 지나듯 쇄골 아래로 넘어왔다. 남자는 여자가 귀엽다고 생각했다. 스스로 까탈스럽다는 건 자기도 잘 알았다. 잽을 날리며 펀치의 거리를 시험하는 복서처럼, 남자는 조금씩 자신을 드러냈다. 여자도 그런 남자가 싫지 않았다.
일회용품 지퍼백 대신 남자는 가방에서 콘돔을 꺼냈다. 약봉지처럼 연결된 게 아니라, 하나만 꽁꽁 포장되어 있었다. 이번엔 여자가 남자를 침대로 밀었다. 성감대를 발각당한 여자는 몸이 달아 있었다. 남자는 등을 대고 쓰러지는 대신,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리고 잠시 정지해 머리카락 두 개를 침대 밖으로 쓸었다. 여자는 생선 뒤집듯 남자를 뒤집었다.
“저, 혹시 이 닦으셨죠?”
“적어도 여기보단 깨끗할걸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의 ‘윔블던’에 멈춰 있는 동안, 남자의 허벅지 근육은 긴장해 있었다. 여자가 복숭아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남자의 탄식이 들렸다. 치우지 못한 머리카락이 맘에 걸리던 남자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만족한 여자의 입술이 남자의 얼굴로 올라왔다.
“자, 잠깐만요.”
“내 입술보다 그쪽 발이 더 더럽거든요?”
섹스가 끝나고, 여자는 침대에서 텔레비전 채널을 훑고 있었다. 남자는 낭만적이진 않지만 특별히 나무랄 데는 없었다. 처음이고 모르는 사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갸륵한 여자는 남자가 씻는 동안 양말을 개어 놓았다. 그런데…. 남자가 옷을 챙겨 입고 나왔다.
“어디 가요?”
“집에 가야죠. 저 이런 데서 못 자요.”
여자의 몸이 용수철처럼 벌떡 튀어올랐을 때, 프런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손님, 대실 마감 열한 시까지입니다.”
- 에디터
- 유지성
- 아트 디자이너
- Illustration/ Fingerpain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