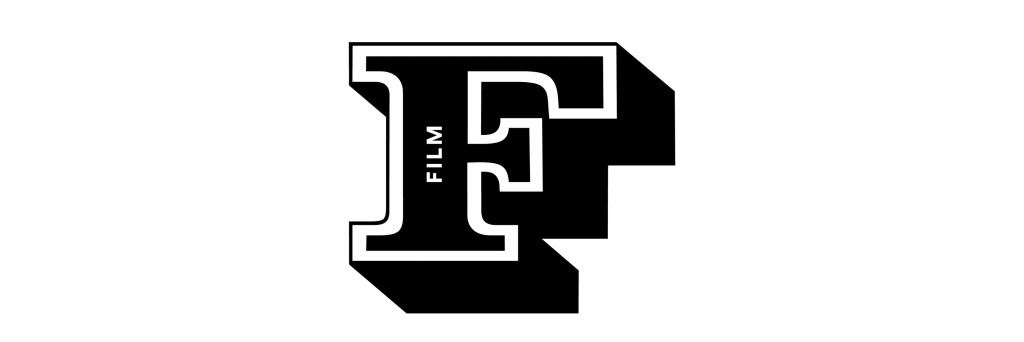이원석 감독의 두 번째 영화 <상의원>은 조선시대에 한복을 만든‘디자이너’들에 대한 이야기다.2013년에 개봉한 그의 첫 번째 영화 <남자사용설명서>는 그동안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스타일이었다. 지난 2년 동안 유일했다. 과연 이번에도 그럴까? <상의원>의 시사회가 끝나고 이원석 감독을 만났다.
옷에 관심이 많은가? 특정 브랜드만 입는다는 말을 들었다. 준야 와타나베를 자주 입는데, 진짜 좋 아하는 브랜드는 비비안 웨스트우드다. 그녀가 만든 초창기의 옷을 가지고 있을 정도다. 대부 분 입을 수 없는 옷들이다. 1990년대 후반 굉장히 힘들 때 미국에서 우연히 그녀의 강의를 들었다. 아주 큰 감동을 받았다. 그 이후에 광적으로 그녀가 디자인한 옷들을 모았다. 그러면서 옷에 관심이 많아졌다. 클래식한 스타일에 새로 운 방식의 디테일을 섞은 옷을 좋아한다.
<상의원>에서 천재 디지이너 이공진(고수)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옷을 자유롭게 만들고, 왕의 옷을 만드는 어침장 조돌석(한석규)은 항상 규율에 맞춰서 옷을 짓는다. 이 상황이 꼭 전작인 <남자사용설명서>와 <상의원>을 만든 당신처럼 느껴졌다면 비약일까? 맞는 말이다. 내가 이 영화를 하게 된 것 도 내가 돌석처럼 변해야 하는 건 아닌지에 대 한 고민이 계기였다. 공진과 돌석은 결국 창작자 한 사람이 겪는 내적 갈등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영화의 주인공은 한복이다. 본래 한복의 전통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나? 공진이 입는 옷은 꼭 ‘데님’처럼 보였다. 문제는 한복을 만드는 천재 이공진과 전통을 지키는 어침장 조돌석의 차이점을 옷 자체로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었다. 조상경 의상감독과 많은 상의를 한 끝에, 조선이 5백 년이라고 하면 공진이 만든 옷은 조선 후기의 옷, 돌석이 만든 옷은 조선 초기의 옷으로 정했다. 그래서 고증을 바탕으로 한복을 만들되, 다양한 모습의 한복을 보여줄 수 있었다.
대략적으로 한복 소매와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한 영조 때를 예상할 수 있다. 우리 영화는 어 떤 시기도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영조 때를 바 탕으로 상상한 건 맞다. 옷도 짧아졌지만, 영조때부터 상의원도 작아졌기 때문이다. 상의원은 궁에서 필요한 옷이나 다양한 물건을 만든 기관인데, 조선 초기에는 5백 명 가까이 일했다. 하지만 영조를 거치면서 축소되었고, 지금은 남아 있는 자료들이 별로 없다. 궁에 가도 어디가 상의원이 있었던 자리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추측할 뿐이다. 기록의 빈 공간을 다양한 한복으로 채우고자 했다. 벨벳을 사용한 것을 빼곤 거의 대부분 기록을 바탕으로 만든 한복들이다. 가장 많이 사용한 소재는 마였는데, 마가 정말 비싸다.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다보니까 매번 장인에게 맡겼다. 그 탓에 제작비가 많이 들었다.
<남자사용설명서>에서도 스태프들의 형형색색 트레이닝복이나 주조연들에게 상표가 노골적으로 들어나는 옷들로 캐릭터를 표현했다. 난 사극을 좋아하지 않는다. 가장 관심 없는 장르다. 그런데 옷이 좋다. 특히 한복은 정말 신기한 옷이다. 한복은 바닥에 두면 그냥 천 쪼가리 같지만 입는 순간 판타지처럼 아름다운 옷이 된다.
전형적인 사극 투인 “하옵니다”보다, 공진은 반말을, 중전은 ‘요’로 끝나는 존댓말을 사용한다. 시나리오부터 결정한 것이었나? 그렇다. 공진이 모든 틀을 깨는 사람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 말투도 중요했다. 기존 사극과 선을 긋기 위한 장치였다.
하지만 이 영화의 후반부는 아쉬움이 남는다. 전반부 1시간 동안 처음 보는 사극이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겼지만, 후반부 1시간은 전형적인 사극으로 돌아간다. 조심스러웠다. <남자사용설명서>를 만들고 흥행에서 쓴맛을 봤기 때문이다. 물론 칭찬도 받고, 새로운 도전이라며 인정도 받았지만, 그 영화 이후 두려웠다. <상의원>의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신분 상승을 위해 옷을 만드는 돌석의 마음에 완벽하게 감정이 이입된 것도 그런 이유다. 어찌 보면 내 자신이 공진에서 돌석의 마음으로 나아간 것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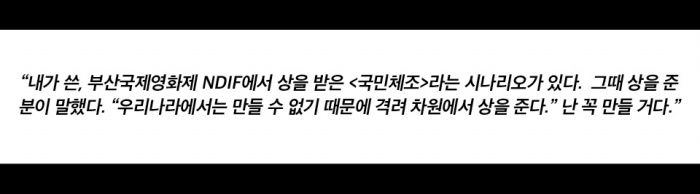
배우 한석규가 JTBC <뉴스룸>에서 공진과 돌석의 차이를 이렇게 말했다. “순수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과, 어떤 목적 때문에 일을 선택한 사람의 충돌이다.” 앞 질문으로 돌아가서 후반부 1시간, 난 시나리오에 충실하고 싶었다. 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가장 좋은 부분도 후반부였다. 초반부는 가볍고 공진의 감정에 충실하지만, 후반부는 무겁고 돌석의 감정이 중요하다. 거기에다 만약 다른 요소를 넣었다면 오히려 또 다른 부분을 포기해야 했을 것이다. 물론 ‘공진이 만약 지구인이 아니라서 밧줄을 타고 달나라로 간다면?’이란 상상도 해봤지만, 스태프들에게 얘기하자마자 난리가 났다.
안정을 선택했나? 전작이 잘되어야 그 다음 작품도 할 수 있다. <남자사용설명서>는 7년을 준비해서 만든 영화다. 한데 흥행이 잘 안되었다. 두번째 영화를 할 수 있었지만 생각이 많아졌다. 이번 <상의원>과 다음 영화까지는 좋은 성과를 내는 상업 영화를 만들고 싶다. 네 번째쯤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영화를 내 마음대로 만들고 싶다. 내가 쓴, 2008년 부산국제영화제 NDIF에서 상을 받은 <국민체조>라는 시나리오가 있다. 그때 상을 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상을 준다.” 난 이 영화를 꼭 만들 거다. 인원이 많이 필요해서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제대로 B급 뮤지컬, 슈퍼히어로 영화로 만들고 싶다. 그러려면 개봉할 <상의원>이 잘되고 다음 영화도 성공해야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영화도 도전해야 할 것 같다.
당신에겐 상업 영화가 도전인 건가? 나는 <남자사용설명서>를 상업 영화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반응은 달랐다. B급 정서, 감독이 하고 싶은 대로 만든 영화로 비춰졌다. 그럼 내가 정말 모르는 것 아닌가? 이탈리아 우디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았을 때,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다”고 말했는데 그때쯤 결정했다. 그때 당시 질투도 많이 한 것 같다.
흥행에 대한 질투인가? 영화를 열정으로 만든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학생 때나 가능한 말이다.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입봉을 준비한 7년 동안 끝내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다. 내가 다른 사람처럼은 될 수 없어도, 나처럼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만든 영화가 지지도 받았지만, 욕도 많이 먹으니까 계속 피하게 되었다. 그래서 흥행이 잘된 영화를 만든 감독에게 열등감도 느꼈다.
고백하자면 <남자사용설명서> 이후 당신의 영화에서 계속 새로운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다. 내 꿈은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영화를 연출하는 것이다. 나도 많은 관객에게 사랑받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상의원>은 그런 면에서 충실했다고 생각한다.
2014년, 가 뽑은 ‘올해의 영화’는 독립 영화인 <한공주>였다. 상업 영화 중에서 새롭고 신선한 영화는 찾기 어려웠다. 제작비 때문에 안정적인 영화가 많아졌다. 투자했으면 그만큼 한마디 하고 싶지 않을까? 그건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 에서 감독은 모험을 하기 두렵다. 그 탓에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영화도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공장장이 아닌 영화감독이 하는 역할은 뭘까? 감독은 매니저라고 생각한다. 제일 잘하는 사람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일하게 만드는 게 감독이다. 영화를 제대로 하기 전엔 프리 프로덕션(촬영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 번째 영화를 하고 보니 현장이 제일 중요했다. 현장에서의 통솔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낀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촬영에 대해선 촬영감독보다 모르고, 세트에 대해선 미술감독보다 모른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존중하고 믿어주는 게 감 독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이 최선을 다하게 해야 한다. 감독이 자존심 때문에 모르는 데도 한마디 더할 때 영화가 망가진다고 생각한다. 무술감독이 짜온 ‘합’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믿어줘야 하는데, 괜히 아니라고 하면 영화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 시대에 감독은 스태프에게 믿음을 주는 것 그게 전부 아닐까?
하필 <상의원>의 대사가 생각난다. “나라면 더 옅은색을 만들었을 것이오. 그러면 더 예뻤을 텐데.” 지금 한국영화에 꼭 필요한 태도라고 느꼈다. 그거 우리 조감독이 추천한 대사다.

- 에디터
- 양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