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로 수비를 깨 부숴야 비로소 슛 찬스가 생기는 것이다. 슛만 잘 던져서는 공격 기회가 생기지 않으니, 자연히 전문 슈터들이 설 자리는 좁아졌다. 대신 슈터들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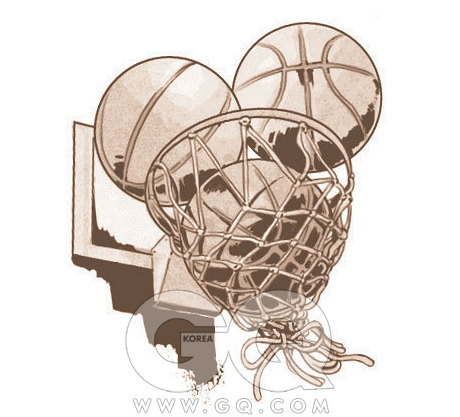
데이브 호프라는 슈팅 전문가다. 지난 30년간 세계 각지의 농구선수들에게 슈팅을 지도했다. 작년 6월 일본에서 열린 NBA 농구 캠프에서 그는 “요즘은 슛을 알고 던지는 선수가 적다”며 혀를 끌끌 찼다. NBA 농구캠프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농구 유망주들이 모인다. 데이브 호프라는 “더 큰 문제는 문제를 지적해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무작정 많이 던지면 되는 줄 안다”며 안타까워했다. 돌파는 잘하는데 슛은 자세부터 잘못된 선수가 많다는 말도 덧붙였다.
공교롭게도 이런 고민은 범세계적이다. 특정 리그나 국가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다. 최근 NBA에선 데일 엘리스, 레지 밀러, 레이 앨런으로 이어지던 슈터의 계보가 끊겼다. 센터부터 포인트가드까지 모두 3점 슛을 던지는 시대지만 진짜 슈터는 없다. 미국 대표팀이 두 번의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를 치르는 동안 가공할 만한 득점력을 선보였지만, 슈터라기보다 득점원이란 말이 어울리는 선수들의 활약 덕분이었다.
KBL도 마찬가지다. “슛은 한국이 최고”라는 찬사를 받던 때가 있었다. 서울 올림픽은 물론이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까지도 그랬다. 해외 선수나 지도자들은 여전히 한국을 슈터의 나라로 인식한다. 이충희, 박인규, 김현준, 문경은 등은 찬스가 나면 여지없이 슛을 성공시켰다. 그런데 요즘은 슛 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드물다. 2011~2012 시즌 3점 슛 성공률 1위는 포인트가드 김태술이다. 2002~2003 시즌만 해도 3점 슛 성공률 40퍼센트를 기록한 선수가 10명이었지만, 올핸 조성민뿐이다.
가장 큰 이유는 공격과 수비의 불균형이다. 전설적인 농구감독 레드 아워백은 “창이 있으니 방패가 생긴 SPORTS것처럼, 공격이 생기고 수비가 따라왔다”는 말로 농구를 전쟁에 비유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농구계에서 원 핸드 점프슛은 이단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점프해서 한 손으로 슛을 던지는 것이 블록 당할 위험이 적은데다 타이밍도 빠르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 선수들은 원 핸드 점프슛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수비수들은 더 높이, 더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3점 슛이 도입될 때도 마찬가지였다. 키 큰 수비수들이 외곽까지 나와 슈터들을 효과적으로 봉쇄하자, 장신 수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러 스크린 전술이 생겨났다. 이중, 삼중 스크린을 활용해 슈터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스택, 스태거드 플레이는 그렇게 탄생했다. 이 전술은 레지 밀러, 레이 앨런, 문경은, 우지원 같은 슈터들을 리그 정상급 선수로 만들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선 이마저도 쉽게 통하지 않았다. 수비 발전 속도가 공격을 추월했기 때문이다. 요즘 국내외 지도자들은 “공격은 한계가 있어도 수비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비디오 분석이 전문화되며 구단은 선수들의 작은 습관까지도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팀별 스크린의 종류, 선수가 슛을 선호하는 각도까지 모조리 데이터화된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공격이 원활하게 풀릴 리가 없다. 그래도 NBA는 흥행에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 NBA에는 르브론 제임스, 코비 브라이언트, 데릭 로즈 등 괴물 같은 운동능력을 가진 선수가 많다. 개인기로 수비를 무용지물로 만든다. 유재학 모비스 감독 역시 “아무리 좋은 수비 방법도, 개인기가 좋은 선수를 당해내긴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돌파로 수비를 깨부숴야 비로소 슛 찬스가 생기는 것이다. 슛만 잘 던져서는 공격 기회가 생기질 않으니, 자연히 전문 슈터들이 설 자리는 좁아졌다. 대신 슈터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늘어났다. 호프라 코치는 농구 캠프 슈팅 클리닉에서 선수들에게 러닝과 리바운드까지 연습시켰다. 그는 “슈터는 슛만 던지는 선수가 아니에요. 찬스를 스스로 만들고, 슛이 안 들어갔을 땐 재빨리 리바운드에도 가담할 수 있어야죠. 또한 수비가 앞에 있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슛 성공률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해요”라고 덧붙였다.
KBL은 2012~2013 시즌 수비자 3초 룰을 폐지시켰다. 강팀들의 수비 전술은 더욱 공고해졌다. 하지만 우리에겐 르브론과 코비가 없다. 드리블로 수비를 제칠 수 있는 선수가 드물다. 공격은 더 침체됐다. 사실 KBL 선수들의 개인기 부족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프로 출범 당시 코트엔 외국인 선수가 두 명씩 있었다. 국내 선수들은 외국 선수들 덕분에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었다. 안에서 나오는 패스를 받아 슛을 던지면 그만이었다. 상대 수비도 외국인 선수를 막는 데 집중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선수가 한 명으로 줄어들자 감독과 선수들은 고민하기 시작했다. 기회는 늘었는데, 보여줄 만한 능력이 부족했다. 코트에 남은 건 선수들의 부족한 자신감뿐이었다. 때마침 길어진 3점 슛 거리는 그 자신감마저 앗아갔다.
한편 국내 프로 구단의 한 2군 코치는 선수들의 잘못된 습관을 꼬집었다. “슛 연습을 시키면 그 자리에 서서 몇 개 던지다 끝내요. 실전이라 생각해야 하는데, 중요성을 잘 못 느껴요.” SK 문경은 감독은 김선형이 입단한 뒤 슛 자세 교정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많은 프로 지도자들이 “프로까지 온 선수들한테 슛 자세를 가르쳐야 할 줄은 몰랐다”고 불평한다. 전부 다 선수들의 탓은 아니다. 은퇴한 원로 지도자들은 한 목소리로 “아마추어 지도자들이 슛 연습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잘못됐다고 지적은 할 줄 알지만, 뭐가 어떻게 잘못됐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말한다.
슈터는 하루아침에 실종된 것이 아니다.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원인이 쌓이고 쌓여 나온 결과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다시 코트 규격이나 슛 거리를 줄일 수는 없다. 슛은 연습량에 비례한다지만, 현대 농구엔 연습량마저 제압할 수 있는 변수가 많다. 슈터가 슈터로 그쳐선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 에디터
- 글/ 손대범
- 아트 디자이너
- Illustration / Lee Jae Ju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