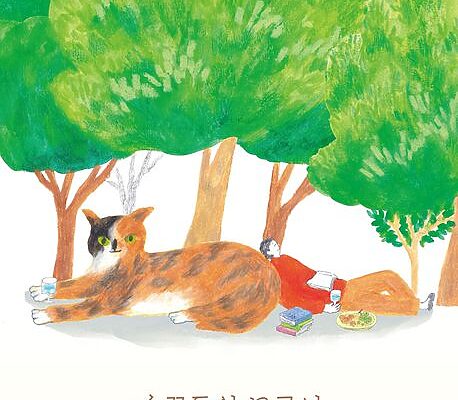국내 소비업계에 미국의 팁 문화가 두루뭉술 자리하기 전에 살펴봐야 할 이야기들이 있다.
글 / 이용재 (<외식의 품격> 저자)

미국에서 나는 신실한 ‘팁퍼 Tipper’였다. 팁의 체제에 순응하는 것은 물론 가치조차 믿었다. 내가 내는 팁이 접객, 더 나아가 요식업의 발전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거라 여겼다. 그래서 꽤나 진지하게 팁 문화를 대했다. 통념상 기본이었던 전체 식대의 15퍼센트는 당연히 지불했고, 접객의 수준에 맞춰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데 별 거리낌이 없었다. 식대의 20~25퍼센트를 팁으로 지불하면서도 식사 예산의 일부라고 당연하게 여겼다.
음식점의 수준이 높을수록 팁의 비율도 올라갔다. 실제로 미쉐린 별이라도 단 레스토랑의 접객은 예술적인 퍼포먼스 같았으니, 그런 데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라고 믿었다. 한편 너그럽기까지 해서 접객이 설사 나쁘더라도 웬만해서는 팁을 15퍼센트 이하로 깎지 않았다. 이런 일련의 행위 속에서 고상한 문화생활이라도 하는 것 같은 일종의 자아 도취를 느꼈다.
하지만 나는 순진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으니, 내가 왜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팁을 주어야 하는지 깊이 따져보지 않았다. 원래 혹은 다들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하는 거라 가볍게 생각하고 지갑을 열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다. 팁은 사실 노동자는 물론 소비자까지 괴롭히는 사회악이다.
노동자의 측면에서 팁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사회악이다. 팁을 받는 미국의 접객 노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저임금에 시달린다. 연방정부 기준 팁을 받는 노동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13달러(약 2천7백20원)이다. 일반 직종 최저임금인 7.25달러의 30퍼센트로 1991년 책정된 이후 무려 30년 넘게 변화가 없는 금액이다. 각 주 정부가 실질적으로 좀 더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낮게 받는 것만은 확실하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팁은 명백한 골칫거리다. 요즘 미국인들은 팁의 규모는 물론 지출 자체에도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한마디로 전방위적 ‘팁플레이션(팁+인플레이션)’이 찾아왔다. 통념상 표준이었던 15퍼센트로는 어림도 없어졌다. 이제 심지어 25퍼센트까지 하한선이 올라가고 있다. 더군다나 애초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드라이브스루 창구 같은 곳에서도 팁을 주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낀다. ‘대체 어디까지 얼마나 팁을 주어야 하는가?’를 놓고 미국인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 팁은 어찌하여 이렇게 사회적 질환처럼 모두에게 민폐를 끼치며 퍼져나가게 되었을까? 좀 뻔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팁이라는 귤은 대서양을 건너면서 탱자로 변질됐다. 원래 영국에서 비롯된 팁 문화는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였다. 가진 이가 좀 더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에게 지출하는 금액이었다는 의미다. 튜더 왕조(1485~1603) 시대에 하인이 일을 잘했을 때 주던 가욋돈이 시초가 되어 17세기엔 커피 하우스 등에서 지불하는 소액의 감사 표시 같은 것이었다.
원래 이랬던 팁 문화가 186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본격적으로 변질되었다. 남북 전쟁(1861~1965) 이후 흑인 노예들이 해방되어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백인 남성 사업가들은 이들을 동일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해줄 생각이 없었다. 그리하여 팁으로 이들을 통제했다. 전부라고 해도 될 흑인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팁을 적용해서 백인 사업가들은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다. 첫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 가운데 둘째, 원래 정당한 노동의 대가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을 팁으로 돌림으로써 사업가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당신 하는 데 달렸다’와 같은 거짓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변질된 팁 문화는 특히 요식업에서 빠르게 뿌리를 내렸다. 접객원 대부분이 사회적인 세력으로 집결하지 못한 흑인 여성인 탓이었다. 당시 흑인 여성은 요식업 접객원, 남성은 주로 기차의 짐꾼으로 종사했다. 그런 가운데 짐꾼들은 A. 필립 랜돌프의 주도 아래 최초의 흑인 노조를 결성해 철도 여객업체 풀먼 컴퍼니에 맞섰고, 그 결과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접객원들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할 임금 대부분을 부정기적인 팁으로 벌충해야만 했다.

이처럼 불공정한 체계를 법이 고착시켰다. 1938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최저임금법을 인준했지만 요식업계 종사자들은 제외되었다. 흑인이 압도적인 비율로 이루어진 업종이 타격을 입은 것이다. 1966년 최저임금법이 전면 개정되었을 때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1960년대 중반까지 팁을 받는 업계의 종사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았다. 그렇다, 0달러였다는 말이다. 오늘날 팁을 받는 업종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연방 최저임금인 시급 7.25달러를 보장해주어야만 한다. 2.13달러의 기본급과 팁의 총합이 시간당 7.25달러를 밑돈다면 고용주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오랫동안 뒤틀릴 대로 뒤틀린 팁 문화는 요즘 결제 및 매출 시스템인 포스 (POS, Point of Sale System)에 의해 또 한 번 망가지고 있다. 업체가 시스템을 악용해 일부러 높은 비율의 금액만을 계산 및 제안한다. 이를테면 미국 내에서 오랫동안 통념이었던 매출액의 15퍼센트보다 높은, 20퍼센트 이상을 기본 팁이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크레딧카드닷컴’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2퍼센트가 이처럼 미리 계산되는 팁이 강요받는 느낌을 준다고 밝혔다. 이는 상당 부분 시스템을 개발 및 보급하는 테크 기업의 책임이다. 현재 미국의 새로운 포스 시스템은 스퀘어, 토스트, 클로버 세 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들의 시스템이 특히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지만, 한편 제공하는 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을 통해 부지불식간에 소비자로 하여금 더 많은 팁의 부담을 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인들은 팁에 넌덜머리가 난 상황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삶의 비용이 자꾸만 늘어가는데 팁까지 발목을 잡는 것이다. 2022년의 연구에 따르면 팁의 전체 비율이 줄어든 것은 물론, 팁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응답도 60퍼센트에 달했다. 분명히 한정된 돈을 가지고 이리저리 팁을 지불하다 보니, 결국은 원래 받아야 할 이들이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팁을 담보로 삼은 성희롱이나 추행 등의 진짜 사회적 문제까지 고려하면 팁이 사회악임은 너무나도 확실해 보인다.
그런데 이런 팁 문화가 국내에 도입될 조짐이 슬금슬금 보이고 있다. 지난 7월의 뉴스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에 팁을 줄 수 있는 기능을 업데이트했다.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호출한 뒤 서비스 별점 5점을 준 경우 창이 등장한다. 일부 이용자에게만 시범 운영 중이라는 이 팁 기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편 요식업계에서도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 유명 베이글 전문점에서 계산대에 팁 단지를 올려놓은 것이다. 합법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여러 갈래로 이상한 결정이었다. “진짜 팁을 받으려는 의도는 아니고 매장의 콘셉트를 따른 것이다” 라고 설명했지만, 영국풍이라면 팁 자체를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더군다나 해당 매장은 셀프 서비스가 기본이라 사실 팁을 요구할 건더기도 없다.
과연 이런 조짐들이 팁 문화의 진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나는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팁은 미국 현지에서도 없어져야 할 문화이며, 국내에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법과 체계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의 권리가 수많은 개인의 판단에 맡겨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선진국에서 배워야 할 점들이 분명히 있지만 팁 문화는 확실히 아니고, 우리는 미국의 현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 이미지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