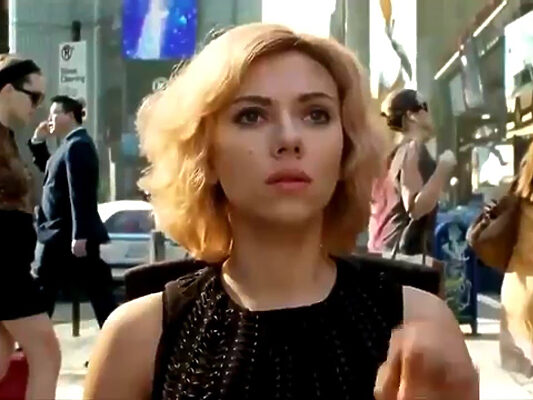세상의 모든 술이 그렇듯, 위스키 역시 주종에 알맞은 글라스와 함께할 때 본연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리델 싱글몰트 글라스
1992년 리델이 처음 선보인 싱글몰트 위스키만을 위한 전용잔이다. 싱글몰트 글라스는 잔의 입구가 바깥쪽으로 약간 휘어져 입술에 닿았을 때 위스키가 혀의 끝 부분에 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입술이 닿는 부분이 얇아 맛을 음미하기 좋고, 볼 부분이 넓어 위스키의 향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싱글몰트 위스키 애호가들이 선호하며 위스키 고유의 황금 빛깔을 위해 컬러를 입히거나 화려한 장식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위스키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원액 그대로 즐기는 ‘니트(Neat)’ 매력을 한 잔에 온전히 담아낸다.
글렌캐런 글라스

스코틀랜드의 프리미엄 글라스웨어 브랜드인 글렌캐넌 크리스털이 2001년에 만든 위스키 시음 전용잔이다. 글렌캐런 글라스는 보라색 엉겅퀴 꽃을 본떠 만들었는데 작은 램프 모양의 위로 좁아지는 볼록한 볼이 특징이다. 유려한 곡선을 지니고 있지만 몸체가 매우 단단해 잘 깨지지 않는다. 또 넓은 베이스 부분은 술이 담기는 순간 향이 잘 펼쳐질 수 있게 도와주며,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입구는 잔 안에 퍼진 향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모아줘 풍부한 느낌을 준다. 글라스 보관부터 관리까지 간편해 대형 시음회장이나 가정에서 두루 사용한다.
코피타 글라스

글렌캐런 브랜드가 만든 또 다른 위스키 전용잔이다. 튤립 모양을 닮아 동명의 애칭을 가지고 있다. 와인잔과 비슷하게 생긴 외형 탓에 때로 와인 시음에 사용되는 ‘카타비노(Catavino)’로 불리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둥그스름하고 기다란 모양의 코피타 글라스는 향을 잡아두기에 매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잔 아래로 달린 다리 덕분에 잔을 손으로 잡아도 위스키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글렌캐런 글라스와 마찬가지로 향을 잘 맡을 수 있게 해주는 잔을 ‘노징 글라스(Nosing Glass)’라고 하는데, 위스키 고유의 향을 음미하는 데 최적화돼 있기 때문에 테이스팅에 주로 사용되기도 한다.
올드 패션드 글라스
위스키 바에 가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잔인 ‘올드 패션드 글라스(Old-Fashioned Glass)’. 굴러갈 듯한 원통 모양의 단단한 잔으로 다른 이름으로는 ‘온더록스 글라스(On the Rocks Glass)’, 혹은 이런 모양의 잔들을 통칭해 ‘텀블러(Tumbler)’라 부르기도 한다. 올드 패션드 글라스라는 이름은 코냑과 소다, 그리고 얼음을 넣어 만드는 위스키 칵테일 ‘올드 패션드’에서 따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바닥이 두껍고 견고하여 쉽게 넘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다만 입구가 넓어 향을 모아주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크리스털 컷팅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장식적인 잔이기도 하다.
샷 글라스
소주잔보다 약간 날씬하고 좀 더 길게 생긴 ‘샷 글라스(Shot Glass)’는 보통 30ml~35ml가 기준이다. 18~19세기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에 총알 하나와 바꿔 마시면서 샷 글라스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알려져있다. 주로 위스키를 포함한 고도수의 술을 마실 때 사용돼 스트레이트 잔으로 불리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양주잔’이라 불리기도 한다. 잔에 술을 가득 채워서 한 번에 털어 마시기는 용도이기 때문에 위스키의 향을 제대로 느끼기에는 어렵다. 올드 패션드 글라스만큼이나 위스키 잔으로 유명하지만 위스키를 천천히 즐기면서 마시기에는 부족한 잔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볼 글라스
‘하이볼 글라스(Highball Glass)’는 위스키 전용잔이라기보다는 칵테일 잔이다. 위스키에 얼음, 그리고 탄산수, 레몬과 같은 재료들을 함께 넣어 마시는 잔으로, 입문자들이 위스키를 캐주얼하게 즐길 때 빼놓을 수 없는 잔이기도 하다. 정확한 유래는 없지만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마시는 잔이기 때문에 보다 큰 잔이 필요해서 하이볼이라는 이야기와, 잔에다 얼음을 넣고 위스키와 탄산을 따르면 얼음이 위로 떠오른다고 해서 하이볼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하이볼 글라스는 원통의 디자인이지만 굴뚝처럼 얇은 기둥 모양을 한 잔도 있다.
- 사진
- 리델, 글랜캐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