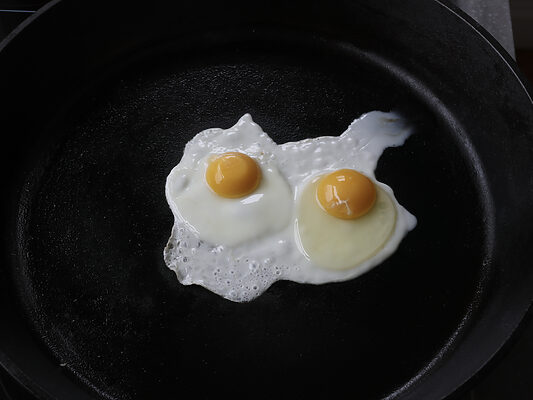당신도 알다시피 마티니는 칵테일의 기본이자 정수. 모든 것을 정리했다.

마티니는 진, 베르무트, 올리브로만 만든다. 요즘은 진과 베르무트의 비율을 5:1로 맞춘 것이 많다.
[마티니의 미스터리]
제임스 본드는 왜 흔들었나? <킹스맨>의 에그시는 그 바쁜 와중에도 마티니를 꼼꼼하게 주문한다. 진 베이스로, 흔들지(셰이킹) 말고 저어서, 베르무트는 넣지 말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라고 주문한다. 제임스 본드의 마티니 레시피를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새로운 스파이의 탄생을 알린 셈이다. 마티니는 원래 진으로, 저어서 만든다. 그런데 제임스 본드는 왜 흔들었을까? 흔들면 기포가 들어가 색깔도 뿌옇고 입술에 닿는 감촉도 달라진다. 정통 마티니가 실크를 입술에 문 것 같은 느낌이라면, 셰이킹한 마티니는 울 니트를 입술에 댄 것 같은 느낌이다. 정통 마티니라면 실크 쪽이 아닐까? 제임스 본드는 베이스를 보드카로 주문했고, 아마도 온도와 배합을 위해 셰이킹을 요청했을 것이다.
마티니는 언제 생겼을까? 아무도 모른다. 바텐더였던 마르티니가 뉴욕 니커보커 호텔에서 만들었다는 설, 마티네즈 칵테일이 변형되었다는 설 등 단서는 많지만 정답을 못 찾고 있다. 1900년대 초에 생겼을 것으로 추측할 뿐…. 미스터리로 두는 것도 근사하다. 확실한 건 초창기에 비해 마티니가 갈수록 드라이(베르무트를 줄여 단맛이 없는)해진다는 것이다.
명사들은 왜 마티니에 빠졌을까? 명사들이 유난히 마티니를 좋아했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마티니의 매력 때문에 명사들의 말이 수집된 것일 수도 있다. ‘한스바’의 이한별 바텐더는 마티니의 매력을 이렇게 설명한다. “달지 않은 술이 주는 멋 때문이 아닐까요? 익숙하고 편한 맛이 아닌, 드라이한 맛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칵테일이 탄생했습니다. 단순하고 세련된 모양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고요.”
알록달록한 마티니는 뭘까? 바 메뉴판을 보면 마티니 종류가 꽤 많다. 주로 다른 리큐르를 섞은 것인데, 맛도 색도 향도 멋도 마티니와는 많이 다르다. 그냥 이름에 ‘–티니’ 정도의 애칭만 붙이는 게 어울린다.
[마티니와 얼굴들]

왼쪽부터ㅣ 윈스턴 처칠, 줄리아 차일드, 프랭클린 루즈벨트
윈스턴 처칠
마티니에 진만 넣었다. 프렌치 베르무트를 넣는 대신 프랑스를 향해 인사만 하고 마셨다는 설도 있는데, 처칠의 손녀가 “그 모습을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말한 이후 루머로 밝혀졌다.
줄리아 차일드
요리사인 그녀는 진과 베르무트의 비율을 1:5로 섞어 마셨다. 기존 비율과 정반대여서 리버스 마티니라고 불린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3년 금주법의 종결을 알리면서 마티니로 축배를 들었다. 1943년, 세계 2차대전 당시 열린 테헤란 회담에서도 처칠, 스탈린과 함께 마티니를 만들어 마셨다.
클라크 게이블
베르무트 병을 거꾸로 돌려 코르크에 적신 후, 이걸 잔의 림 부분에 한번 문질렀다. 처칠 마티니만큼 드라이하다.
헤밍웨이
몽고메리 마티니를 즐겼다. 몽고메리 장군이 전력차가 15배 이상 나지 않으면 전투를 하지 않았다는 말에서 시작된 술로, 진과 베르무트를 15:1의 비율로 맞춰 아주 드라이하다.
이안 플레밍
<007> 시리즈 원작 소설의 작가는 실제로 아주 드라이한 마티니를 즐겼다. 그는 런던의 듀크바에서 젓지도 흔들지도 않고 거의 진만으로 만든 한 잔을 자주 마셨다.
[이탈리아 베르무트와 프랑스 베르무트]

알려진 브랜드가 꽤 많은 진에 비하면 베르무트는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람처럼 어색하다. 베르무트는 진처럼 집에 한 병 가져다두고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꺼내 먹는 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이트 와인에 브랜디와 각종 향료를 우려 만들어서, 일단 뜯으면 와인처럼 맛이 변하기 시작한다. 칵테일에 아주 조금씩 쓰는 것에 비해 유통기한이 짧아 집에서는 물론이고, 바에서도 관리가 힘든 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탈리아의 ‘마티니 사’와 ‘친자노’에서 만든 것과 프랑스의 ‘노일리 프랫’을 많이 쓴다. (수입되는 브랜드가 한정되어, 바텐더들이 마음껏 뜻을 펴지 못하고 있다.) 예전엔 이탈리아 베르무트는 달고, 프랑스 베르무트는 씁쓸하다는 게 공식이었지만, 지금은 나라와 상관없이 브랜드마다 제각각 개성 있는 향을 뿜는다.
[향을 찾아서]
진과 베르무트는 향이 비슷해서 잘 어울린다. 주니퍼베리는 두 가지 술에서 모두 느껴지는 허브 중 하나다. 솔잎 향과 비슷하고 나무 껍질과 젖은 숲 향, 살짝 달콤한 향도 스친다. 아무것도 섞지 않은 베르무트를 마시면, 봄에 쑥을 찧을 때 맡던 그 향기가 난다. 베르무트의 어원이기도 한 웜우드 향이다. 우리말로는 향쑥이다. 그 밖에 고수풀, 캐모마일, 샤프론 등의 향기도 압축돼 있다. 만약 베르무트 자체의 향을 느껴보고 싶다면 보드카 마티니를 주문해본다.

01 캐모마일. 02 주니퍼베리. 03 웜우드. 04 고수풀. 05 샤프론.
[베르무트의 나날들]
영화 <사랑의 블랙홀>에서 여주인공 리타는 식당에서 베르무트 온더록을 주문한다. 지켜보고 있던 필(빌 머레이)이 다음 날(실은 같은 날의 반복) 모르는 척 베르무트 온더록을 먼저 주문하고는 취향이 맞는다며 으스댄다. 베르무트는 마티니의 보조 역할로 유명하지만, 그 자체로도 훌륭한 술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베르무테리아’가 늘 인기이고, 사람들은 타파스에 이 술을 곁들인다. 만약 좋은 베르무트가 한 병 생겼다면, 이 칵테일은 어떨지…. 봄과 여름 사이의 맛이다.

베르무트 90ml와 아페롤 30ml, 얼음을 셰이커에 넣고 30초 정도 흔든다. 스트레이너를 받치고 얼음을 채운 하이볼 잔에 천천히 따른다. 탄산수로 하이볼 잔을 끝까지 채운 뒤 오렌지 껍질로 장식한다.
[마티네즈와 베스퍼 마티니]
마티니의 친구들. 마티네즈는 마티니의 기원이라고 짐작되는 칵테일이다. 드라이 마티니와 비교하면 말도 못하게 달콤하고 부드럽다. 베스퍼 마티니는 이안 플레밍의 소설 속에 등장한 제임스 본드식 칵테일이다. 본드걸 베스퍼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 셰이킹을 한 뒤 잔에 따랐기 때문에 색이 뽀얗다. 더티 마티니는 이름 그대로 병 올리브의 ‘국물’까지 넣어 짭짤한 맛을 더한 칵테일이다. 올리브를 찧은 뒤 그 즙을 넣는 방법도 있다. 반면 올리브 불순물이 마티니 맛을 방해할까 봐 올리브를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는 바텐더도 있다.

01 마티네즈 올드톰진 30ml(만약 단맛이 덜한 진을 쓴다면 슈거시럽을 추가한다), 스위트버무스 30ml, 오렌지 비터 2대시, 큐라소 살짝, 오렌지 필로 장식. 02 베스퍼 마티니 고든스 진 75ml, 보드카 25ml, 릴렛 블랑 12.5ml, 레몬 필로 장식.
[청바지보다 프리미엄 진]

유래 없던 진의 전성기다. 이른바 ‘프리미엄 진’들이 국내에 속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브로커스 진, 이달엔 No.3 진이 수입됐다. 이 진들은 몽키47 진과 헨드릭스 진이 열심히 닦아둔 대로에 미끄러지듯 안착했다. 프리미엄 진은 기존의 ‘런던 드라이진’ 스타일에 비해 훨씬 강렬하고 다채로운 향이 난다. 향료와 허브 향를 다양하게 써서, 복잡다단하고 오묘한 맛이 특징이다. (몽키47 진은 47가지 재료를 썼다는 뜻이다.) 브랜드에 따라 모두 맛이 다르긴 하지만, 프리미엄 진이라고 모두 마티니의 맛을 승천시키는 건 아니다. 베르무트의 향을 더한 뒤에도 마티니가 꼿꼿하려면 좀 덜 화려한 진이 제격일 때도 있다. 중요한 건 바에서 마티니를 주문한 뒤엔 베이스로 사용한 진과 베르무트의 종류를 묻고, 이들의 특징과 조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야 중요한 순간에 제임스 본드처럼 자신의 취향을 핀셋으로 집어내듯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
- 에디터
- 손기은
- ILLUSTRATION
- 이현석
- 도움말 및 촬영 협조
- 상도동 ‘한스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