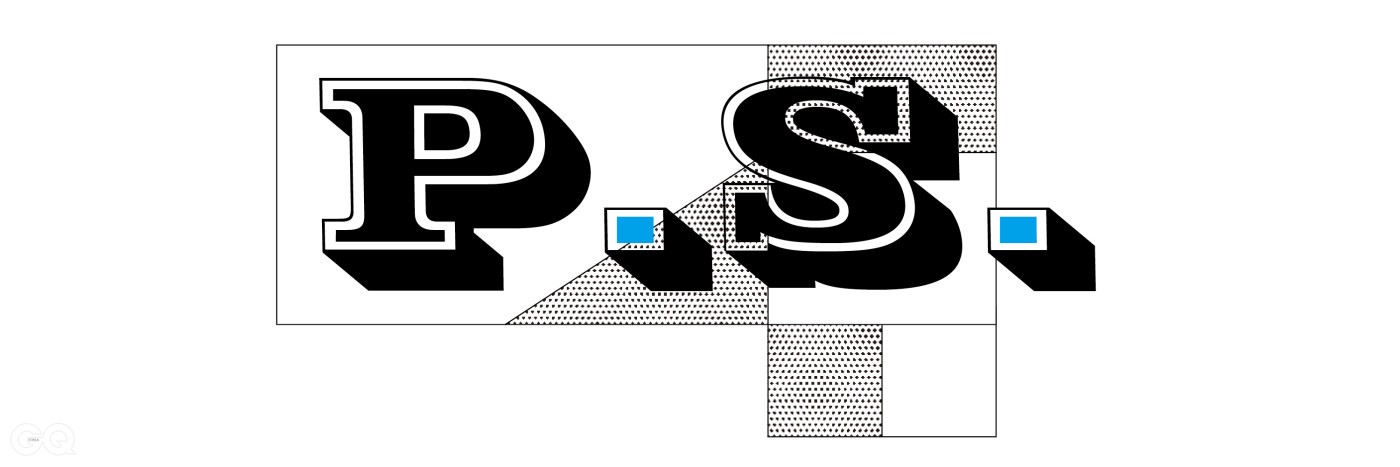요즘은 아무 의미도 없는 웃음만 좋아한다. 그럴 때 웃음소리는 ‘하하하’여선 안 된다. ‘허허허’도 이상하다. 오직 ‘깔깔깔’이어야 한다. ‘하하하’와 ‘허허허’에는 종종 의도가 있어 보인다. 전자는 호방하게 보이고자, 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크게 웃을 때 나는 소리다. ‘허허허’는 뭘 좀 내려놓고 웃을 때 나는 소리다. 약간의 회한도 있다. ‘네가 그렇게 웃기고자 애를 쓰니 웃긴 웃는다’는 뜻으로 내는 소리랄까. 하지만 ‘깔깔깔’은 아무 생각 없이 웃을 때만 나는 소리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명랑만화에 가깝게 웃어야 그런 소리가 난다. 그렇게 웃다가 숨이 모자랄 땐 갑자기 코로 숨을 들이마시게 되는데, 그때 ‘컹’ 하는 돼지 소리도 사랑한다. 그렇게 웃으면서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 혼자 있을 땐 그러지 않는다. 여럿이 있을 때, 깔깔깔 웃으면서 술을 마실 때,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어떤 비율로 섞여 있을 때 주로 그런다. 전엔 내가 앉아 있는 테이블에 대한 본능적인 책임감이 있었다. 어색한 침묵은 못 견디니까, 차라리 토크쇼처럼 웃기는 편을 택했다. 결과가 나빴던 적은 별로 없다. 이건 자랑이 아니다. 과시 거리조차 안 되는 얘기다. “저는 정씨입니다”와 비슷한 차원의 얘기라는 뜻이다. 그러다 누가 ‘비결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나는 그저 ‘호기심’이라고 말해줬다. 누구나 할 말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면 궁금한 것도 생기는 법이라서. 나는 주로 묻는 사람일 뿐이었다. 알면서도 묻고 모르면서도 물었다. 질문은 모르는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시건방진 부류만이 내가 진짜로 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사람의 바닥은 금방 드러났으니 친교가 깊어질 틈도 없었다. 그들과 가까워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랬는데, 요즘은 기꺼이 멍하니 있는 편을 선택한다. 무례를 범하려는 건 아니다. 아주 묘하게, 거기 있는 사람 중 아무도 모르도록 멍하게 있는걸 즐긴다. 거의 무아지경에 가까운 상태다.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귀에서 뇌로 올라가는 길에 촘촘한 그물을 치는 셈이다. 그런 식으로 어제까지 쓰다 만 소설의 실마리를 찾기도 하고, 진짜 섹시한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건 본능이 아니라 생존에 가까운 얘기다. 왜냐하면, 내 신경을 고도로 거슬리는 모든 얘기로부터의 적극적인 도피로서의 ‘멍-’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듣느니, 셀레나 고메즈가 어디서 입었던 헐렁한 흰색 티셔츠를 생각하는 게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이것마저 피곤해지면 어쩌지? 친구가 놀자고 불렀는데, “거기 누구누구 있어?”라고 묻는 빈도는 이미 늘었다. 좋은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누가 거슬리면 차라리 혼자 있는 편을 택한다. 애써 시간을 흩뜨리고 싶지 않고, 갑자기 만난 누군가에게서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는 단단히 녹이 슬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점점 더 혼자 있게 될 것이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일이 뭔지 안다. 그것만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진짜 수단이 될 거라는 사실도.
- 에디터
- 정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