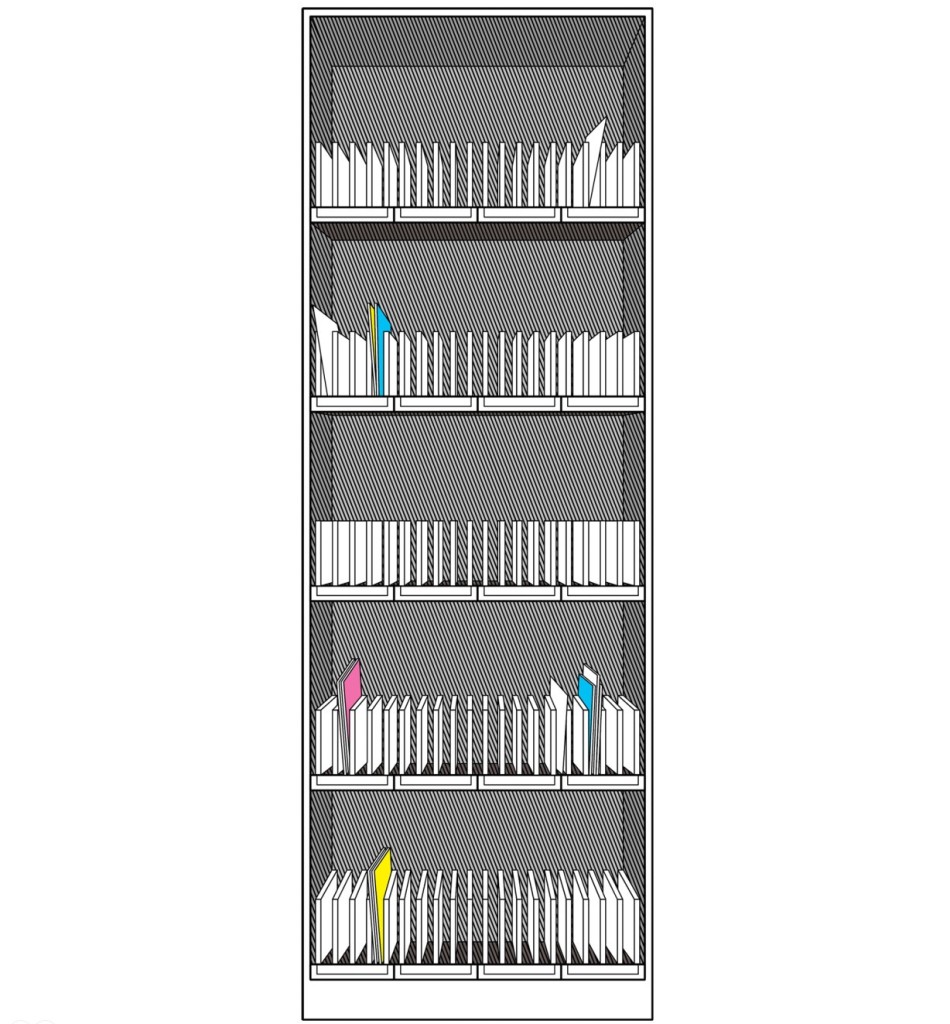도시가 고도화될수록 집은 점점 좁아지고, 가구는 점점 작아진다. 하지만 욕망은 쉽게 줄어드는 법이 없다. 줄일 수 없다면 정리해야 한다.
문서 ‘전산화’를 넘어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 문서를 가장 많이 다루는 직업 중 하나는 의사였다. 환자마다 만드는 진료기록부는 법적으로 10년 간 보관하는 자료였다. 예컨대 한문학자 안대회는 옛날 의사들이 쓰던 진료기록부걸이를 응용한 문서걸이를 쓴다. 스탠딩 옷걸이처럼 생겨서, 수많은 봉이 아래부터 위까지 사방으로 나와 있다. 문서 파일을 이 봉에 걸쳐놓는 식으로 수천 장의 문서를 분류하고 보관한다. 지금은 생산하지 않는 걸로 보이지만, 좀 더 근사한 소위 ‘차트 장’이라고 불리는 가구는 여전히 나온다. 단순히 말하면 책장 칸마다 문서 파일과 이름표를 부착한 것이다. 문서는 보관보다 찾을 때 곤란하다. 신경 써서 분류해놔야 나중에 번거로워지지 않는다. 개인적인 기준만 갖고 있다면, 차트 장은 최초 분류 시 더 요구하는 게 없다.
대안 ‘지금 보는 것, 자주 보는 것, 자료가 될 만한 것’에 따라, 문서 파일의 종류를 구분해서 쓰면 좋다. ‘지금 보는 것’은 빨리 찾을수록 좋으므로 투명한 문서 파일에, ‘자주 보는 것’은 분류를 요하므로 각각 다른 색깔의 문서 파일에, ‘자료가 될 만한 것’은 양이 많아지기 마련이므로 시각적으로 통일성을 줄 수 있는 문서 파일에 담고 이름표를 달아서 보관한다.
GQ POINT 지금 쓰는 것, 자주 보는 것, 자료가 될 만한 것. 뭘 정리하든 이 세 가지 기준이 적당하다. ‘지금 보는 것’은 편리를 우선한다. 시간순 정렬이 가장 직관적이다. 다만 시간순 정렬은 조직화가 어렵다. ‘자주 보는 것’에서 ‘빈도 수’를 고려해 분류를 개인화한다. 개인의 관심사가 될 수도 있고, 대상의 중요도가 될 수도 있다. 사적인 일인가, 공적인 일인가를 나침반 삼는다. ‘자료가 될 만한 것’이라는 기준을 두는 건 자기중심적인 배치에서 오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 기준에 따라 가까운 곳에서 먼 곳, 잘 보이는 데서 잘 보이지 않는 데 놓는다.
- 에디터
- 정우영
- 일러스트
- 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