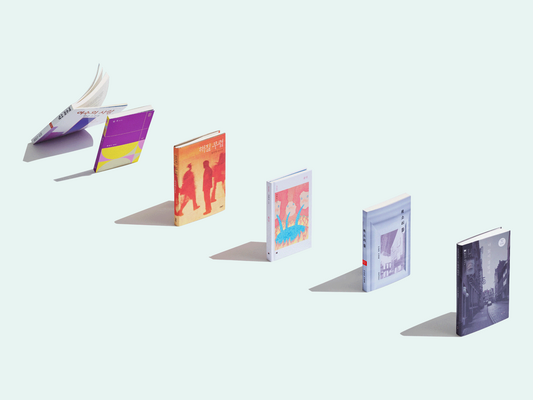제임스 프랭코는 예일대 영문학 박사 과정 수업을 듣고, 유화를 그리고, 단편영화를 만들고, 책을 낸다. 주인공으로 출연한 신작 < 127시간 >의 개봉을 앞둔 그의 하루는 옆집 청년의 것처럼 잔잔했다.
프랭코가 호텔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다. 피코트에 회색 코듀로이 바지를 입고 짙은 남색 야구 모자를 썼다. 지난밤 입었던 옷 그대로다. 아마도 옷을 입고 그대로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100킬로미터 내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다. 그는 한 시간 후에 있을 휘트먼(미국 자유시의 아버지) 수업을 함께 들을 친구 한 명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머핀을 먹었다.
제임스 프랭코는 배우이자 학생, 단편소설 작가, 크로스드레서(이성의 복장을 한 사람), 영화 제작자다. 어떤 의미에선 할리우드 ‘셀러브리티’도 아니다. 어떤 매체의 기자와도 안면이 없는 예일대 박사 과정에 있는 평범한 학생일 뿐이다. 그래도 제임스 프랭코가 해온 지난 1년간의 활동만 읊어도 브래드 피트의 특집 기사만큼이나 길게 늘어질지도 모른다. 영화 <하울>에서 알렌 긴즈버그 역할을 맡았고 드라마 <제네럴 호스피털>의 20편의 에피소드에서 ‘프랑코’의 역할을 계속했다. LA에서는 행위예술을 펼쳤고, 몇 편의 단편영화를 제작하고, 콜롬비아 MFA 프로그램을 듣는 동안 쓴 이야기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출간했으며, <혹성탈출> 시리즈의 신작에 출연했다. 그리고 최근, 아론 랄스톤에 관한 영화 <127시간>에서도 그를 볼 수 있다. 이 영화는 유타주의 비좁은 협곡에 끼어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직접 자신의 팔을 잘라야 했던 아론 랄스톤의 실화를 그리고 있다.
프랭코는 의자에 푹 기대앉았다. 그 모습이 마치 마약 중독자를 그린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았다. 질문을 던지면 약 30초 후에 살짝 미소 지었다. 잘생긴 외모만큼이나 근사했다. 하지만 피자를 사러 밖으로 나가자 마자 내부 발전기에 스위치가 켜지는 것처럼 아주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는 데이브 에거와 앞으로 제작할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죽어 누워있을 때>를 여름에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또한 대니 보일이 감독한 <127시간>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었다. 이 영화는 줄곧 바위의 작은 틈에 팔이 끼인 채 앉아 있는 제임스 프랭코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영화 속 아론 랄스톤이 자신의 오줌을 마시는데, 직접 마셨나요? 아니요. 영화를 위해 실제로 하진 않았어요.
그럼 이번 영화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오줌을 마신 적이 있나요? 네. 마셔본 적 있어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요.
감독이 한 번에 20분이나 30분 정도 카메라를 계속 돌리기만 했다고 들었어요. 그 사이 당신은 바위와 사투를 벌이고요. 그런 경험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촬영을 시작하고 20분이 지나면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렸어요.
카메라로 만든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맞아요. 영화 촬영 전에 베키티류의 연극일 것 같다는 상상을 했어요. 사람과 바위만 있는 연극 말이에요.
그리고 섹스 얘기를 빼면 마치 교양 상식을 논하는 기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섹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섹스요? 제가 섹스에 대해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루해할 걸요.
제임스 프랭코가 섹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따분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다. 그는 테루라이트 국제영화제에서 자신이 여건만 된다면 하루에 다섯 번쯤은 자위를 할 수 있다고 기자에게 말한 적 있다. “그 기자 정말 나쁜 새끼예요.” 프랭코는 ‘실제로 닷새 동안 바위에 끼어있다면 마스터베이션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 기자가 나한테 한 질문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건 내가 생각할 만한 빌어먹을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죠. ‘네, 혼자 있을 때는 많이 하죠. 5일 동안 바위에 끼어 있어야 한다면 어쩌면 할지도 모르죠’라고 대답했어요. 블로그에서 다들 뭐라고 떠들어대는지 아시잖아요. 개인적인 성생활, 동성애문제, 창피한 문제를 떠들어대고 심지어는 수업 중에 졸았던 사건이나 낮은 학점에 대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시에 대한 글을 썼거나 < 뉴욕타임스 > 평론가 로버타 스미스처럼 예술작품에 대한 비평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프랭코가 강의실에 들어섰다. ‘휘트먼 수업’에는 열다섯 명의 학생이 참석하는데, 프랭코는 교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구석에 자리 잡고 앉아 몰스킨 노트를 꺼냈다. 마이클 워너 교수는 퀴어 이론의 창시자 중 한 명이다. 프랭코가 퀴어 이론의 대부와 함께 수업을 듣는다는 사실이 인터넷에 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짐작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퀴어 이론은 문학, 인생, 정치 등 모든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방식입니다. 모든 주제에 대해 반규범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퀴어 이론을 설명해달라는 나의 요청에 프랭코는 이렇게 설명했다. 반규범적이란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되물었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의 접근 방법은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으로 구분하는 것과 같죠. 퀴어 접근 방식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각기 다른 것들이 뒤섞여 관계를 맺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강의실의 학생들이 노동자 계층에 대한 휘트먼의 견해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 프랑코는 휘트먼의 시집 < 풀잎Leaves of Grass >을 앞에 두고 앉아 메모를 끄적거리고 있다. 마치 명왕성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노숙자의 필체 같다. 그리고 삽입구를 이용하는 휘트먼의 특이한 방식에 대해 토론할 때 프랭코가 손을 들었다. “휘트먼은 삽입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회상에서 벗어나 어떤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한동안 계속됐다.
워너 교수는 인간이자 예술가로서 휘트먼에 대한 중요한 주장을 펼쳤다. “그 당시 월트 휘트먼의 과제는 자기분리였습니다. 작품 속에 얼마나 많은 월트 휘트먼이 있습니까?” 여기서 프랑코와 휘트먼의 유사점을 찾았다. 휘트먼은 대중의 평판을 교묘히 조작하는 것을 즐겼고 사생활과 공적인 생활의 경계를 애매하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200년 후에 예일대에서 제임스 프랭코에 대한 세미나가 열릴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 수업에 참석하기 전에 프랭코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래서 여기로 기자를 데려왔는지 궁금할 뿐이다. 돌아보면 프랭코의 활동이 모두 공적인 영역에 속하지도 않는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작가도, 예술가도, 학생도 아니다. 그는 그저 수업을 듣고 노트 필기를 하고 친구들과 헤어질 때 공손하지만 무뚝뚝하게 작별인사를 건낼 뿐이다. “잘 지내죠?” 그는 늘 이런 질문을 던지지만, 서술문에 가깝다.
프랭코가 계단을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섰다. 입구에서 짙게 선탠을 한 프리우스 한 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프랭코는 배낭을 먼저 던져 넣고 차에 올라타 문을 닫고 어두운 창문 너머로 사라졌다.
- 에디터
- 글/ 데빈 프리드먼(Devin Friedman)
- 포토그래퍼
- Inez Van Lamsweerde & Vinoodh Matad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