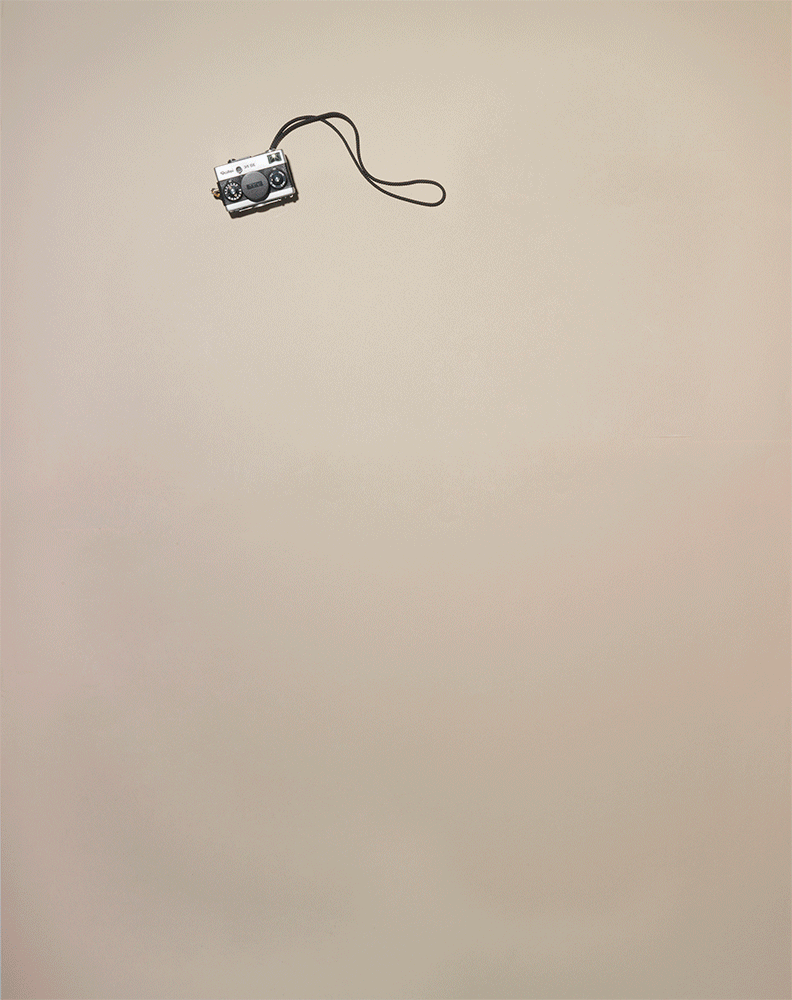지큐 패션 에디터 네 명, 그들 각각의 옷장 속 필수 아이템 10.
강지영
1. 아페쎄 청바지 청바지라면 많고 많지만, 워싱과 핏은 아페쎄 버틀러 진만 한 게 없다.
2. 레이밴 클럽마스터 같은 디자인으로 여러 개 샀다. 렌즈는 제일 작은 사이즈로 고른다. 선글라스는 작은 듯하게 쓰는 게 멋져 보인다. 정확한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3. 빈티지 울 재킷 오래전 뉴욕 빈티지 상점에서 20달러에 샀다. 어깨가 넓고 라펠이 큰 남자 재킷인데, 옷 자체가 낡고 수수해서 어떤 옷에 입어도 쑥맥처럼 보인다. 그 점이 아주 마음에 든다.
4. 롤렉스 시계 어디서 돈벼락을 맞아도, 다른 시계를 새로 살 생각은 없다. 제일 비싼 시계는 아니지만 내겐 제일 좋은 시계.
5. 생 로랑 첼시 부츠 굽이 빠질 때까지 신고 있다. 새 걸 하나 더 사고 싶지만 이 소재로는 더 이상 안 나온다. 비 맞은 낙타 털 같은 지저분한 스웨이드.
6. R13 차콜 그레이 면 티셔츠 제일 좋아하는 티셔츠 브랜드 R13의 얇은 면 티셔츠. 사서 처음 입은 날, 누군가에게서 그 정도 입었으면 이제 버리라는 말을 들었다. 얇고 나달나달한 소재와 애매한 색깔이 최고다.
7. 목걸이 선물 받은 날부터, 샤워할 때조차 안 빼고 늘 하고 있다.
8. 슈론 안경 괜히 한 글자라도 더 읽고 싶게 만든다. 개인적 기준에선 가장 지적인 디자인의 안경.
9. 랄프 로렌 도트 스카프 목에 두르고 나갔다가 결국 주머니에 넣어버리지만. 그래도 차림이 심심한 날엔 매번 챙기게 된다.
10. 스마이슨 클러치 오래 들었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가방에 넣을 건 더 없으니, 이 정도 클러치면 충분하다.
박나나
1. 프레임 청바지 이래서 청바지는 돌려 입는 게 아니다. 원래는 내 것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내 몸에 더 잘 맞는 소중한 청바지.
2. 플로리스 나이트 센티드 재스민 향수 런던에 갈 때마다 100ml 두 병을 산다. 딱 1년을 쓴다.
3. 스마이슨 여행용 클러치 네 가지 색 지퍼가 달린 아주 유용한 클러치다. 빨간색엔 립스틱과 미니어처 향수, 노란색엔 돈과 카드, 초록색엔 두통약과 수면제, 남색엔 8000 선글라스를 넣는다.
4. 생 로랑 밀리터리 재킷 홧김에 산 옷이지만, 기분 내고 싶을 때마다 입는다. 만나는 사람마다 뒷면의 얼굴이 몇 개인지 세지만, 답은 매번 다르다.
5. 빈티지 까르띠에 시계 기분 내키는 대로 시계 밴드를 여러 번 바꿨다. 자주색 뱀피, 남색 실크, 검정 가죽. 세상에, 안 어울리는 게 없다.
6. 8000 오또 밀라 선글라스 전 세계 8천 개뿐인 선글라스. 그중 내 건 312번.
7. 다이어트 ‘콕’ 티셔츠 베를린 빈티지 숍에서 콜라 한 병 값으로 산 티셔츠. 여름엔 화이트 진과 입고, 겨울엔 그 위에 블랙 코트를 입는다.
8. 보테가 베네타 여권 케이스 10년 전 새 여권과 함께 시작했다. 그리고 어제, 새 여권 사진을 찍었다.
9. 루이 비통 키폴 백 어깨끈이 없는 게 흠이지만, 비행기 탈 땐 이 가방만 한 게 없다.
10. 생 로랑 첼시 부츠 뜻밖의 큰 선물이었지만 기분이 별로였다. 돌려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돌려줬으면 어쩔 뻔했나 싶다.
오충환
1. 프라다 트레이닝 팬츠 가을겨울용이 확실하지만 여름에도 가끔 입는다. 발목 부분의 지퍼는 북풍한설 몰아쳐도 반쯤 열어야 ‘쿨’하다.
2. 프리맨스 스포팅 클럽의 데님 셔츠 뉴욕 프리맨스 매장에서 샀다. 일본산 데님으로 만들어 질도 좋고 주머니도 귀엽다. 제일 큰 사이즈로 사서 재킷처럼 입는다.
3. 마가렛 호웰 스웨터 마가렛 호웰의 스웨터를 좋아한다. 봄베이행 기차 일등석에 앉은 가난한 화가라고 쓰면, 대체 무슨 소리냐는 질문을 들을 것 같지만, 이 스웨터를 입으면 그런 기분이다.
4. 웨일즈 보너 목걸이 영국 신인 디자이너 웨일즈 보너를 좋아한다. 그녀가 만든 남자 목걸이. 화보 촬영 때 쓰곤 다른 누군가가 또 촬영하는 게 싫어 사버렸다.
5. 스펙트레 선글라스 솔직히 안 어울린다. 골드 프레임이 석양 같기도 했고, 빛의 언어로 두드려 만든 것처럼 우아해서 샀다. 재킷 주머니에 꽂았다가 혼자 운전할 때 쓰고 멋있는 척 상상한다.
6. 지미추 슬립온 백화점에선 세일 중이었지만 사이즈가 없어 독을 품고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정가에 구입했다. 아라비아 반도나 북아프리카가 생각나서 주로 실크 팬츠에 신는다.
7. 베통씨레 모자 지난여름 파리 메르시 매장에 샀는데, 나보다 남들이 더 좋아했다. 몸에 붙는 옷보다 르메르의 옷처럼 육체와 공기 중간에서 부유하는 옷에 잘 어울린다.
8. 하네스 일본 리미티드 에디션 티셔츠 싸고 예쁜 하네스의 흰색 티셔츠를 거의 매일 입는다. 어떤 건 삶아도 한 달쯤 세탁을 안 한 듯 보이는데, 보다 못한 친구가 사줬다.
9. 비트라 수첩 독일 비트라 뮤지엄 기념품 숍에서 샀다. 흔해 빠진 노출 콘트리트가 주제인 것 같지만, 수첩이라니, 낯설고 예쁘다. 니트 타이보다 스마트해 보여서 중요한 인터뷰가 있을 때 폼으로 들고 간다.
10. 콘탁스 G2 카메라 필름 카메라지만 여전히 산업 전선의 전폭기. 셔터 소리가 마음에 쏙 든다. 가방처럼 메고 다닌다.
윤웅희
1. 롤라이 35SE 친구에게서 거의 뺏듯이 선물 받은 빈티지 카메라. 그 친구도 언제, 어디서 산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생긴 것도 예쁘지만 사진은 더 예쁘게 찍힌다.
2. 아미 데님 팬츠 베를린 편집매장에서 샀다. 청바지를 즐겨 입는 편이 아닌데, 이 바지를 보곤 홀딱 반해서 홀린 듯이 카드를 꺼냈다. 그때부터 청바지를 종종 입는다. 약간 헐렁하게 입었을 때 더 예쁘다.
3. 랑방 네이비 재킷 이 재킷을 즐겨 입은 때가 있다. 톡톡한 소재와 낙낙한 실루엣이 좋아서. 한동안 잊고 지냈는데 문득 생각나 옷장 구석에서 꺼내 들었다. 오랜만에 봤지만, 여전히 마음에 쏙 든다.
4. 팜 앤젤스 티셔츠 프린트보단 자수나 스티치로 장식한 티셔츠를 좋아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
5. 메종 마르지엘라 목걸이 굵기가 다른 두 개의 체인을 연결했다. 짧은 부분은 따로 분리해 팔찌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목에 찼을 때가 훨씬 더 근사하다.
6. 구찌 호스빗 로퍼 미켈레의 날렵한 로퍼는 왠지 깍쟁이처럼 보이기도 한다. 발볼이 넓고 앞코가 뭉툭한 호스빗 로퍼가 나에겐 더 잘 맞는다.
7. 린드버그 선글라스 사실 조금 작다. 그렇지만 굉장히 가볍고 렌즈 색깔이 귀여워 포기할 수가 없다.
8. 드리스 반 노튼 벨트 장식이 전혀 없는 기본적인 형태의 벨트. 대신 가죽이 탄탄하고 광택이 풍성하다. 보통 세 번째 칸에 버클을 맞추지만 요즘은 가끔 힘겹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때마다 다이어트를 결심한다. 네 번째 칸으로 옮겨갈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9. 구찌 명함 지갑 명함 지갑이라 불러야 할지, 카드 지갑이라 불러야 할지 정확히는 모르겠다. 어쨌든 둘 다 넣어도 괜찮을 만큼 넉넉하다. 가끔은 지폐도 몇 장 넣는다.
10. 에디션 드 파퓸 프레데릭 말 무스크 라바줴 파리 봉 마르셰에서 처음 맡았을 땐 세상에 이런 향이 다 있나 싶었다. 그 뒤로 모리스 루셀의 열렬한 신봉자가 되었다. 아침마다 공중에 세 번 뿌리고 그 아래서 트리플 악셀을 뛴다. 그러면 하루 종일 좋은 향기가 난다.
최신기사
- 에디터
- GQ 패션팀
- 포토그래퍼
- 정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