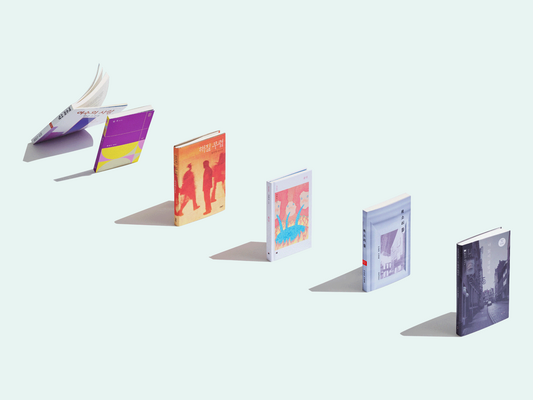텔레비전은 방송국에서 정한 편성표를 시청자들에게 강요한다. 채널이 많지만 한정적이고, 드라마, 쇼, 뉴스 등등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보아온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때는 볼 수 없었던 TV 프로그램 형식이 있다면 ‘홈쇼핑’이다. 국내에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 단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다. 누구나 인터넷 쇼핑 한 번쯤은 해봤을지라도.
가장 큰 이유는 텔레비전을 통한 1차원적이고 아날로그적인 판매 방식이다. 한 시간에 딱 한 가지 상품만 판다. ‘아니면 말고’라는 식이다. 지하철에 올라탄 잡상인처럼 바라봐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몇십만 개의 상품을 갖추고 하루에도 수천 개의 신제품이 올라오는 인터넷 쇼핑몰에 비하면 얼마나 궁색한가. 다양성과 편의성이 최우선으로 삼는 최근의 유통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확연히 보인다.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바보상자라는 별칭을 붙인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본래의 비판적인 의미가 아니라 허술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그래서 사람과 가깝다는 의미로 들린다. 텔레비전은 지금도 막연한 대중을 향해 무작정 떠들고 춤추고 노래하는 중이다.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은, 고독하지만 고독하지 않다. ‘혼밥’ ‘혼술’의 시대에, 어쩌면 그들과 가장 가까운 인간은 텔레비전 속에 있다.
홈쇼핑에도 사람이 있다. 때론 그들의 과장된 어투와 호들갑이 농담 소재로 쓰이고 홈쇼핑에서 발생하는 충동 구매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도 하나 쇼호스트의 첫 번째 자질이 친근한 말과 몸짓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홈쇼핑은 아무리 과묵한 사람도 단골 매장 주인과는 집안 이야기를 서슴없이 꺼내게 되는 편안함, 장사꾼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귀 기울여 듣는 시장의 습속, 뭔데 저렇게 수선을 떠는지 알고 싶은 호기심을 이끌어낸다. 모두가 잠든 새벽 한 시에도 텔레비전을 켜면 여지없이 밝고 명랑한 쇼호스트가 말을 건다. 늘어진 추리닝을 입은 나를 차별하지도 무시하지도 않고 단 한 명의 고객으로 대우한다. 뜻밖의 공감으로 넋을 잃고 보기도 하고, 전혀 흥미 없는 상품에서도 그 관심만큼은 고마워지는 순간이 있다.
홈쇼핑에서 상품 기획을 하는 MD는 새벽 6시의 부지런한 고객에게, 심야의 고달픈 고객에게 어떤 상품이 필요한지 연구한다. 단 한 개의 더 매력적이고 더 치명적인 상품을 정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렇게 선정된 상품은 단지 상품만이 아닌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탈리아 공방에서 제작한 재킷의 시원스런 라펠, 안데스 산맥에서 탄생한 호사스러운 비큐나, 남도의 농부가 거친 손으로 길러낸 배추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는 것이 홈쇼핑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홈쇼핑은 차가운 빅데이터와 과열된 무선 통신망으로 실어 나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러므로 홈쇼핑에서 구입한 현관의 택배 상자 역시 단순한 상품이 아닌 사람들의 기대와 사연을 담고 있다.
TV 리모컨은 아주 둔탁한 물건이다 스치기만 해도 반응하는 현대적인 장비가 아니다. 느긋하게 텔레비전을 켜고 채널을 돌리면 저잣거리의 활기찬 소음이 들려온다. 뒷짐을 지고 적당한 소리를 찾아 따라가면 편안하고 흥미로운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출 수도 있다. 사고 안 사고는 나중 문제인 것이다.
- 에디터
- 글 / 강성준('신세계 TV 쇼핑' 패션 팀장)
- 포토그래퍼
- 정우영